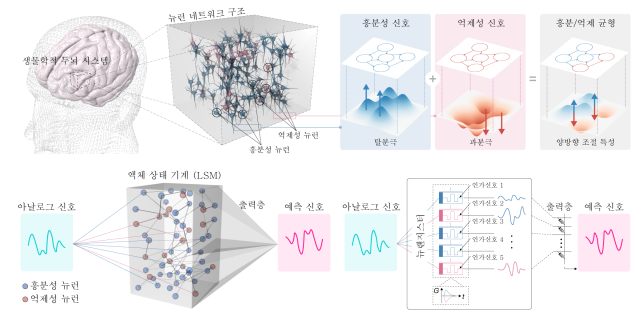혹시 로물루스, 레무스, 그리고 칼리시를 아시나요? ‘왕좌의 게임’에서 튀어나온 캐릭터 같지만 이들은 최근 생명공학 기술로 되살아난 다이어울프, 즉 고대 거대 늑대의 새끼들이다. 1만3000년 전 멸종된 이 포식자는 빙하기 시대 화석에서 추출한 DNA와 현대 늑대의 유전자가 결합하며 다시 태어났다. 마치 쥐라기 공원이 현실화된 듯한 순간이다. 이 기술은 멸종 위기종을 복원하고 생태계를 복구하는 데 응용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생태 복원이 아닌 과학계의 허영이라 평한다. 되살아난 늑대가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예상치 못한 질병을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창조해도 되는가. 이런 물음은 윤리의 영역이다.

고대 그리스신화에서도 인간의 야망과 신의 경고 사이에서 태어난 혼종 생물들이 인간세의 질서를 혼란시킨다. 창조의 천재라 불리는 다이달로스는 미궁(迷宮)을 만든 장본인이다. 미궁은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가두기 위한 것이었는데, 미노타우로스가 다이달로스의 발명인 나무 암소 덕분에 태어났다. 신성한 황소를 사랑한 왕비 파시파에가 나무 암소 안에 들어가 황소에 접근하기 위해 다이달로스에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다이달로스는 상상과 현실을 잇는 다리였으며 신화를 실물로 구현해낸 존재였다. 지금 우리는 다이달로스가 만든 깃털과 밀랍의 날개를 단 채, 이카로스처럼 하늘을 날고 있다.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간 이카로스는 밀랍이 녹아 결국 추락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휴브리스(hubris)’는 인간이 신의 영역, 즉 자연의 질서라는 경계를 넘는 행위를 의미했다. 지금 우리는 그 경계를 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류가 자연에 입힌 손실을 조금이나마 갚으려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김승중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



![[목요일 아침에] 4분의 1 토막난 희토류 탐사 예산](https://newsimg.sedaily.com/2025/04/16/2GRJMNPR07_1.jpg)
![RTX 5090 품고도 1.95kg, 들고 다니는 하이엔드 겜트북 ASUS ROG 제피러스 G16 GU605CX [이 구역의 미친X]](https://img.danawa.com/images/news/images/001560/20250414154655882_68OOW1F8.png)
![[ET단상]과학기술혁신펀드 출범에 즈음해](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11/news-p.v1.20250411.43456880a94b4405915a4fb9c53931de_P3.png)
![[신간] D.H. 로렌스 시선집 '생기의 잔물결'](https://img.newspim.com/news/2025/04/15/250415161833819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