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단돈 1억 쓰는 것 결재 받기도 힘들었죠. 솔직히 이렇게 쉽게 대규모 투자가 결정될지 몰랐습니다. 회사를 더 열심히 키워볼 생각입니다."
최근 석유화학 기업 피유코어(옛 SK피유코어)의 한 임원은 기자와 만나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피유코어가 총 1000억 원을 쏟아부어 올해 안으로 울산에 폴리올·폴리우레탄 관련 설비, 저장 탱크를 신설하고 있는데 대해 약간의 놀라움을 담아 건넨 말이었습니다. 저장 탱크 건설은 피유코어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는데, 지난해 최대주주가 바뀐 뒤 이 투자가 빠른 속도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바뀐 최대주주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입니다. 글랜우드는 지난해 피유코어 지분 100%를 약 4000억 원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SK피유코어는 대기업 내에서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했던 수백개 손자회사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를 떼어내 품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겁니다.
피유코어, 피인수 뒤 580억 수혈·배당도 폐지
글랜우드는 피유코어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컨설팅 펌인 BCG, 룩센트 등과 함께 이 회사를 정밀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유코어의 핵심 제품인 폴리우레탄(PU)이 전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다만 그룹사 산하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진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기미가 보이면서 유럽에서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까지 꿈틀대고 있습니다. PU는 건축용 단열재와 각종 공업용 소재에 폭넓게 쓰이는 화학제품입니다. 전쟁 과정에서 폭파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PU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글랜우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단번에 회사에 580억 원 유상증자로 자금을 수혈해주고 피유코어가 10년 가까이 연간 수십억 원씩 모회사에 배당했던 관례도 일단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피유코어는 이 자금을 모두 묶어 손쉽게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회사의 매출이 크게 점프할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6000억 원대였던 피유코어어의 연간 매출액은 2029년 사상 첫 1조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직 내 비효율 고치고…회사 경쟁력 발판
최근 만난 글랜우드의 핵심 파트너(임원) 역시 피유코어의 의사 결정 과정을 최대한 효율화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법인에서 큰 매출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면서 본사 조직과 해외 법인 간 의사 결정 과정을 바꾸려는 노력도 엿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풀자면 이렇습니다. 컨트롤타워가 멀리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본사는 본사 조직대로, 공장은 공장대로, 해외 법인은 해외 법인대로 자신들의 일에만 몰두하는 관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태생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매출을 뽑아내는데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글랜우드도 새로 인수한 이 조직 내 어디에선가 있었을 비효율들을 여기 저기 수정하며 더 좋은 회사를 만드는데 주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은 힘든 고통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가 좋아지고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방향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 글랜우드는 지금까지 △PI첨단소재 △동양매직 △한라시멘트 △한국유리공업 △CJ올리브영의 지분을 인수한 뒤 재매각한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대기업 산하에서 별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글랜우드의 손을 거치며 더 경쟁력 있는 회사로 탈바꿈 됐고 결국 핵심 자산이 되어 대기업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대기업 아래 손자회사 수백개…관리 범위 넓을 수 밖에
기자를 만났던 피유코어의 임원이 이처럼 털어놨던 건, 국내 대기업의 피라미드식 조직에서는 의사결정이 조금 더딜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조심스레 드러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대기업 입장에서도 반도체와 에너지, 인공지능(AI) 같은 미래 핵심 사업들을 챙기기에도 바쁜데 그 많은 비핵심 계열사들의 의사 결정까지 빠르게 하기에는 무리였을 것이란 추측도 가능합니다.
즉, 대기업은 비핵심 자산을 사모펀드에 매각해 현금 곳간을 채울 수 있었고 피유코어 입장에서도 새 주인을 만나 두 날개를 활짝 펼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양측 모두에 윈-윈 거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피유코어가 앞으로 잘 성장해 더 좋은 화학 소재 기업으로 크고 한국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 전제가 돼야 하겠지만요.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기업의 비핵심 사업부를 떼어내 인수하는 방식을 '카브아웃(Carve-Out)'이라고 부릅니다. 국내 사모펀드들이 이처럼 대기업 비핵심 자산을 카브아웃을 해 좋은 회사로 성장시킨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곳간이 비어가는 대기업에는 현금을 안기고, 인수한 기업을 더 경쟁력 있는 회사로 바꿔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최근 심해지고 있는 사모펀드 색안경을 일부 거둬들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모펀드가 인수한 뒤 실적이 망가지거나 현금 곳간이 거덜난 기업들도 많다는 점에서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솔믹스·DN솔루션즈·오렌지라이프 등 성공적 카브아웃 사례 많아
국내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한앤컴퍼니는 최근 솔믹스를 TKG태광에 매각하기로 하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2월 SK엔펄스의 파인세라믹스 사업부를 떼어내 인수한 뒤 사명을 솔믹스로 바꾸고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한앤컴퍼니 품에 안긴 솔믹스의 실적은 단기간 내 빠르게 개선됐는데 지난해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이 전년의 두 배 수준인 400억 원 이상으로 늘었고, 매출액도 1670억 원에서 188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이자 한국에 기반을 둔 MBK파트너스의 두산공작기계 사례도 사모펀드의 성공적인 경영권 인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MBK는 2016년 두산인프라코어의 공작기계 사업부를 인수한 뒤 탄탄한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DTR오토모티브에 매각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DN솔루션즈로 사명을 바꿔달고 증시 상장도 추진하는 건실한 회사가 됐습니다.
MBK는 2013년 ING생명의 한국 법인 지분 100%를 인수한 뒤 2018년 신한금융지주에 재매각한 경험도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사명을 신한라이프로 바꾼 뒤 신한금융지주의 핵심 자회사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룹 내 다른 자회사들과 다양한 시너지를 내며 금융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충희의 쓰리포인트를 구독해주세요! 3점슛 같은 짜릿한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PE에 안긴 석화 업체 대변신…1000억 신규 투자로 숙원 사업 푼다[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AOJJ2N_1.jpg)

![[단독]'불황에 장사없다'...LG화학, 스페셜티 전담 사업부도 해체](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19/20250819000008_0700.png)
!["고성장 인도에 베팅" 포스코, 年 600만톤 제철소 세운다… “우크라 재건땐 1조시장 열려” 피유코어, 생산력 두배 늘린다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PAQPZX_1.jpg)


![우크라 종전 후 1조 새 시장 열린다…피유코어, 유럽 생산 능력 두배 점프[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AF4W3L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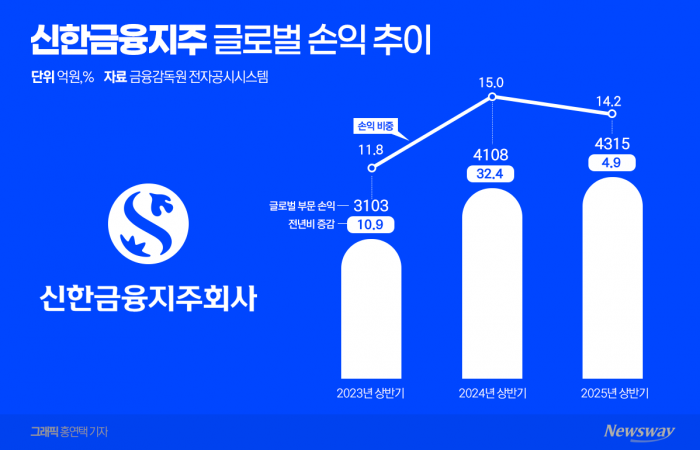
!["한한령 해제?" '中 드라마 제작 규제 완화설'에 엔터주 급등…포스코, 인도에 年 600만톤 제철소 세운다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PBJR27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