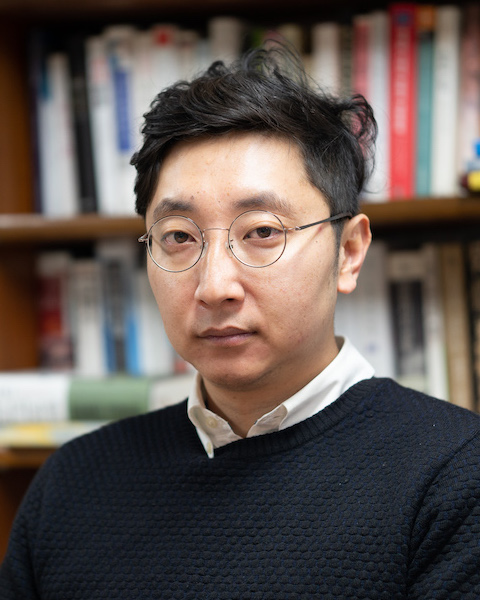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망(SA) 도입을 받아든 이동통신사 속내는 복잡하다. 기술 진화 관점에서 언젠가 가야할 길이지만, 기존 5G망에 대한 투자 회수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 천억원 단위의 추가 투자가 부담도 된다.
사실 통신사도 전환점이 필요했다. LTE 망에 기댄 기존 5G는 속도 개선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반쪽짜리 5G'라는 오명만 쓴 채 수익 측면에서도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SA는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5G 기지국을 5G 코어망에만 연결한다고 그것만으로 돈이 되지 않는다. 핵심은 SA를 통해 가능해지는 기능을 어떻게 상품화 하는지다.
5G SA를 통해서만 구현 가능한 대표 기능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독립된 가상 네트워크로 나눠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사용자는 경기장이나 콘서트, 축제 등 트래픽 과부하 상황에서도 외부 영향 없이 안정된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통신사가 5G SA 특화 요금제를 내놓는다면 더 나은 품질을 원하는 고객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더 빠르고 끊김없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T모바일과 싱텔, KDDI 등 해외 통신사는 이미 5G SA 기반 부스터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5G SA가 시장에 꽃피우려면 정부도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둘러싼 망 중립성 문제 등을 적극 해결해줘야 한다. 차등화된 경험이 데이터 트래픽 전송에 대한 차별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요금 출시를 독려해야 한다.
통신사는 갈림길에 섰다. SA 도입이 단순히 재할당을 위한 형식적 투자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수익모델로 이어지는 모멘텀이 될지 앞으로 행보에 달렸다. 5G SA 성패는 커버리지 지표나 속도 수치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냈는지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통신사가 팔아야 할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경험'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