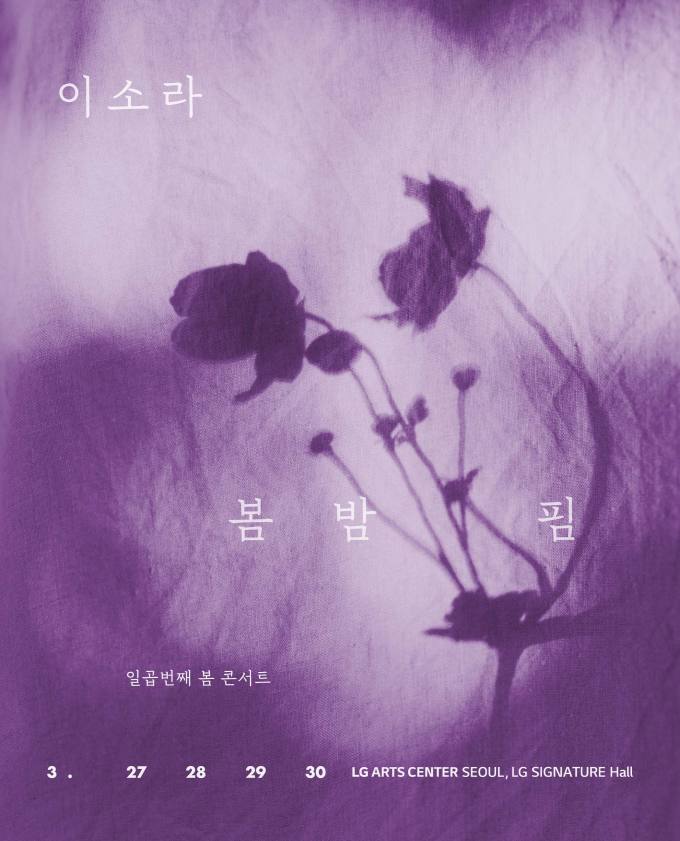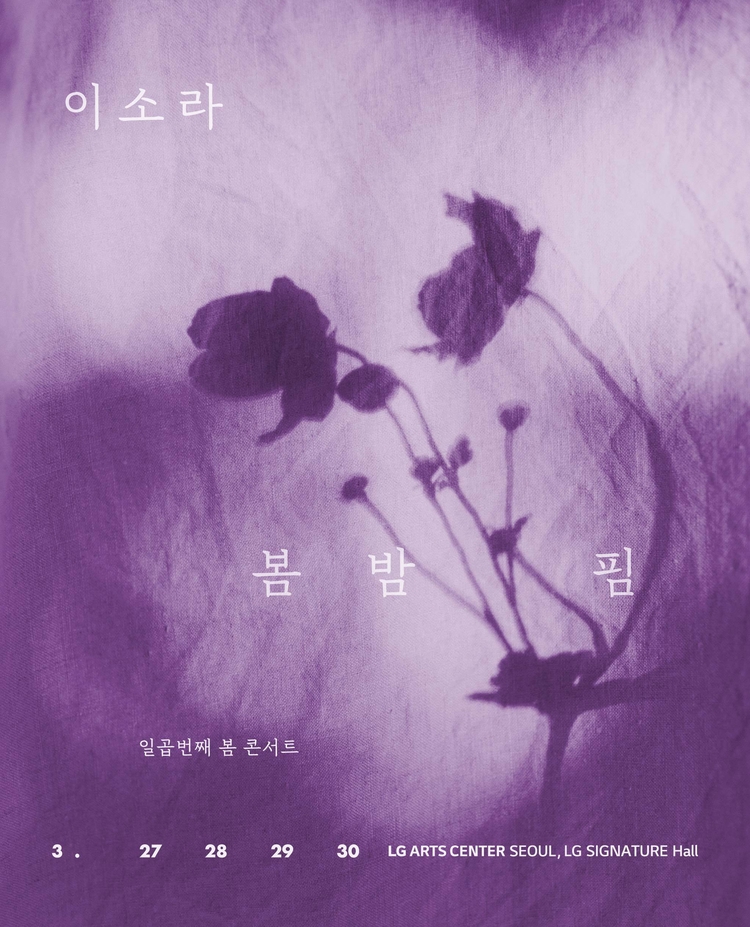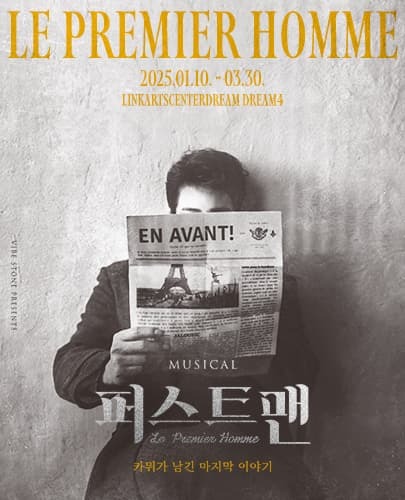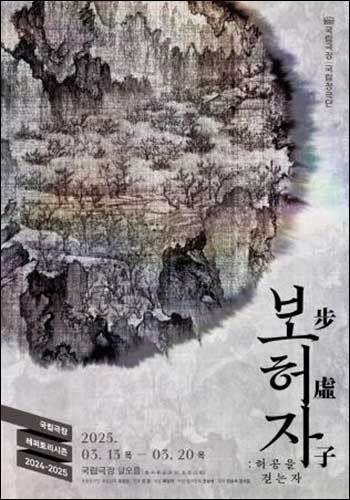극장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공공극장과 민간극장으로 나뉜다. 전국적인 숫자로 치면 우리나라에는 공공극장이 민간극장보다 많다. 서울 대학로에 산재한 자잘한 민간 소극장을 제외하면 국공립 공공극장이 절대 우세다.
절대 열세인 민간극장에서 큰 몫을 담당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2000년대 들어 서울에는 몸집이 제법 큰 대극장 여럿이 새로 생겼는데, 그중 새천년 시작과 함께 탄생해 지금까지 꽤 돋보인 행보를 이어온 곳이 LG아트센터다. 강남의 역삼동에 극장을 열고 공연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강서구 마곡으로 둥지를 옮겨 명맥을 잇고 있다. 2022년 이사를 하면서 이름도 ‘LG아트센터 서울’로 바꿨다. 참신한 극장 프로그램 못지않게 안도 다다오의 단아한 극장 건축 디자인을 감상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붐비는 명소다. ‘건축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 안도 다다오는 정교한 콘크리트 건축으로 유명하다.
LG아트센터 마곡으로 옮기면서
그 자리에 GS아트센터 들어와
성공의 열쇠는 참신한 프로그램
4월 오픈후 새 문화 중심지 기대

22년 동안의 화려한 ‘역삼시대’를 마감하고 떠난 LG아트센터 그 빈자리의 새 주인이 드디어 나타났다. 비운 지 3년 만이다. 원래 그 극장 공간의 주인인 GS그룹이 ‘GS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극장, 즉 아트센터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오는 4월 GS그룹 창립 20주년을 맞아 ‘GS아트센터’ 오픈과 함께 개막 페스티벌을 연다고 한다. 극장 형태는 예전 그대로이되, 객석은 100여 석 늘어난 1200석 규모로 커졌다.
한국의 기업사에서 LG와 GS는 ‘동업의 미학’을 보여준 좋은 선례로 회자된다. 2005년 오랜 동업자에서 계열 분리를 통해 두 가문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면서 그룹의 본거지도 나뉘었다. 옛 LG아트센터가 있던 역삼동 LG 건물이 GS그룹의 헤드쿼터가 되자, LG아트센터는 17년을 그 건물의 우산 속에서 영업했다. 좀 특이한 동거를 마무리하고 LG아트센터가 떠나면서 그 같은 공간에 GS아트센터가 들어섰다.
관객 접근성 면에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연결점에 있는 GS아트센터의 입지는 예나 지금이나 최상이다.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저녁이 되면 텅 비는 넉넉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도 큰 장점이다. 주변에 다양한 식음료 가게도 즐비하다. 이런 외적인 인프라를 두루 감안하면, GS아트센터의 성공 가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늘어난 극장 객석 수는 회당 객석 단가에 민감한 뮤지컬 등 흥행 장르에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질 수 있다.
결국 숙제는 프로그램이다. 단골고객의 발길을 붙잡아 식당의 명성을 드높이는 것은 쌈박한 식당의 겉모습과 관심을 끄는 인테리어 못지않게 ‘맛’이 좌우한다. 그 맛에 중독되는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식당은 오래 번성한다. 극장에서 맛을 좌우하는 요소가 프로그램이다. 과연 본가에서 자신의 이름을 달고 새출발하는 GS아트센터가 선사할 맛은 무엇일까?
이 대목에서 나는 불가피하게 같은 공간에서 확실히 자기의 역사를 쌓은 LG아트센터의 전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그 역사 축적의 힘은 ‘참신함’과 ‘도전’이었다. 남이 하지 않는 것, 남이 못하는 것을 했다. 그래서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다른 극장과 차별화를 이뤘고 그렇게 브랜드가 된 ‘신뢰자본’이 명성과 역사를 만들었다.
25년 전 개관 당시 LG아트센터에 차별화하기 쉬운 사회문화적인 조건이 풍부했던 건 사실이다. 초대권 문화에 대한 염증, 인터넷 티켓 예매 시스템에 대한 요구, 세계 최고 작품을 보고 싶은 소비자 관객의 열망, 편리한 관람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담을 넉넉한 재원과 공간이 있었다. 그렇다고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다. 구슬 서 말을 잘 꿰어낸 오너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블루오션을 개척한 LG아트센터와 달리, 새내기 GS아트센터 앞에 놓여 있는 바다는 레드오션이다. 그사이 우리의 문화예술이 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워낙 다양하고 수준 높게 성장한 고로, GS아트센터가 독점적으로 선취할 조건은 거의 사라졌다. 경쟁사가 읽지 못하는 신종 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기업의 미래가 보장되듯 GS아트센터의 경우도 그와 같아 보인다.
생존 DNA로 단련된 기업이 운영하는 극장인 이상,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GS아트센터가 새로운 역삼시대를 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도약이 생명인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의 발레로 시즌을 시작하는 의미가 각별해 보인다.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강영숙의이매진] 미술관이 학교](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52025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