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년째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농업소득의 증대는 농업계가 지닌 숙원이지만, 통계 신뢰도가 낮아 정책 효용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진다. 조사 표본 확대와 농업소득 산정 방식 변경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통계청은 매년 농가의 수입·지출 내역을 분석해 ‘농가경제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 통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농업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가가 97만3707가구인 데 반해 표본 농가는 0.34% 수준인 3300가구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2020년 나온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선 표본수가 적어 지역·품목별 통계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표본 배분 시 연령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2022년 진행한 조사에서는 경영주가 59세 미만인 농가가 과소 대표됐다. 전국 농가 중 50∼59세 농가는 15.5%였지만 표본 내 비중은 9.4%였고, 49세 미만 농가 비중은 전체 농가 가운데 4.7%였지만 표본에는 1.6%만 반영됐다. 특히 40세 미만 농가의 경우 표본이 10가구 내외인 것으로 파악돼 청년농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에 농협 미래전략연구소는 최근 ‘농업소득 통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고 농업소득 통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보고서는 농업소득 조사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 표본 집단을 확대·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발표된 ‘2023년 농가경제조사’에서 농가소득의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인 반면, 농업소득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7.0%포인트로 다소 높았기 때문이다.
최영운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표본 오차를 줄이고 농업소득 통계를 지역·품목별로 살펴보기 위해선 표본 농가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연령대별 표본 추출을 전체 농가와 유사하게 현실화하면 표본 오차를 줄이고 농업소득 값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표본 확대를 위해선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만, 통계청은 농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국민적 관심이 적어 예산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인 만큼 연구소는 지속적인 공론화와 농정활동을 통해 예산 확보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보고서는 공익직불금을 농업소득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공익직불금은 농가가 영농활동을 영위할 때 지급하기 때문에 보조금보다는 농업소득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스위스·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선 직불금을 농업소득에 포함해 산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농업은 단순히 농업생산 활동에 한정된 개념이 아닌 더 넓은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에 공익직불금과 같은 이전소득이 농업소득에 포함된다고 봤다. 다른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농업노임도 현재는 농외소득에 포함되지만, 소득의 성격을 생각할 때 농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 연구위원은 “농협이 영농을 영위하는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배당금·직접지원금 등을 농업소득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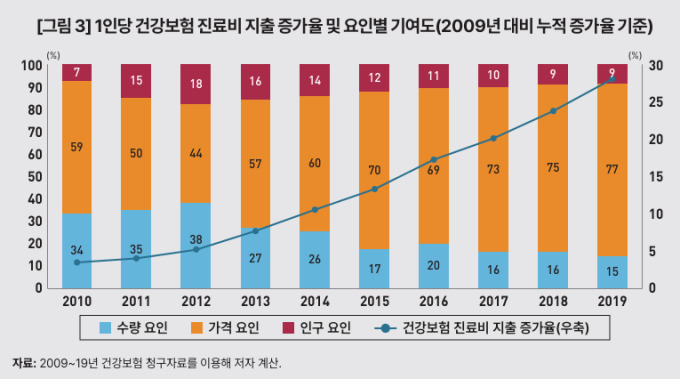


![수도권 주민들도 “지방소멸 대응 시급” [심층기획-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1/20250421519400.jpg)

![[특파원 보고] ‘고공행진’ 日 쌀값…비축미 방출도 역부족](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4/21/.cache/512/202504215008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