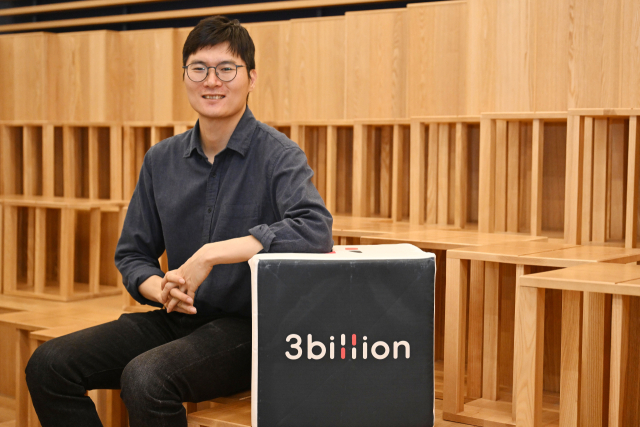며칠 전, 상장한 지 18개월 된 기업이 국내 뷰티산업의 ‘투 톱’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8조원대)에 올랐는데 수출이 실적을 이끌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24년 우리 화장품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102억 달러)를 찍으며 세계 3위 수출국에 올랐다(식품의약품안전처). 1, 2위는 프랑스(233억 달러)와 미국(112억 달러)이다. 게다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3위 시장인 일본에서 1위 수출국이 됐다. 2위 시장인 중국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에 이어 3위 수출국이 됐다. 미국 수출 비중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일본 내 수입 화장품의 30%를 차지했다고 한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 세계 3위
혁신성과 가성비가 실적 견인
건강과 노화 관리로 확장 추세
산학연 R&D 생태계 구축해야
45년 전, 화학과 교수로 ‘향장의 상식’(1980)과 ‘화장품의 세계’(1985)를 썼던 필자로서 감회가 남다르다. 화장품 관련 일반서적도 없고 대학에서도 관심 분야가 아니던 때, ‘향장화학’을 개설해 몇몇 졸업생이 화장품 산업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카이스트 이사장으로 와보니, 폴리페놀(녹차·포도씨·호두껍질 등에서 추출) 기반의 천연성분 샴푸가 개발되고 있었고, 지난해 시제품 품평에 참여해 뚜렷한 탈모 감소를 확인하며 반가웠다. 초고령 시대, 일상의 웰빙을 위한 R&D도 중요하지 않은가.
향장물질의 사용은 기원전 4000년 이집트 종교의식으로 거슬러 올라, 당시 향과 살균을 위해 유향과 몰약을 썼다. 클레오파트라는 납과 안티몬 화합물을 섞은 코울(kohl)로 눈화장을 했고, 연지벌레(코치닐) 색소를 입술에 발랐다. 엘리자베스 1세(1533~1603)는 즉위 4년(29세) 만에 천연두에 걸려 평생 얼굴 흉터를 가리느라 납과 식초를 섞어 가면처럼 바르고, 수은 성분의 붉은 염료를 입술에 발랐다. 납과 수은 중독에 걸린 여왕은 탈모로 인해 붉은색 가발을 썼다.
1938년 미국은 최초로 화장품 관련법 제정으로 안전기준을 설정한다. 1980년대 이후 화장품 산업은 스킨케어·색조·샴푸로부터 헤어케어·향수 등으로 확대된다. 2000년대에는 미용의료기기와 시술·홈케어기기·건강보조식품 등 건강·노화관리까지 포괄하는 뷰티산업으로 확장된다. 2025년 글로벌 뷰티산업 시장은 6771억 달러 수준이고, 연평균 성장률은 5~7%로 예상된다(KOTRA).
화장품 산업은 기능성 신소재 개발로 진화하고 있다. 히알루론산(보습), 나이아신아마이드(미백·항염), 펩타이드(항노화), AHA(알파 하이드록시산), 레티놀을 비롯해 실리콘 대체물질, 천연 계면활성제 등 다양하다. PDRN(연어 정소에서 추출)은 피부재생과 상처 치유에 효과가 좋지만, 윤리성과 지속가능성 논란이 있어 식물성, 미생물 발효 등 대체기술 개발에 눈을 돌릴 때다.
병풀추출물(Centella Asiatica)은 2010년대 초 한국에서 재생크림과 앰플로 제조되어 유럽과 미국으로 나갔다. BB크림, 쿠션 컴팩트, 마스크 시트도 한국에서 대중화됐다. 이들 제품 혁신과 높은 가성비는 K뷰티의 강점이다. 패키징과 제형 기술력, 맞춤형 AI 기술, 앱 기반 스킨 분석, 의료미용 시술도 경쟁력이 있다. 규제에서도 2024년 식약처는 OECD의 동물시험 대체 가이드라인을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도입해 기업의 리스크를 줄였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글로벌 유명 브랜드에 비해 브랜드 충성도가 떨어지고, 재구매율이 낮고, 중저가 제품 중심으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층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형별 수출 비중에서도 기초화장품 59%, 색조 15%, 인체세정용 12%, 모발용 10% 등 기초에 치우쳐 있다. 화장품 산업의 성장률 예측(2024∼30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란(26%), 사우디아라비아(11%), 멕시코(10%)가 가장 높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는 수십 가지 색상으로 톤업(tone up)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피부 전달체, 지속방출, 생체친화성 등의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에서 약세라는 평가다.
뷰티산업의 글로벌 선도국이 되려면 R&D 투자가 혁신으로 연결되는 산학연 협동의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 프랑스의 ‘코스메틱 밸리’(1994년 설립) 클러스터는 향수와 화장품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최고 수준의 R&D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일본도 해외 지역별 R&D 거점까지 연동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있다.
앞으로 뷰티산업은 AI 기반 분석과 AR 가상체험에 의한 맞춤형 개인 솔루션, 소셜 플랫폼의 콘텐트 마케팅, 의료미용·웰니스 융합, 비건, 클린, 천연성분, 친환경 리필형, 지속가능성, ‘가치중심’ 소비, K컬처와의 결합 등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 규제 환경이 변수가 될 것이다. 일례로 세계적 추세에 맞춰, 현재 규제에 막혀 있는 헴프(hemp) 유래 CBD(cannabidiol)는 향정신성의 THC 함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선에서 화장품 소재(항염·진정·항산화)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북 안동 헴프특구 운영의 경험을 살려 관심이 큰 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등)의 신산업으로 키워야 할 것이다.
김명자 KAIST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
![하이볼 돌풍 '주류 다크호스'…"K술로 세계 문 두드릴 것"[CEO&STORY]](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M091ETD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