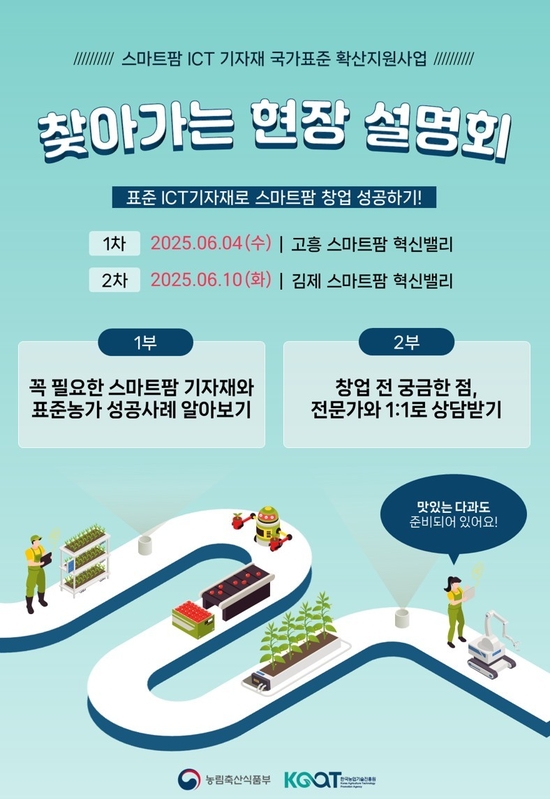“첫번째 표본구역은 세번째 이랑의 50m 부근입니다.”
21일 경남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의 한 마늘밭. 농기구 대신 줄자·계산기·연필을 든 사람들이 안내에 따라 밭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그러곤 익숙한 손놀림으로 폴대를 세워 네모난 구역을 표시하더니 듬성듬성 마늘을 뽑았다. 통계청의 마늘 생산량조사 시연회 풍경이다.
통계청은 매년 배추·무·양파 등 주요 농산물 15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생산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식량 수급과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소득 추계 등 정부가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마늘 생산량조사는 재배면적 66㎡ 이상의 표본추출 조사구 6620곳 가운데 539곳(8.14%)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구가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조사용 마늘을 채취할 표본구역을 정해야 한다. 표본구역은 조사구 1곳당 2곳씩 정해진다. 통계청은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로 생성된 숫자 배열인 난수표를 적용해 표본구역 위치를 계산한다. 난수표는 조사 당일 제공되기 때문에 현장 조사관은 사전에 표본구역 위치를 알 수 없다.

이날 시연회에 참석한 이형일 통계청장은 “간혹 조사관들이 쉽게 작업하려고 논·밭 가장자리를 표본구역으로 정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해”라면서 “임의로 선정된 난수표에 따라 표본구역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첫번째 표본구역은 세번째 이랑 끝에서 50여m 떨어진 기점으로 정해졌다. 조사관이 줄자를 들고 밭을 들어가 정확히 표본구역을 찾아 사방 3m 간격으로 폴대를 세워 표시했다. 표본구역 안에 심긴 마늘 중 20개가 최종 표본이 된다. 이때 채취할 마늘 위치도 난수표를 적용해 계산한다.
1분여 조사관이 계산기를 두드려 채취 대상 번호를 산출했다.
“2번·4번·7번·9번·12번…”
무작위로 불리는 번호에 맞춰 이 청장이 마늘 포기를 골라냈다. 마늘수확용 포크를 줄기 옆에 찔러 넣고 다른 손으로 줄기를 당기자 뽀얀 종구가 얼굴을 드러냈다. 무작위로 뽑은 마늘은 어떤 것은 크고 단단했지만 어떤 것은 작았다. 공정한 조사를 위해 크기·모양에 상관없이 표본으로 사용한다.

수확이 끝은 아니다. 손질이 남았다. 마늘에 붙은 흙을 잘 털어내고 뿌리 1㎝, 줄기 2㎝만 남도록 다듬는다. 이 상태로 측정한 무게에 건조율을곱해야 최종 생산량조사를 위한 무게가 산출된다. 보통 마늘은 손질한 뒤 20여일 건조한 뒤 도매시장에 출하되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형태와 똑같은 상태로 생산량조사를 하기 위해서 번거로워도 이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생산량은 10a(아르) 기준으로 산정한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농업통계에 드론이 활용되고 내년부터는 농림위성도 역할을 할 전망이지만, 여전히 사람 손을 타야 하는 과정이 적지 않다. 특히 농작물 생산량조사는 수확기 때 이뤄지는 일이다 보니, 표본구역 외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진행돼야 한다. 이날 시연회를 이끈 송경희 통계청 창원사무소장은 “정확한 농작물 생산량 조사를 위해선 농업 현장에 대해 경험이 많은 베테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시연회는 30여분만에 끝났다.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햇볕 아래서 진흙밭을 오가며 마늘을 뽑느라 얼굴은 땀범벅이 됐다. 그럼에도 조사관들은 “날씨가 좋아 일이 수월했다”고 평했다.
이 청장은 “생산량 조사·발표 시기는 정해져 있는 터라, 그때 맞춰 작업하려다 보면 폭우가 내리는 궂은날에도 조사를 미루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든 통계가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녕=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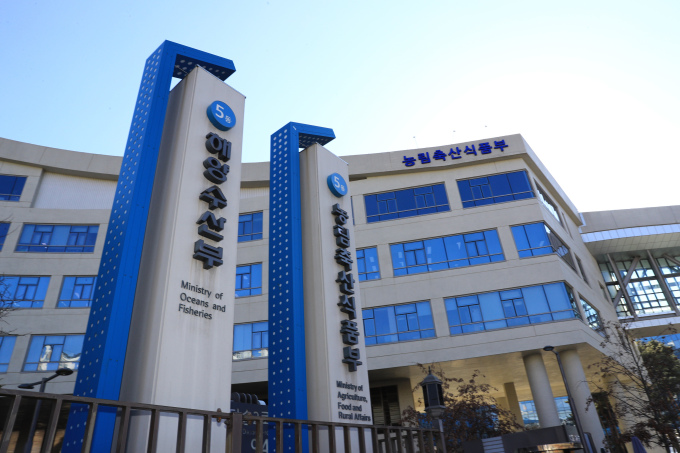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농촌 고령화·기후 위기 대비 스마트농업은 시대적 과제” [세계초대석]](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7/2025052751711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