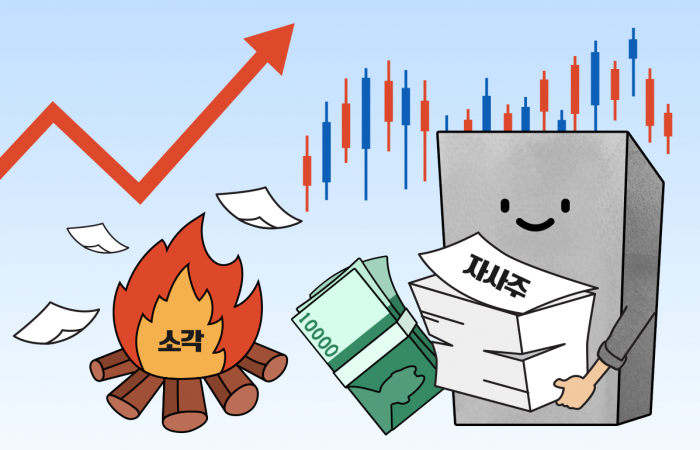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청년도약계좌’가 불과 2년 만에 폐지를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청년미래적금’이 그 자리를 대신할 예정이다. 명분은 중복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이라지만, 실상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어 온 ‘간판 갈이’의 전형이다.
문제는 청년들이 당장의 생활비와 고용 불안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정부가 예고 없이 정책을 갈아치운다는 점이다. 소득이 일정해야 납입을 유지할 수 있고, 납입을 유지해야 정부 지원도 받는다. 그러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이 모든 과정은 버겁기만 하다. 근본적인 고용 안정 대책 없이 금융 상품 이름만 바꾸는 정책은 시작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 초기 연 9%대의 실질 수익률로 인기를 끌며 200만명이 넘는 청년이 가입했다. 하지만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지율이 급증했고, 2024년 말 중도 해지율은 15%에 육박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불안정한 소득, 생활비 급등, 실업 등 구조적 문제 속에 설계만 복잡하고 실제 현장성과는 동떨어진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월 10만원도 납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해지율이 39.4%를 기록했고, ‘부모 찬스’ 없이 전액 납입할 여력이 없는 이들은 결국 이탈했다.
그런데도 정책은 또 갈아엎어진다. 이번엔 ‘청년미래적금’이다. 만기 기간을 짧게 하고,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 정부 매칭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향성은 나쁘지 않지만, 기시감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도,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출발했으나 정권이 바뀌자 예산과 지원이 줄었고 결국 단명했다.
결국 청년들이 정책 연속성 없이 몇 년 단위로 바뀌는 금융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마찬가지다. 5년 만기를 채워야 제대로 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데, 정부는 2025년 말을 기점으로 신규 가입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기로 했다. 기존 가입자는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책 변경 사실 자체가 중도 해지를 고민하게 만들고 장기 금융계획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그런데 예산이 투입된 정책에 대한 책임은커녕, 새 정권은 “우리 상품이 더 낫다”고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
금융은 단기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청년층은 가장 자산이 적고, 아직 미래가 불확실한 세대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더 높은 금리가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적금을 들고 5년, 10년을 내다보는 청년들에게는 정책 홍보용 상품이 아니라 ‘일관된 약속’이 절실하다.
정부가 진정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한다면, 정책 설계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야 한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부 매칭 비율, 만기 선택권, 납입 유연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도 해지 없이 정책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정책의 존속력이다.
정권마다 청년을 위한 새 상품을 내세우지만, 정작 청년들의 냉소는 깊어져만 간다. 잦은 변화의 끝에 남은 건 중도 해지된 계좌와 반 토막 난 신뢰뿐이다. ‘간판’이 아니라 ‘내용’을 바꿔야 할 때다. 청년 정책이 더 이상 정권의 쇼윈도 상품이 되어선 안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의 눈] 소비쿠폰 효과 지속가능하려면](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3/20241113500131.jpg)

![코스피 PBR 묻자 구윤철 부총리 “10”…개미 분노에 기름 끼얹었다 [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6IUXPJ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