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 붓, 먹, 벼루, 이 넷은 과거 한·중·일 필기의 필수품이었다. 특히 종이는 디지털 시대인 지금도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우주선 안에서도 종이는 필수품이라고 한다. 종이는 후한(後漢)의 채륜(蔡倫. 61~121)이 발명했다.
이번 사자성어는 문방사우(文房四友. 글월 문, 방 방, 넉 사, 벗 우)다. 앞의 두 글자 ‘문방’은 ‘서재’다. ‘사우’는 ‘네 벗’이다. 이 두 부분이 합쳐져 ‘과거 서재에 꼭 필요한 필기구 네 가지, 즉 종이, 붓, 먹, 벼루’의 별칭이 됐다. 현재 중국에서는 ‘문방사보(文房四寶)’라는 표현이 더 자주 쓰인다.
발명가 채륜은 지금 후난(湖南)성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학문에 관심을 가졌으나, 10대 후반에 궁으로 들어가 환관이 됐다. 총명하여 궁중의 각종 도구 제작을 책임지는 직책에 해당하는 상방령(尙方令)에 올랐다. 그는 최초의 종이인 채후지(蔡侯紙)를 발명해 후한 제4대 화제(和帝. 79~106)에게 바쳤다. 말년에 궁궐 권력 암투에 휘말려 처형될 위기에 빠지자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 명나라 탐험가 정화(鄭和. 1371~1434)와 함께 유능한 환관으로 평가받는다.
고대 중국의 ‘4대 발명품’ 가운데 하나인 종이를 채륜이 발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남다른 집중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성취였다. 궁정 안에서 고위직 내시였던 채륜은 화제의 눈에 들어 더욱 중용됐다. 화제가 총애하던 등(鄧)황후는 학문에도 조예가 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대나무를 세로로 잘라 글을 새긴 죽간(竹簡)이 넘쳐나는 황실의 도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을 읽고, 채륜은 죽간을 대체할 무언가를 발명할 필요를 느꼈다.
채륜이 닥(楮)나무를 종이의 소재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일화는 꽤 인상적이다. 그의 집중력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채륜이 종이의 재료를 찾기 위해 산을 뒤지다가 우연히 닥나무를 발견했다. 닥나무 가지를 직접 꺾고 있는데, 손에서 피가 났다. 자세히 살펴보니 잎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다. 비록 가시가 있어 채취하기엔 불편했지만, 가지의 껍질을 벗기고 당겨보니 껍질은 아주 질겼다. 끈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닥나무 껍질이 종이의 재료로 쓸모가 있겠다고 판단한다. 제작 원가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닥나무 껍질은 매우 단단하다. 채륜이 사람을 시켜 잿물에 담갔다가 삶기를 반복하게 했으나 너무 질겨서 잘게 부수는 데는 실패했다. 방법을 고민하는 불면의 밤이 계속된다. 하루는 어디선가 절구 찧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채륜은 정신이 번쩍 든다. ‘그래, 이래도 껍질이 부서지지 않고 버티는지 보자.’
날이 밝자 채륜은 사람을 불러 돌절구와 쇠로 된 절굿공이를 준비하라고 지시한다. 화학적 방법에서 물리적 방법으로 생각이 옮겨간 것이다. 이런 도전 끝에 탄생한 백색 저지(楮紙)는 기존 마지(麻紙)보다 더 엷고 더 부드러웠다. 더 이상 무거운 죽간이나 비싼 비단에 글을 쓰지 않아도 후세에 기록을 전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발명품이었다. 채륜이 발명한 이 종이는 1500년 이상 보존될 정도로 수명도 길다.
채륜은 이 종이 하나로 온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화제는 이 종이에 ‘화제지’나 ‘등황후지’가 아닌 ‘채후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채륜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성취였음을 인정하고, 그의 공을 기린 것이다.
바야흐로 키보드가 펜을 대신하고 모니터가 종이를 대신하는 시대가 됐다. 지금 이 시대의 ‘문방사우’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 아마도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환경, 충전기 또는 베터리, 이 넷이 차례로 머리 속에 스쳐갈 것이다. 참고로, 챗GPT에 ‘문방육우(文房六友)’를 물어보니, 여기에 태블릿과 클라우드 서비스가 추가된다고 답한다.
유용한 종이와 펜만은 ‘문방사우’에 꼭 포함시키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 등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선택이다. 종이의 중요성은 여전하지만, 변화와 혁신이 일상화된 시대임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홍장호 ㈜황씨홍씨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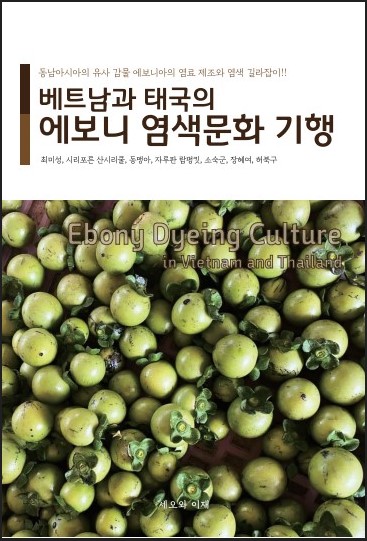
![[소년중앙] 우리 고유 한글서예 아름다움으로 새해 다짐 되새겼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0/1b05a48b-9ffc-4939-8507-0e3511d1ab10.jpg)
![[신간-대통령의 독서]다시 책 읽는 대통령을 기다리며](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88489_1739176835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