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종 논설실장

꽃이 작은 뜰에 붉게 피니 누런 벌들이 시끄럽고, 풀이 푸른 긴 둑엔 백마가 울고 있네.
‘화홍소원황봉료, 초록장제백마시(花紅小院黃蜂鬧 草綠長堤白馬嘶).’
조선 중기의 문신 김인후가 엮은 한시 입문서 ‘백련초해’에 나오는 구절이다.
아름다운 꽃밭을 노니는 벌들과 한가로이 둑에서 풀을 뜯고 있는 백마의 서정적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떠오른다.
▲꿀벌은 꿀을 생산할 뿐 아니라 생태계 유지에도 지대한 역할을 한다.
꿀벌은 꽃에서 꽃으로 꽃가루를 옮기며 식물의 생식 과정을 돕고,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꿀벌이 사라지면 꿀벌의 수분(受粉)으로 열매를 맺는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생태계 교란 및 심각한 식량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과, 딸기, 아몬드 등 전 세계 주요 작물의 70%가 꿀벌의 수정 활동에 의해 생산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연간 150억 달러 이상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선 꿀벌이 생태계 구성원을 넘어 문화·농업·종교·사회적 상징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조선시대 제사 때 꿀이 중요한 제물로 사용된 것이 한 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꿀벌은 언제부터 볼 수 있었을까.
동양종 꿀벌은 고구려 동명성왕 때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들어왔다고 한다.
일본서기에는 백제 태자 여풍(의자왕의 아들)이 643년 양봉기술을 신라와 일본에 전수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그 후 조선시대 때는 제주도와 섬 지방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벌꿀이 생산됐으며 벌꿀과 밀랍, 번데기는 영약으로 쓰였다고 동국여승지람은 기록하고 있다.
근대 양봉은 구한말 고종 때인 1910년 윤신영이 독일서 8년간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벌통과 서양종 꿀벌을 도입하면서 시작됐고, 현대 양봉은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이 미국 캘리포니아 농업시험장에서 테르백 이탈리안종 여왕벌 20마리를 들여온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꿀벌 개체 수가 기후변화와 농약 살포 등으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20년 이후 제주에서만 최소 2억마리 이상의 꿀벌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꿀벌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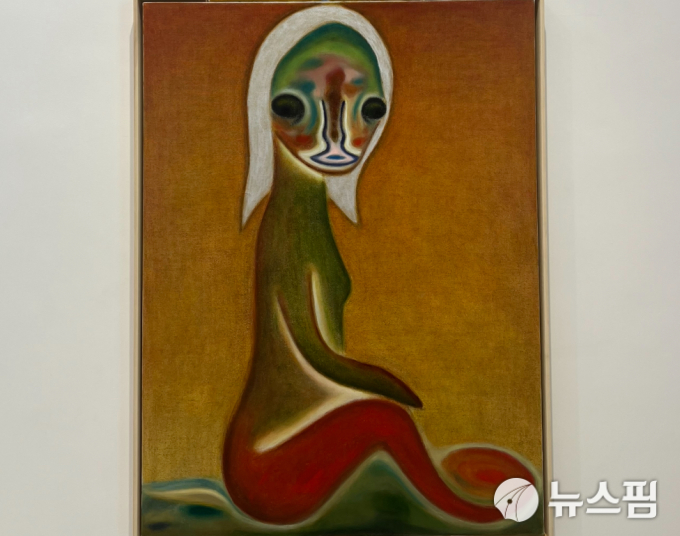
![[새벽메아리] 돌봄과 연대, 우리는 ‘함께’ 살고 있는가?](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8/25/.cache/512/202508255802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