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라면 어떤 질문을 하겠니?”
지난해 4월 신입 기자인 나를 취재 현장에 데려간 선배의 말이다. 선배는 이날 마주치게 될 취재원을 대상으로 3가지 질문을 뽑아오라고 내게 지시했다.
기자가 질문하는 목적은 명확하다. 뉴스가 되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에 대해 잘 모르면 적절한 질문도 어렵고 새로운 답변을 듣지도 못한다. 이 때문에 3가지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자료, 그 자료를 이해하기 위한 관련 자료까지 수십 가지 이상 자료를 봐야 했다. 독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파악해야 했다.
자료가 빈약하거나, 방향성이 불분명한 질문은 힘을 받지 못했다. 또 질문의 수준과 돌아오는 답변의 내용은 비례하기 때문에 질문하기 위해 늘 치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근 국내 클라우드 기업 임원으로부터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정부의 '질문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준비가 돼 있는데, 정작 정부가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좋은 질문을 만들기 위해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4차 클라우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와 경쟁·협력을 통해 국내 시장의 전체적 성장을 도모하면서도, 국내 CSP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핵심 영역에서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 계획이다.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은 이미 공공 시장에 발을 들였다. 그러나 국내 CSP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 역량 강화를 생각한다면, 정부가 혁신의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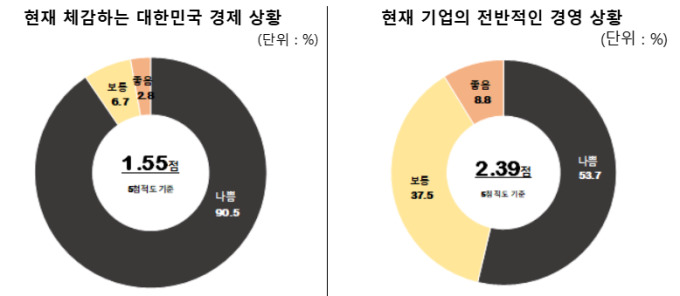




![[새 정부에 바란다] 병역자원 급감·첨단전력 부상…'소수정예 군' 전환 불가피](https://img.newspim.com/news/2025/05/09/250509141902577_w.jpg)
![현대모비스,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시장 진출…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276만명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OQBEZ0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