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이미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깊은 관심이 퍼져 있던 시기였다. 2년 전 파리에서 만난 작가는 현지에서의 케이컬처 열풍에 대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 음식점을 지나가다 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양철 도시락을 막 흔들고 있어요. 우리끼리 웃으면서 얘기한다니까요. 고추장에 밥만 비벼 팔아도 장사가 될 거라고.” 올해는 런던 한식집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다. 옆 테이블에 이십 대 외국 여학생들이 모여서 숟가락,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해 한식을 즐기고는 식당에 마련된 노래방에 들어가 케이팝을 불러댔다.
그렇게 외국 주요 도시들에서 케이컬처 열풍이 뜨겁게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때 나는 오히려 유럽의 현장에서 그들의 문화유산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로마의 고대 유산들과 유럽 곳곳의 대성당들, 피렌체와 베네치아의 르네상스 문화유산들, 19세기부터 20세기에 완성된 근현대 시각예술 작품들 앞에서 나의 눈과 마음은 심하게 출렁댔다. ‘유럽 사람들은 참 복도 많다. 선조들이 남겨준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엄청난 관광 수익을 내고 있잖아’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남의 떡’은 더 커 보였다.
시간이 지나 요즘 ‘우리 떡’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유명 OTT를 통해 6월 20일에 공개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때문이다. 채 한 달도 안 되어 케이팝 소재의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단숨에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우리나라도 문화평론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나 SNS에 케데헌을 언급할 만큼 폭발적 인기였다. 케데헌의 영향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외 관람객 수가 증명한다. 2025년 7월 외국인 관광객 수는 173만 명으로 한 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우리 전통문화 유물이 집중된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8월까지 약 407만 명의 1년 누적 관람객을 기록했으며, 이 중 외국인 관람객은 약 14만 명으로 역시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한다. 케데헌이 합류한 한류 인기, 외국인 관광객 수,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외국인 수의 상관관계는 분명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케이컬처의 매력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본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유형의 문화유산이 차고 넘치지 않는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수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많은 문화유산들이 소실되거나 약탈되었다. 유형 유산이 넉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음악, 춤, 드라마, 영화, 뷰티, 푸드 같은 문화 콘텐츠가 케이컬처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그리고 이 콘텐츠들이 복합된 사례로 케데헌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케이컬처를 이끄는 우리의 문화 콘텐츠는 무엇으로부터 발현된 것일까?
우리 민족의 독특한 문화적 정서는 ‘흥(興)’, ‘한(恨)’, ‘정(情)’ 등이다. 그 중 ‘흥’과 ‘한’의 정서를 눈여겨봐야 한다. ‘흥의 정서’가 발현된 대표적 예가 판소리, 탈춤, 농악, 노동요이다. 판소리는 각 지역의 명창과 소리꾼들이 농사를 짓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꿋꿋이 펼쳐보인 독특한 예술 장르이다.
탈춤은 양반과 사회의 부조리를 신랄하게 풍자하면서 서민들을 웃고, 울리며 그들의 억눌린 감정을 해소시켰다. 농악과 노동요는 노동의 고단함을 잠시 잊고 삶의 의미를 지탱해준 서민 예술이었다.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애환 속에서도 노래하고 춤추며 고된 삶을 버텨냈다. 그 흥겨운 문화 유전자가 현재 한국 대중예술의 맥박 속에 담겨 있다.
하지만 더 주목받아야 할 것은 한의 정서, 그리고 극복의 유전자다. 한의 정서는 외세의 침략(몽골, 왜구, 청, 일제), 사농공상이라는 신분, 여성 차별, 동족 간 전쟁과 이산가족, 민주화 운동 등에 수반된 억울함, 체념, 응어리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슬픔과 고통의 영역에서 정체되지 않았다. 판소리, 탈춤, 농악, 노동요를 통해 응어리를 풀어내고, 극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냈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도 한과 흥의 문화로 수없는 역사의 고비를 넘겨 왔다. 몽골과 왜구의 침략에 끝까지 항전했고 일제강점기에는 끈질긴 독립운동으로, 독재 정치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대항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3년 만에 극복한 국민의 저력도 놀랍지만,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최빈국이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회원국이 되어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된 유일한 나라이다.
지금 다시 한류의 열풍을 넘어, 케이컬처 광풍이 부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우리의 문화 콘텐츠 너머에 있는 놀라운 민족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은 한국인들의 문화부터 삶의 태도까지 모든 것을 궁금해하는 것 같다.
그렇게 나는 요즘 ‘우리 떡’을 다시 들여다본다. 한국 콘텐츠는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한과 흥의 정서 속에서 작동한다. 그리고 극복의 역사 속에서 빛난다. 지금 ‘우리 떡’이 ‘남의 떡’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은 이러한 흥의 문화, 극복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선조들의 지혜와 문화 유전자를 물려받은 우리 모두가 케이컬처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외국과 달리 우리의 문화유산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늘이 있으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귀한 문화 유전자를 물려주신 선조의 지혜, 극복의 정신, 그들의 흥과 끼를 지금껏 몰라봤다. 선조들께 용서를 구한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유치석 <전북도립미술관 학예연구팀장>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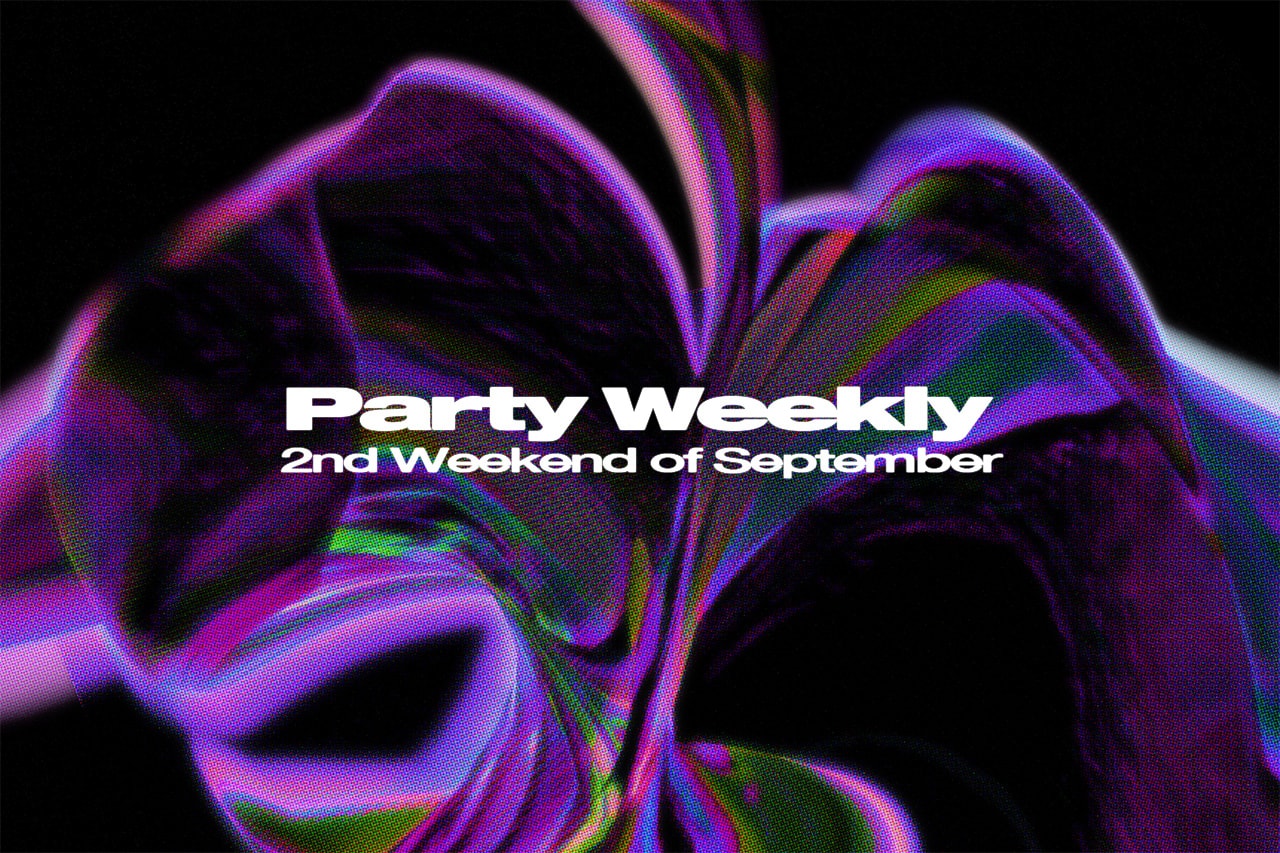


![문화예술이 가진 힘 [로터리]](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3W1TMK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