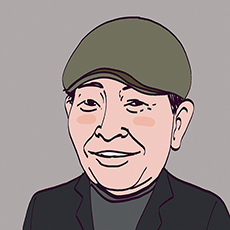
<만다라> <우상의 눈물> <짝코> <안개마을> <길소뜸> <티켓> <씨받이>. 1970~8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영화들이다. 〈짝코〉는 반공영화의 상징적 이름이 됐고, <만다라>와 <씨받이>는 베를린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 주목받았다. 이 영화들을 세상에 내놓은 사람, 시나리오 작가 고 송길한 선생(1940년~2024년)이다. 사실 한 편의 영화가 이룬 성취가 감독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지난날, 시나리오 작가의 존재는 부각되지 않았다. 70여편 영화를 남긴 그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가 그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덕분에 ‘전주국제영화제의 시작’을 기억하게 하는 그의 존재는 더 특별(?)해졌다.
송길한은 전주가 고향이다. 북중과 전고를 거쳐 대학 입학을 위해 서울로 갔지만 여러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다. 대한석탄공사 입사 시험에 합격해 직장생활을 했지만, 내놓을만한 직장은 딱 거기까지다. 막노동부터 시장 공판장 잡일까지 가리지 않고 일을 했던 그는 197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흑조>가 당선되면서 데뷔했다. 첫 영화이기도 한 <흑조> 이후 그는 가장 바쁜 시나리오 작가가 됐다. 10여 년 동안 밀어닥치는 시나리오 주문(?)에 무엇을 쓰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계처럼 주문을 받고 생산하는 글쟁이로 살았던 그를 자성의 시간으로 불러들인 것을 80년 광주항쟁이었다. 그즈음 임권택 감독을 만났다. 몸담았던 영화제작사를 그만두고 임 감독과 10년 동안 10개 영화를 연이어 써냈다. <짝코>를 시작으로 한국영화사에 굵은 궤적을 남긴 영화들이 이때 쓰였다.
그를 고향에 다시 부른 것은 전주국제영화제다. 영화제 초기 그는 부집행위원장을 맡아 영화제 틀을 다졌다. 변영주 감독의 <지역 영화사-전주> 시나리오를 맡아 오랫동안 기억되지 못했던 전북의 영화 역사를 기록하는데도 열정을 쏟았다.
그를 인터뷰로 만난 것은 7년 전이다. 그는 영화의 역할을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을 드러내고 함께 고민하며 치유하고 북돋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임권택 감독의 <달빛 길어 올리기>를 끝으로 작업을 중단했지만 좋은 시나리오 한편 남기는 일을 소망으로 삼은 이유도 거기 있었다. 그러나 ‘시대 정신을 담은 깊고 탄탄한 시나리오로 독립영화 정신을 가진 감독을 만나 좋은 영화 한 편 만들어보고 싶다’던 그는 결국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떠났다.
전주영화제가 올해로 스물여섯 해를 맞았다. 들여다보면 영화제의 노정 위에 수많은 사람의 열정과 시간이 놓여있다. ‘독립과 대안’을 내세워온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신과 가치가 지켜진 것도 그들 덕분 일터. 기억은 힘이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김은정 선임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시나리오 작가 ##송길한 ##만다라 ##길소뜸 ##전주영화사 ##베를린영화제
김은정 kimej@jjan.kr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