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관리자 되고 싶지 앟다" 최근 승진 기피 현상 확산
코로나 이후 개인 성장·워라밸 중시 경향 뚜렷해져
기존 경영 문화·리더십 부재가 '리더 포비아' 키워
유행은 돌고 돈다. 빨라도 너무 빨리 돈다. 괜히 아는 척한다고 "요즘 유행인데 몰랐어?" 이야기했다가 유행이 끝나 창피당하는 일도 다반사다. 트렌드에 민감한 기자들, 트민기가 떴으니 이제 걱정 없다.
이 기사를 읽는 순간에도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유행이 올라오고 트렌드가 진화한다. 트민기는 빠르게 흐름을 포착해 독자에게 전달하는 게 목표다.

그동안 성공의 지표로 여겨진 승진과 리더가 기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직장에서 리더가 되기를 회피하는 '리더 포비아'라는 현상도 자주 언급될 정도다.
지난해 글로벌 컨설팅 기업 로버트 월터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1997∼2012년 출생자)의 절반 이상(52%)이 중간관리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 72%는 팀을 이끄는 것보다 개인적인 성장과 기술 축적에 시간 쓰는 것을 선호하다고 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Z세대 트렌드 전문 연구기관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지난 5월 발표한 '20·30 직장인의 리더 인식 기획조사 2025'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절반(47.6%)이 리더를 맡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불안하다(22.1%)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030세대는 리더 직급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의미다.
또 중간 관리직을 맡고 싶다는 36.7%, 맡고 싶지 않다는 32.5%로 팽팽했다. 기피하는 이유로는 팀·조직 성과 책임 부담(42.8%)이 가장 높고 업무량 증가(41.6%), 개인 성향에 맞지 않아서(33.7%)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들어 '리더포비아'가 주목받고 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된 현상이다.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지난 2019년 2030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최종 승진 목표를 묻는 말에 직급 승진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응답이 41.7%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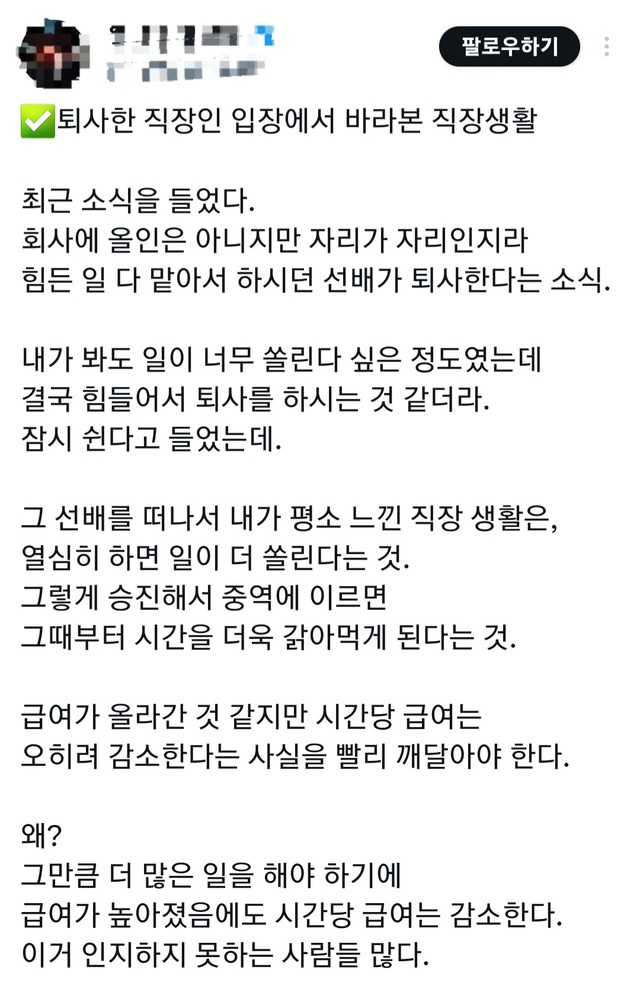
X(구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관련 경험담이 올라왔다.
지난 2023년 X의 한 이용자는 “최근 힘든 일 다 맡아서 하던 선배가 퇴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내가 봐도 일이 너무 쏠린다 싶은 정도였는데 결국 힘들어서 퇴사하는 것 같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그는 “내가 평소에 느낀 직장 생활은 열심히 하면 일이 더 쏠리는 것. 그렇게 승진해서 중역에 이르면 그때부터 시간을 더욱 갉아먹게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부터 존재했던 리더 포비아 현상이 최근 들어 더 두드러지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무환경과 가치관 변화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와 원격근무가 일상화되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약해졌고 빠른 승진보다 개인 성장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루시 비셋 로버트 월터스 이사는 하버스 바자와의 인터뷰에서 “Z세대는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과 자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더욱 개인적인 경력을 선호한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관리직은 스트레스가 많고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쌓였고 이에 따라 Z세대는 중간 관리직을 맡기 꺼리게 됐다”고 말했다.
관리자가 되면 팀원 업무를 감독하는 등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고 동시에 본인이 좋아하는 업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일부 젊은 직원들이 부실한 경영에 시달린 경험이 리더포비아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정구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는 올해 초 발표한 ‘리더 포비아 시대를 극복하는 진성리더의 급진거북이 전략’에서 “경기가 안 좋음에도 위에서는 여전히 높은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독려할 뿐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직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리더십 패러다임을 고민하기보다 현실성 없는 리더십을 강요하고 있다.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의 부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리더(십) 포비아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계파 잊고 중도·수도권·청년 바라봐야"](https://img.newspim.com/news/2025/09/04/2509041446029180_w.jpg)



!['초인공지능'은 광고문구?... AI 방향성 잃은 메타 [위클리 디지털포스트]](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9/55924_152765_138.jpg)

![세계인 1세대, 한 자유주의자의 초상...삶과 통찰 담은 자전적 에세이[BOOK]](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12e19796-33ee-4057-a6b3-c58617e3759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