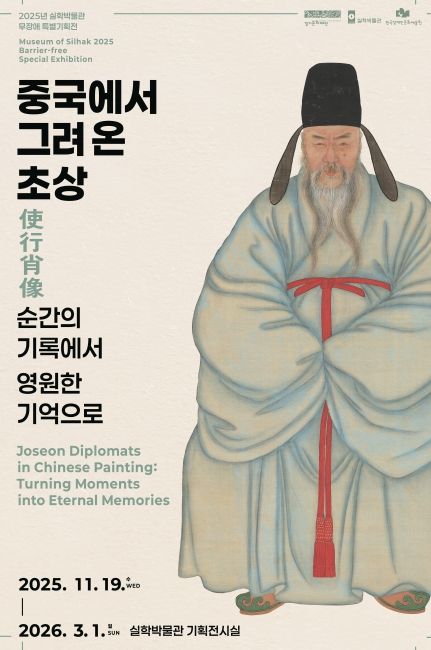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방이 있다. 그 방의 진열장에는 여행지에서 가져온 기념품이나 취향이 묻은 오브제, 혹은 추억이 깃든 물건이 놓여 있을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무의미한 물건일지 몰라도, 그것은 나에게 시간을 머물게 하는 장치다. 일상의 사물부터 공예품이나 민속품, 빈티지 소품, 고지도와 고문서, 희귀 광물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저마다 세계의 파편을 모은다. 수집은 단순히 축적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을 이어주는 방식이자 대상에 대한 애착이며 취향의 표식이다.
희귀 사물 가득했던 분더카머
계몽의 시대, 박물관으로 발전
수집은 시간의 흔적을 보관해
소멸에 저항하는 사유의 행위

‘분더카머(Wunderkammer)’, 즉 기이하고 신비로운 것을 모아 놓은 ‘경이의 방’은 그러한 수집의 기원을 상징한다. 16~17세기 유럽의 왕실과 귀족, 교양 있는 상인과 학자들의 진열장에는 세계 각지에서 모은 이국의 공예품, 동물의 박제, 광물, 지도, 천문기기까지 희귀한 사물들이 가득했다. 과학과 예술이 분리되기 이전의 분더카머는 세계를 하나의 전체로 이해하려 했던 시대의 유산이자,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질서화하려는 ‘호기심의 공간(Cabinet of Curiosity)’이었다.
그러나 18세기 계몽주의와 함께 수집은 공공의 성격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다. 왕실과 상류층 ‘수집가의 방’은 국가의 박물관으로 바뀌고, 진열장은 지식의 체계로 편입되었다. 한때 개인적 공간이었던 분더카머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유리 진열장 속으로 들어가며, 경이의 감정은 지식의 분류로 대체된다. 오늘날 자연사박물관이나 인류학 박물관, 장식미술관의 진열장에는 과거 경이의 방을 연상시키는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 문학과 예술은 오래전부터 이 상징적 공간의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해왔다.
발터 벤야민은 서재와 거실, 수집가의 방 등 19세기 부르주아의 실내 공간을 분석하며, 수집의 열정이 “기억의 혼돈과 맞닿아 있다”고 보았다. 수집가의 진열장은 단순한 물건의 집합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이 물질화된 장소이자 시간의 흔적을 보관하는 기억의 아카이브다. 오르한 파묵의 소설 『순수 박물관』(2008)은 그러한 기억의 방식을 감정의 차원으로 확장한다. 주인공 케말은 잃어버린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연인 퓌순의 물건을 집요하게 모아 하나의 ‘개인 박물관’을 만든다. 수집은 기억을 불러내고 시간을 공간의 질서로 전환하는 행위다. 파묵은 실제로 1990년대 중반부터 오브제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2012년 소설의 설정을 현실로 옮겨 이스탄불에 같은 이름의 박물관을 세웠다.
런던의 복합문화공간 바비칸 센터에서 2015년에 열린 ‘매혹적인 집착: 수집가로서의 예술가(Magnificent Obsessions: Artist as Collector)’ 전시는 분더카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표적 사례다. 기획자는 앤디 워홀, 피터 블레이크, 데미언 허스트, 히로시 스기모토 등 14명의 예술가들이 평생 모은 수집품을 선별해 진열장의 형태로 구성했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탐구하는 허스트는 여러 두개골과 동물 박제, 곤충 표본, 의학 모형을 선보였고, 블레이크는 빈티지 인형, 가면, 가게 간판 등을 통해 대중문화와 집단적 기억의 풍경을 연출했다.
스기모토의 수집품에는 고대 동물의 화석, 수술 도구, 해부학 모형과 판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집가들은 종종 특정 물건이나 주제에 대한 강박과 집착을 보이기도 한다. 예술가의 수집은 단순한 취향의 반영을 넘어 영감의 원천이며, 세계를 이해하려는 존재적 열망의 표현이다. 수집은 단순한 사물의 축적이나 소유를 넘어, 자신이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싶은지 드러내는 표식이자 스스로의 세계를 구성하는 창조적 행위인 것이다.
누구나 머릿속에 상상의 박물관을 구상하고 그것을 일상에서 실현할 수 있다. 수집은 버려진 것을 건져 올리고 잊힌 조각을 복원하며, 존재의 흔적을 조합해 삶의 서사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파묵처럼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기획하는 큐레이터가 될 수 있다. 과거의 귀족이나 상인, 학자들이 세계의 표본을 모아 진열했다면, 오늘날의 개인은 기억과 감정을 모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어떤 이는 미술품을 모으고, 또 다른 이는 피규어나 레코드판, 혹은 디지털 이미지를 수집한다. 디지털 시대의 수집은 더 이상 물질에 머물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미지를 저장하고, 감정의 조각을 기록하며, 잊히기 쉬운 기억을 디지털 공간에 쌓아 올린다. 온라인의 사진첩과 SNS에 구축된 자신만의 편집된 세계는 현대의 또 다른 분더카머다. 이미지 과잉의 시대에도 인간은 여전히 모으고, 분류하고, 배열하며 자신의 존재를 시각화한다. 수집은 소멸에 대한 저항이자, 존재의 흔적을 남기고 기억을 사유(思惟)로 바꾸는 행위다.
이준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미술비평가

![첫날 2만명 방문 '핫플' 됐다, 칸막이 없앤 도서관의 변신 [비크닉]](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5/9c79feb0-4fc9-4250-99d6-37f8c8c25c72.jpg)
![<류지연의 MMCA소장품이야기⑬> 보테로 ‘춤추는 사람들’ [아트씽]](https://newsimg.sedaily.com/2025/11/16/2H0H5Z46E4_1.jpg)
![[소년중앙] 이름은 ‘푸른 오동’인데 오동나무는 아닌 벽오동](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7/29a3439d-c43b-4a18-84db-9edaaff6265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