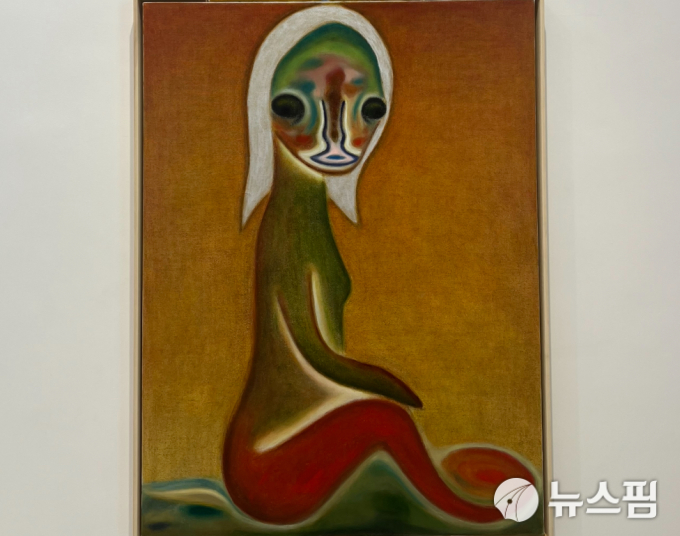오상학 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논설위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로 시작하는 노래에서 드러나듯이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된 한국에서 고향, 마을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인의 심상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한국인에게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고향의 심상 지리는 평생토록 잊히지 않고 유지된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만의 고향 이미지를 품고 그리워한다.
대부분의 학교 교가에는 ‘○○산 정기를 받아’라는 구절이 관례적으로 들어간다. ‘인걸은 지령이다’라는 전통적인 인식이 반영되면서 자신의 삶터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다. 특정한 산의 정기를 받으면 훌륭한 인재가 나오는데,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의 교가에 이러한 구절이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자신이 태어나서 자랐던 고향에 대한 애정과 정서적 유대가 다른 어떤 민족보다 강하다. 어떤 이에게는 어려서 뛰어놀던 뒷동산이 어떤 이에게는 여름에 멱감던 실개천이 고향의 이미지로 남게 된다. 고향의 이미지는 다양한 이미지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산천이다. 한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산천과의 정서적 유대가 강한 것은 우리의 산천이 지니는 다양한 모습에 기인한다. 우리의 국토는 도처에 산이 있고 계곡이 있다. 저마다의 색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고 그 모습에 자부심을 느낀다.
자신의 삶터에 대한 정서적 유대는 ‘동해물과 백두산’으로 시작해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으로 끝맺는 애국가의 가사처럼 한국의 국토 산하로 확장된다. 조선시대 청나라로 볼모로 잡혀갔던 김상헌의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보자 한강수야’라는 시조의 문장처럼 조선의 산천은 조선을 상징하게 된다. ‘삼천리 금수강산’은 한민족의 삶터이자 국가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미국의 국가(國歌)나 중국의 국가(의용군행진곡), 영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국토라는 상징을 내세우지 않고 자유와 깃발, 승리와 영광, 중화민족, 전진, 투쟁, 국왕에 대한 충성 등으로 채워져 있다.
과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체육계에서도 남북 단일팀 출전이 이루어졌는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한반도기를 앞세워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기도 했다. 남북 단일팀 깃발에 그려진 이미지는 단군 할아버지도 무궁화도 아닌 국토를 상징하는 한반도 지도였다.
통일에 대한 열망은 ‘백두에서 한라, 한라에서 백두’라는 슬로건을 탄생시켰다. 한민족은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의 국토를 사람에 비유하여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산맥이 이어진 것으로 보았다. 백두산은 머리고 한라산은 발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국토의 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조국 통일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애국가’라는 국가 이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변경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가사의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을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변경하고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한민족의 영토 개념을 버리고 ‘백두에서 송악까지’로 영토 개념을 축소시켰다. 전통적인 인간적 국토관을 버리고 반쪽짜리 국토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루 속히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국토의 일체성을 회복하는 날을 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