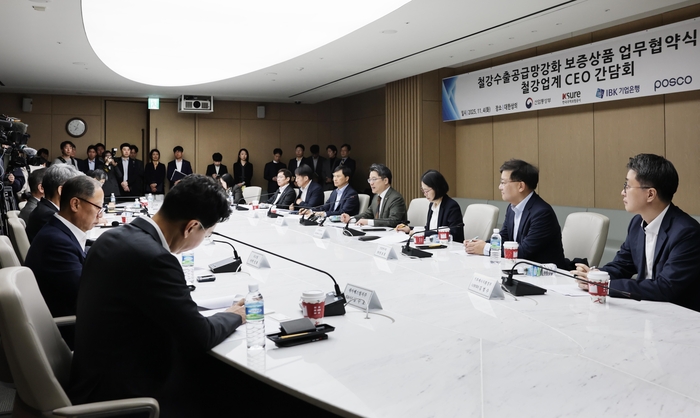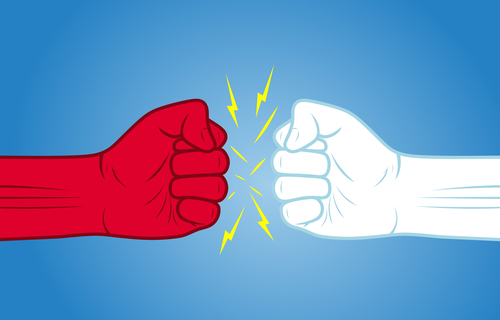정부가 구글·애플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구글이 여전히 국내 서버 설치를 거부하고 있어 불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전자지도 시대에 맞는 법·제도 정비와 공간정보 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구글, 다음 달 8일까지 애플의 반출 요청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다만 축척 1대5000 고정밀지도를 심사하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대행이 정해진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구글의 요청에 대한 정부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글의 요청은 불허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요구한 국내 서버 설치 조건을 구글이 끝내 수용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미 무역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만큼, 미국 정부 압박으로 인한 반출 가능성도 작아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과 별개로 장기적인 반출 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07년 이후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정부의 축척 1대5000 지도를 반복적으로 반출 요청한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반출 요건과 관리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대한공간정보학회장인 안종욱 안양대 스마트시티공학과 교수는 “지도 관련 법체계가 여전히 종이 지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전자지도 시대에 맞게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후 관리 방안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안 교수는 “고정밀지도 데이터는 반출 이후에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요청을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판단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의 위상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협의체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구성원 직위를 '과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협의체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면 실무진 목소리가 묻히고ㅡ 정권의 정치적인 판단에 고정밀지도 반출이 좌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정밀지도 반출로 인한 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 공간정보 산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도 서비스뿐 아니라 측량 등 관련 업계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를 보완할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반출을 허용하되 '유료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고정밀지도에서 스케일별로 레이어나 지형·지물 등을 법·제도 아래에서 오픈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고정밀지도 반출로 인한)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수익이 들어오면 어떻게 재분배할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고정밀지도 가치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고, '안보'를 이유로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불허해 온 정부의 논리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단독]AI 대전환 후속조치 마련 급물살…과기부·기재부 차관급 TF 공동 가동](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8KHZZG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