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손보험 가입자인 A씨는 2022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189만원을 받았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기준을 넘기면 그다음 해에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실손 보험사에서 초과 진료비에 대한 보험금까지 받은 상황. 원래라면 보험사에 건보 환급금을 사후 반환해야 하지만,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
# 자동차사고를 당한 B씨는 자동차보험 심사를 거쳐 경상에 해당하는 12급 '척추염좌' 진단을 받았다. 그는 460일 만에 보험사와 합의하면서 향후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969만원을 받았다. 현행법상 사고 피해자가 배상받고 합의했다면, 해당 배상액으로 사고 관련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B씨는 합의 후에도 건보 적용 치료를 받았고, 55만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A씨, B씨의 사례는 공공·민간보험이 따로 놀면서 이중지급과 과잉의료 등이 발생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런 문제로 연 3000억원 이상의 보험 재정이 건강·실손·자동차보험 사이에서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이 미뤄지는 사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상승 등의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계약은 3596만건(지난해 말)에 달한다. 실손의 덩치가 커지면서 건보와의 보험금 중복 지급,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는 '풍선효과' 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 보험금이 이중지급된 대상은 연평균 23만6000명, 금액은 2145억원 수준이다(2019~2022년). 특히 이중 수급 액수는 19년 1648억원에서 22년 2489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사가 안 줘도 될 보험금을 일부 실손 가입자에게 계속 주면서 재정을 갉아먹는 셈이다. 건보공단과 민간 보험사 간에 사후정산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가입자가 건보 환급금을 받아도 보험사에 알려주지 않으면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중지급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실손 손해율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중지급을 차단할 경우, 실손 손해율이 2.3%포인트 감소해 연간 보험료 2232억원을 인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무보험이지만 민간 영역에 걸쳐있는 자동차보험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보험사가 향후치료비를 지급한 정보가 건보공단엔 제공되지 않아 해당 환자가 향후치료비와 건보 진료비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가 흔하다.
향후치료비 수령 후 2년 이내에 사고 당시 상병으로 건보 진료를 또 받은 인원은 연평균 37만6000명(2019~2022년)에 달한다. 건보공단이 해마다 이들에게 진료비 882억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치료비는 자보 약관 등의 별도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정보 공유 미비로 건보 재정까지 낭비하는 셈이다. 특히 중복수급의 상당수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다. 향후치료비의 83%는 요추 염좌 등 경상 환자(상해 12~14급)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보는 진료 수가 기준이 건보보다 느슨해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문제도 크다. 지난해 경상 환자당 평균 입·내원 일수는 건보가 4.2일이지만, 자보는 9.1일로 두 배 이상이다. 건당 진료비도 자보 11만원, 건보 4만9000원으로 차이가 크다. 자보가 건보와 달리 급여·비급여 모두 보장해주긴 하지만,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많다는 걸 보여준다.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현행법상 건보공단·근로복지공단 간의 사후정산이 이뤄져 이중지급 같은 문제가 거의 없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건보 진료를 받았더라도 산재 승인 후 건보공단 부담금을 돌려받는 식이다. 지난해 산재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사후정산액은 2959억원(133만건)에 달한다.
건보·실손·자보를 둘러싸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 움직임은 더디다. 자보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이 올해 안에 이뤄질 예정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우선지급·환급금 사후정산'이 포함된 정도다. 문제 해결이 늦어질수록 보험 재정 악화가 누적되고,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 대안 중 하나로 꼽히는 공·사 보험 연계 제도화는 갈 길이 멀다. 앞서 2017, 2021년 각각 발의된 공·사보험 연계 법안이 별다른 진전 없이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의 골자는 건보·실손을 연계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고, 실태조사와 자료요청 등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정부 관계자 모두 "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여럿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중 어디가 정책의 키를 잡을지 교통정리가 필요한 데다, 의료계 등의 반발도 여전히 거세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공보험과 민간 회사의 사보험을 연계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민감한 환자 진료 정보의 유출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사보험 연계가 필요하지만, 이를 복지부가 주도하는 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실손은 사보험이라지만 비급여 풍선효과 등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법적 근거를 갖춰 공공 정책의 틀에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비급여나 이중지급 등에 따른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공·사보험 연계 제도를 갖추되, 환자 정보는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자동차보험도 과잉 진료를 줄이려면 심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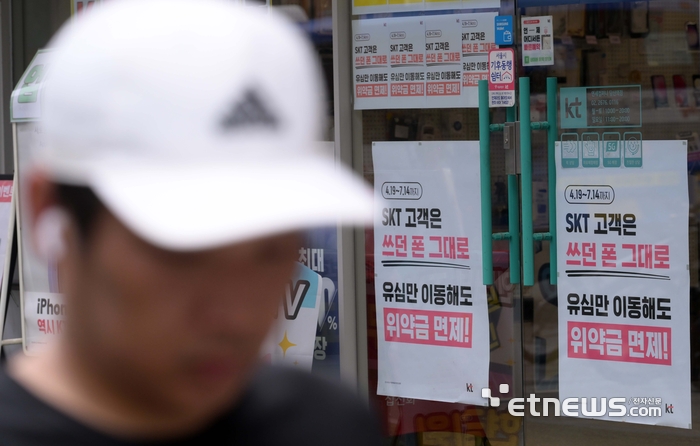

![[단독] ‘5곳 분신술 근무’ 의혹 권오을, 근로계약서도 안썼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6/7720d42f-c707-44c2-81a7-35efa4ba698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