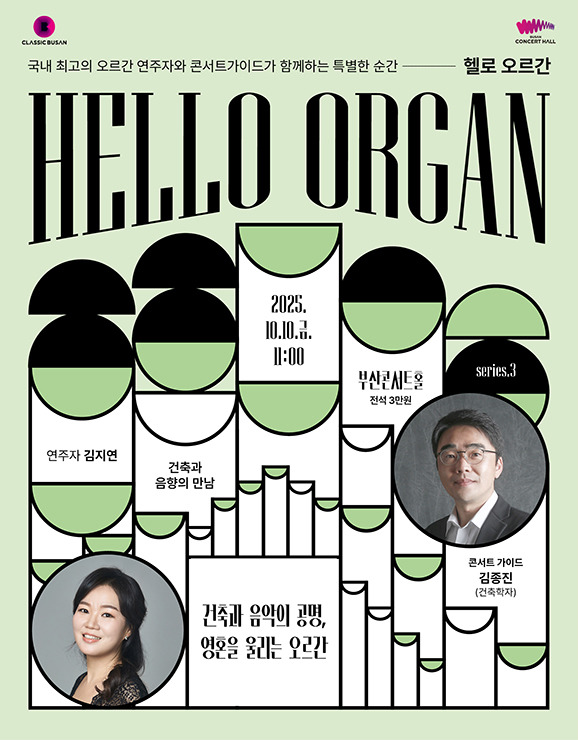추석 연휴 기간 KBS2 TV 특집 콘서트 ‘조용필-이 순간을 영원히’를 보며 깜짝 놀란 이유 중 하나가 30~40년 전 그의 히트곡이 지금 기준으로도 세련미가 빠지지 않아서였다. 비슷한 경험을 최근 경주 보문단지 내 우양미술관(옛 아트선재미술관)에서 했다. 이곳에선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겨냥해 백남준(1932~2006)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예술적 전환기 주요작을 공개하는 특별전(11월 30일까지)이 열리고 있다.
과문해서인지 2년 반의 복원 끝에 선보인다는 소장품 ‘전자초고속도로-1929 포드’(1993년)를 이번에 처음 봤다. 미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자동차 시대 출발점이라 할 1929년식 포드 모델 A 위에 한국 전통 가마를 얹은 모습이다. 기계문명의 장엄미를 뿜는 자동차 지붕 위에 전통 목가마가 왜소하게 느껴지려던 찰나, 내부 뒷좌석에 우아하게 자리 잡은 TV 모니터들이 눈에 들어왔다. 가마가 자동차에 밀려나듯 ‘전자초고속도로 시대’에 포드의 전설도 한때일 뿐이란 위트로 보였다. 자율주행이 가시권에 들어온 인공지능(AI) 시대에 얼마나 적절한 일침인지, 그러면서도 조선 가마와 1929년식 포드의 ‘장인적’ 조형미는 넋 놓고 감상할 만했다.

나아가 1991년 우양미술관 설립을 기념해 제작된 조형물 ‘고대기마인상’에선 이곳이 경주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건장한 말 위에 TV 모니터로 이뤄진 인간 형상이 타고 있는 이 설치작품은 1924년 경주시 금령총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국보)를 변주했다. 1500여 년 전 금령총 주인이 내세를 꿈꾸며 동반했을 기마 인물형 토기처럼, 백남준의 작품은 현대 미술관이 추구하는 ‘영원성’이라는 욕망에 부응하고 있다. “전통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했다는 그의 예술철학이 새삼스러웠다. 현대인의 달라진 점은, 무덤이 아니라 문화예술 전시장에 ‘레거시’를 남기길 원한다는 점이다.
잇따르는 전시·공연·축제 와중에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기획전 ‘한국 근현대미술: 4인의 거장들’(10월 12일까지)은 놓칠 수 없다. 김환기·박수근·이중섭·장욱진 등 근대 4인방의 주요작을 모은 전시에서 특히 박수근이 특유의 거칠거칠한 그림 표면을 고안한 대목과 관련 탁본이 눈에 띄었다. “나는 우리나라의 옛 석물, 즉 석탑과 석불 같은 데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원천을 느끼고 그것을 조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어릴 적 10원 동전 뒷면 다보탑을 종이에 문질러 본을 뜬 기억이 생생한데, 박수근 작품이 그래서 정겨웠는지 모르겠다. 황리단길 상점 벽면에서 이런 문구를 봤다. “모든 이의 생애 주기에 누구나 한 번은 경주가 묻어 있다.” 수학여행 이후 뜸했다면 지금이 APEC 문화예술 수도 경주를 만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