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이익 최우선에 일반·소액주주 권익 침해
美·獨 대비 법 제도 ‘미흡’…손해에도 보상 없어
증권집단소송 도입에도 효과 無…20년간 12건 그쳐
증시 회복·정책 성공 위한 입장차 축소 움직임 필요

지난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추진해 온 밸류업 정책이 암초에 부딪힌 모습이다. 정부의 야심찬 목표에도 작년 한국 증시는 오히려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글로벌 증시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올해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등 만만치 않은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저성장)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당장 트럼프의 고강도 관세정책으로 수출주들을 중심으로 타격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 짙은 먹구름이 끼인 상태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짚어보고 향후 성과를 위한 핵심 이슈들을 총 4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했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밸류업 효과를 되살려야 하는 만큼 기업·주주 등 이해 당사자간 입장 상충을 해소하며 투자자를 구제하는 법 제도 정비가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일반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취약해 투자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한 경우가 빈번했다. 기업들의 주요 의사결정 시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으로 삼아 일반·소액주주는 뒷전이었던 탓이다.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로는 ▲지배주주의 부당한 지분율(지배력) 증가를 초래하는 기업합병(M&A) 단행 ▲경영진의 지배권 확장을 위한 자회사 상장 차익 활용 ▲경영권 승계(계열사 확장)를 위한 기업 이익 사용 등이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SK C&C·SK의 합병, 이후 2020년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 등이 그 예다. 밸류업 정책에 대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한창이던 지난해 7월에도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주식 교환 및 합병이 발표되기도 했다.
원론적으로는 이사들이 주주를 위해 충실히 업무를 집행해야 하지만 일반주주의 권리만 침해할 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같은 주주의 이익 침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어 투자자 구제를 위한 법 제도 마련 및 개선이 절실하다.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져야 국내 증시의 질적 성장은 물론 밸류업 정책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국가들과 비교하면 투자자 구제를 위한 국내 법 제도의 미흡은 더욱 부각된다. 미국은 주주들이 합병유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독일에서는 합병 관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회사에 손해가 없는 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법 규정에 따라 시가로 계산한 합병에 주주들은 손해를 주장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사의 충실 의무에 관한 현 상법 개정안은 의무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에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자기주식 취득·분할 등과 같은 문제는 상법의 개별적인 규정에 포함되기에 상법이 개정돼도 ‘주주 보호’라는 명목만 있을 뿐이다. 이에 상법의 개별 규정의 개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을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사의 주주에 대한 간접적인 주주이익보호의무를 입법화하는 방안,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보호 의무를 인정하는 방안 등이 요구된다.
증권집단소송 등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은 기업의 회계부정·허위 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피해자 일부가 피해집단 전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집단 전체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소송을 하나로 묶어 심리하기에 사법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송 절차가 까다롭고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 기업의 반발에 독소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증권집단소송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소송 제기 건수가 고작 12건에 그친다. 평균적으로 1년에 단 한 건도 제기되지 않은 셈으로 투자자 구제를 위해 도입한 법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증시가 신뢰를 되찾고 밸류업 정책이 본격 가동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거나 기존 증권집단소송과 같은 제도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전제로 주주와 경영진, 이사회 등 이해 당사자들간 입장 상충 문제를 축소해야 성공적인 밸류업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두호 법무법인 송우 변호사는 “투자의 보호장치를 잃어버린 투자자들은 투자를 기피하고 이는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며 “정의와 형평의 관념을 바탕으로 주주평등원칙이 보다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주주가치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게 우선”이라며 “시장에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들간 의견 수렴 과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밸류업이 성과를 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관 단타 막는 코너스톤, 7년 표류 끝내야 [기자수첩-금융증권]](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877946_1458947_m_1.g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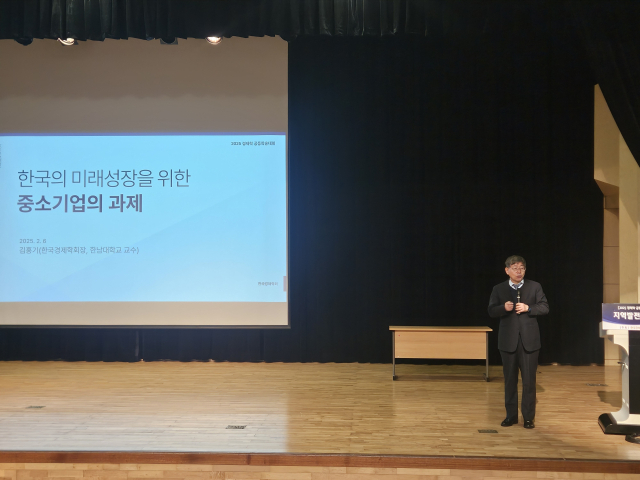
![펀드, 장기투자가 세금 2.5배 더 부담 vs. 美배당ETF 매도세 전환… 투자전략 재편 시급 [AI PRISM*금융상품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2/07/2GOVKGKGKC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