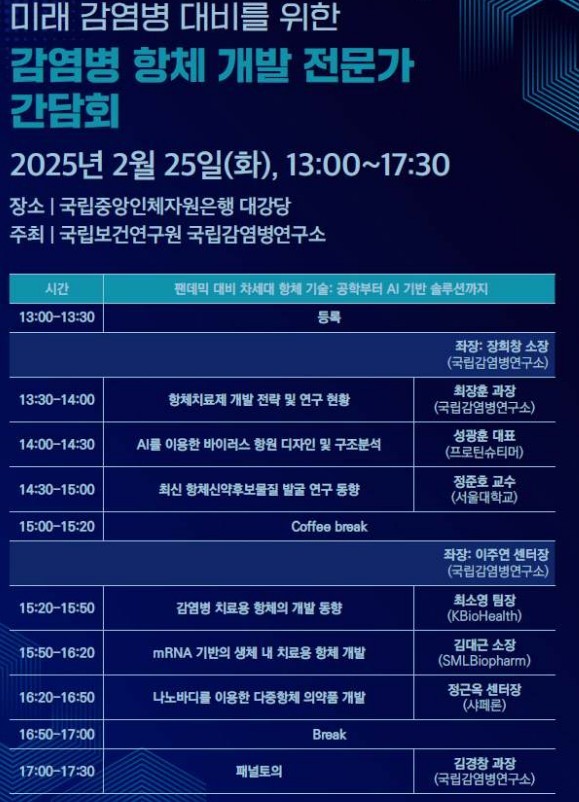국내 젊은 과학자들이 한국의 우수 연구평가 체계에 대해 10점 만점에 6.4점 수준이라는 평가를 했다.
25일 김상우 연세대 의대 교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이 공동 주최한 연구성과 평가 시스템 주제 한림원탁토론회에서 이런 젊은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국내 차세대 석학들로 평가받는 차세대과기한림원 회원 및 동문 회원 122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 이들 중 70%가 국내 우수연구 평가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학문 분야 간 형평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또 논문의 정량 평가지표인 임팩트 팩터(IF) 등 평가 기준에 의해 왜곡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꼽고, IF의 기계적 사용 및 학문 분야 차이 미반영 문제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평가 체계는 우수하다고 볼 순 없지만 완전히 나쁜 건 아닌 중간 정도란 체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며 "전문성 있는 평가자를 활용해 정성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과학자들은 연구성과를 정량 평가하는 지표들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영향력 지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동료평가 등 최근 대안으로 제시되는 평가 방법들을 소개했다.
최태림 스위스 ETH 취리히대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정성 평가의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두고 있고, 유럽 학교는 학과마다 6~8년 주기로 수일에 걸쳐 외부 자문단의 정기 평가를 진행할 만큼 연구성과 평가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며 "한국도 해외평가 도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학문의 독창성과 도전적 연구를 장려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승훈 기자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학기술이 미래다]〈153〉헌법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시대 개막…초대 위원장에 김성진 전 과기처 장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6/news-p.v1.20250216.615563edbbcd4f2a9a9193b90318df9d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