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4년 ‘인화’는 ‘코리안 드림’을 품고 홀로 한국에 왔다. 한국인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미등록 노동자가 됐고, 몽골로 돌아갔지만 남편은 딴살림을 차린 후였다. 인화는 어린 아들만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왔다. 공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웠다. 다섯 살이던 아이는 호준(한국 가명) 또는 호이준(몽골 가명)이라고 불렸다.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 법을 어긴 존재가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 고등학교까진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로 자란다. 법무부가 2021년 구제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내 출생이 아닌 호준은 대상이 아니었다. 이듬해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살아온 미등록 아동에게도 체류자격을 허용했지만, 호준은 재입국 기회를 얻기 위해 몽골로 자진출국한 뒤였다.
한국 사회는 그에게 끊임없이 ‘자격’을 물었다. 2022년 단기비자로 돌아온 뒤에도 두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32세 청년이 지난 8일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전북 김제의 ‘HR E&I’에서 일하던 중 장비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지난 6월 그토록 원하던 외국인등록증을 받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스러진 것이다. ‘강태완’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안겨줄 계획이었다는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의 부고글을 읽으니 더 안타깝다.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을 인터뷰해서 쓴 <있지만 없는 아이들>엔 존재를 부정당하는 이들의 삶이 낱낱이 나온다. 걸핏하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은 반문한다. “왜 당신은 한국에 살고 계시나요? 똑같아요.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거죠.”
이들에게 배제와 차별은 일상이다. 아이들의 ‘보통의 삶’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어도 아이들이 무사히 어른이 되도록 법과 제도의 그물을 짜는 일은 우리 사회에 남겨진 숙제다. 가슴 아프지만 강씨의 몸부림이 그 씨앗이 됐으면 한다.
강씨에겐 소원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비자 받으면 운전면허 따서 엄마 드라이브시켜 주는 것”이었다. 강씨는 사고 일주일 전 엄마와 ‘짧은 드라이브’를 마쳤다. 그의 명복을 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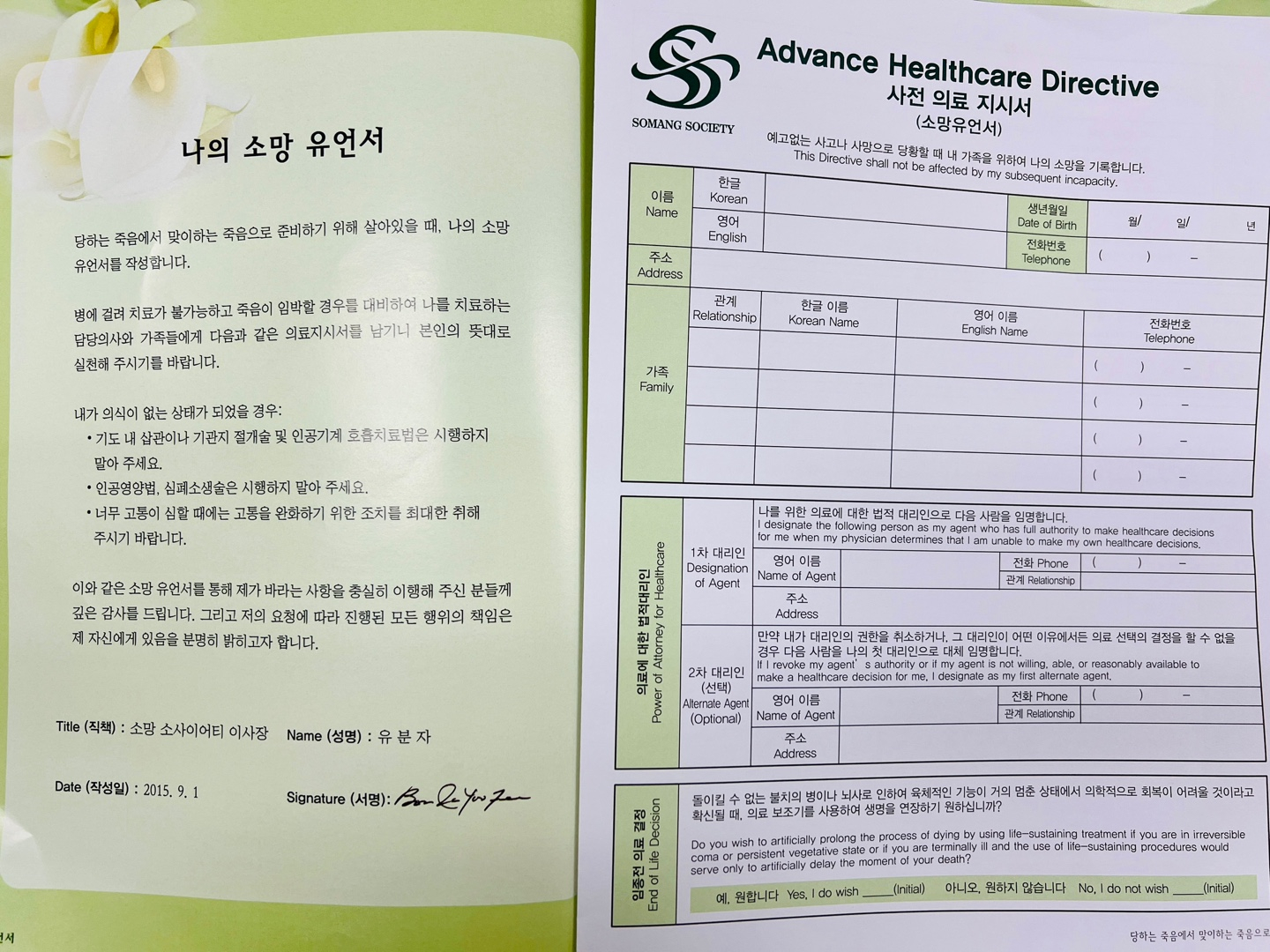





![[르포]“수능대박을 비나이다”…학부모들은 오늘도 묵묵히 기도 중](https://newsimg.sedaily.com/2024/11/14/2DGUANWRIK_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