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리 헨드릭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화오션 필리조선소의 수주 소식을 공유하며 “강력한 예산 지원에 힘입어, 곧 군사 부문에서도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썼다. 한화는 50억 달러(약 7조원)를 투입해 필리조선소 내 군함 건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한화의 군함 건조 사업 진출이 가시화됐다”는 전망이 나왔다.
#HD현대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 임원진은 10월 미국 미시간대를 방문한다.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진 등 국내 전문가 10여명과 함께 방문해 현지 전문가와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학과장은 “미국은 군함 분야에서 한·미 인재 협력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한·미 군함 사업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내 조선사가 미국 군함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투자는 물론 인력 양성에도 뛰어들고 있고, 미국도 규제 완화를 저울질 중이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지난 4월 ‘함정 동맹’을 체결했고,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 시설확대는 물론 미국에 군함 생산기지를 둔 호주 오스탈 인수에 나서고 있다.
비전투함 MRO부터 접근한 국내 조선사
한국의 군함 수출 역사는 길지 않다. 1988년 HD현대중공업이 뉴질랜드에 군수지원함 ‘엔데버호’을 수출한 것이 시작이었다. 프랑스·독일 등 전통 해양방위강국이 1960년대부터 수출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늦은 출발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꾸준히 해외 시장을 넓혀왔다. 2일 기준으로 HD현대중공업은 18척, 한화오션은 12척의 군함을 동남아·유럽 등 각지로 수출했다.

최근 국내 조선사가 눈을 돌린 것은 미국이다. 중국 해군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가 군함 건조와 MRO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다. 미 의회예산국(CBO) 1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은 신규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연평균 300억 달러(약 42조원)를 투입한다. 현재 보유 중인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64척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MRO 예산은 한해 74억 달러(2023년 기준, 약 10조원)에 달한다.

이에 한화오션은 지난해부터 군수지원함인 월리쉬라호, 유콘함, 찰스 드류호 정비 사업을, HD현대중공업은 앨런 셰퍼드함을 맡아 성공적으로 인도하거나 현재 정비 중이다. 미국이 자국 군함의 해외 건조·수리를 막는 ‘반스-톨레프슨법’을 시행 중이어서 비전투함 MRO 사업부터 접근하는 전략이다. 미 연방 의회에서 논의 중인 반스-톨레프슨법의 수정안(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이 처리되면 군함 건조·수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50년 전엔 함정 무기체계 ‘백지’
한국은 상선 건조를 막 시작한 1975년만 해도 군함 건조 기술력이 부족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올라간 청와대 보고서에 “울산 조선소에서 군함을 만들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길 정도였다. 선체는 만들 수 있었지만, 군함에 필수적인 통신 장비, 함포, 레이더 분야는 백지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60·70년대 북한의 해상 도발로 군함 건조는 절실해졌다. 1974년 박정희 정부는 2000톤(t)급 구축함 국산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국가 주도의 군함 개발을 시작했다. 관련 사업에 참여한 김정환 전 HD현대중공업 사장은 중앙일보에 “군함은 최신 전자장비와 전산 시스템이 들어가 스포츠카처럼 도전할만한 매력이 있었다”고 했다. 1980년 첫 국내설계·건조한 호위함 ‘울산함’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1998년 국산 전투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진수한 후 방위사업청과 조선업계는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함으로 눈을 돌렸다. 이지스함은 일반 구축함과 달리 미사일 방어를 위한 고성능레이더, 사격통제 시스템 등이 탑재돼 독자기술력으로는 짓기 어렵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지스함 사업을 맡은 HD현대중공업은 미국 록히드마틴에게서 3500억 원짜리 이지스 시스템을 사왔지만 설계 도면은 독자 개발했다. 난관 끝에 2008년 세종대왕함을 시작으로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등 3척의 이지스함이 실전 배치됐다.

美, 수년내 전투함 건조 맡길 수도
미국은 항공모함 11척을 운용하고 있지만 전투함, 군수지원함, 전략기동선, 수송선, 급유선 등 상당수가 노후화됐다. 중국 해군은 함정 370척을 보유해 대수로는 이미 미국을 앞서는데 대부분이 10년 이내 건조됐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은 “중국 해군력 견제가 시급한 미국으로선 법안 수정보다 속도를 낼 수 있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반스-톨레프슨법의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며 “수년 내에 국내 조선사가 운영하는 현지 조선소에서 군함 건조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초기에는 군수지원함 신규 건조를 맡기고 신뢰를 쌓은 뒤로는 무기체계가 탑재된 전투함의 선체 건조를 발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국내 조선업계는 첨단 함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1만5000~3만2000t급 무인 전력모함을 개발 중이고, 한화오션은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잠수함을 연구하고 있다. 한 조선업계 임원은 “한국은 구축함·잠수함·미래형 함정까지 건조할 수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것이 장점”이라며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요구에 맞춘 수출이 가능해 K방산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책에 몰래 기술 베껴"…獨에 잠수함 배우던 韓, 이젠 수주 경쟁 [K조선의 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3/eb1f464a-92bf-4d0c-a0a0-044a5ad2175f.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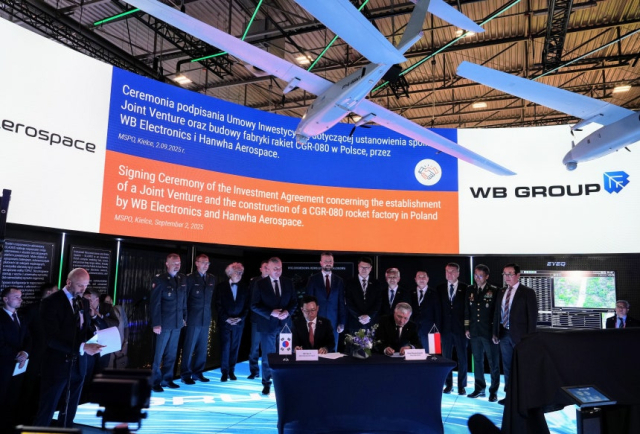
!['LNG 운반+쇄빙선' 다 돼? 알래스카 개발 급한 트럼프 홀렸다 [K조선의 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2/62fa5eda-e90d-44d1-9dd7-19b4bf05926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