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걸그룹 케플러가 9월 13일 중국 푸저우(福州)시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또 중국의 방송 인터넷 규제 감독 기관인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이 우수 프로그램 및 방송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어느 때보다 한한령 해제의 실현 가능성이 커 보인다.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2025가 가까워질수록 관련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한령 해제를 기대하려면 개별 사례보다는 중국 당국이 보인 궤적을 살펴야 한다.

중국에서 드라마 한류는 1993년 최진실·최수종 주연 드라마 ‘질투’가 관영 CCTV에서 방영되면서 시작됐다. 한국의 KBS, 일본의 NHK, 영국의 BBC에 해당하는 관영 CCTV에서 방영된다는 것은 중국의 국가적 공인을 뜻한다. 전 중국인이 제한 없이 드라마를 본다. 드라마 ‘질투’가 반응을 얻자 CCTV는 1997년에 ‘사랑이 뭐길래’를 방영했다. 이는 당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재방송된 1998년에도 시청률 4.2%로, 당시 최고 시청률 4.5%에 육박했다. 뒤이어 1999년에 방송된 ‘별은 내 가슴에’도 공전의 히트를 했다. 당시 최고의 배우이자 주인공이던 차인표를 제치고 안재욱이 한류 스타가 되었다. 최근 베트남 국빈 만찬에 안재욱이 초대된 이유다.
드라마 ‘겨울연가’보다 앞서 2002년 ‘가을 동화’가 중국 21개 채널에서 방송돼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 ‘가을 동화’는 중국 관영 CCTV에서 방영된 것이 아니라 지역 공중파 TV를 통해 방영됐다. 매우 인기가 있었음에도 관영 CCTV에서 재방송되지 않았다. 2005년엔 ‘대장금’이 중국에서 방영됐는데, CCTV도 지역 공중파 TV도 아닌 호남 위성 TV였다. 지역에서 송출하는 위성 TV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해외 드라마 역사상 최고 수준인 평균 시청률 3.5%, 평균 시청 점유율 15.3%를 기록했다.
한국 드라마는 중국에서 2002년 67편이 방영되던 것이 2005년엔 32편이 됐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높아졌는데 그 편수는 반 이상 줄었다. 이후 잠잠하다가 2013년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가 방영돼 크게 인기를 끌었다. 방송이 나간 곳은 위성 TV도 아닌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이(愛奇藝)였다. 2016년 ‘태양의 후예’가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끈 곳도 아이치이다. 중국 당국에서 놓친 것은 기존의 방송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한류 방송 콘텐츠가 젊은 세대에게 가늠할 수 없는 파급력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2017년 초 한국 드라마는 온라인에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세간에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보복이라고 했다. 규제 기관인 광전총국이 온라인에도 규제를 지시했다는 문건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앞선 궤적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다. 다만 이때부터 더 본격적이고 광범위하며 근원적으로 규제한 것이다.
중국에선 이미 2012년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표방한 문화 산업 정책이 작동하고 있었다. 중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주의 특색에 관해 문화 산업을 육성하는 기조를 정립했다. 문화 산업은 수출이 아니라 내수용이었다. 체제 결속과 확립을 위해 중국 전통 문화에 기반을 둔 콘텐츠 육성에 더 관심을 가졌다. 한국 콘텐츠는 그 반대 지점에 있다. 다만 상하이 이남 지역은 상업적 전통이 강하기에 비즈니스 차원에서 간간이 시도된 것이다. 이들 지역이 사실한 한류의 핵심 코어였다.

중요한 것은 2017년 이후 확립된 해외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당시 중국 대중문화 전문 매체 촨메이취안은 한한령의 주요 내용으로 신규 한국 연예기획사 투자 금지, 1만 명 이상 한국 아이돌 공연 금지, 한국 드라마 및 예능 협력 프로젝트 금지, 한국 연예인 출연 드라마의 중국 내 송출 금지 등을 보도했다. 텐센트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인수한 것은 신규 한국 연예기획사 투자 금지 원칙을 어기지 않은 것이다.
아직 한국 드라마의 중국 송출 소식은 없다. 케플러 같은 아이돌 공연은 관객이 1만 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1000명 이하일 가능성도 있다. 케플러가 공연할 푸젠미팅홀은 약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간 소규모 팬미팅이 간헐적으로 열렸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몇 곡을 들려주는 팬미팅이나 신곡 리스닝 이벤트가 상하이, 항저우, 충칭 등 대륙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
K팝은 개인의 자유와 꿈, 행복을 노래하는데 그러한 공연에 중국 젊은이들이 운집하는 게 중국 당국에는 불편할 수 있다. 한국만이 아니라 서구권의 아티스트도 마찬가지다. 광전총국은 물론 각 지방정부에서 언제든 공연 취소나 불허를 통보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 우수 콘텐츠는 허가를 하겠다는 발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수한 작품이라는 판단을 누가 내리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작품 자체에 대한 판단은 물론 편집의 가능성 역시 얼마든지 있음을 내포한다.
중국은 한국 콘텐츠를 점진적으로 규제해왔다. 2017년 한한령 때문만은 아니다. 설령 사드가 철거되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다. 중국 문화 산업 정책의 기조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항상 상황이 돌발적이고 유동적이다. 중국은 콘텐츠 기업이나 팬의 입장과 당국의 입장이 매우 다르다. 민간은 언제라도 한국 콘텐츠를 들여오려 하겠지만, 중국 당국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런 변동성을 전제하고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필자 김헌식은 20대부터 문화 속에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길이 있다는 기대감으로 특히 대중 문화 현상의 숲을 거닐거나 헤쳐왔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활약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같은 믿음으로 한길을 가고 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writer@bizhankook.com
[핫클릭]
· [K컬처 리포트]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가 케이팝이 아니라고?
· [K컬처 리포트] 한국 영화의 미래, '좀비딸'이냐 '전독시'냐
· [K컬처 리포트] 아이돌 좋아하는 20대가 일본 가수에 빠진 이유
· [K컬처 리포트]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가 '코리아니즘' 때문?
· [K컬처 리포트] SM, 홍대, 명성황후, 시대유감…1995년 한류의 씨앗이 뿌려졌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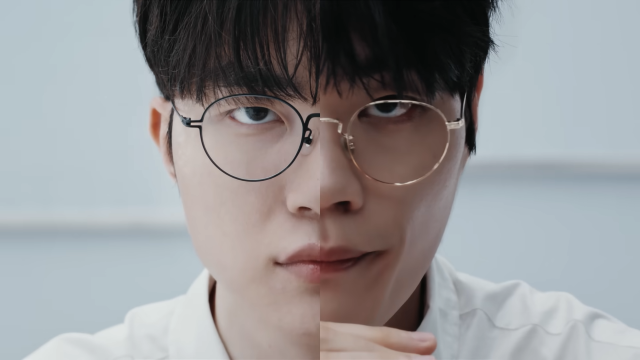


![[중국 콘텐츠 산업동향] Z세대 소비가 키운 라부부…중국 IP 산업 수출 급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9/4aae517e-a9ea-4089-b18a-6cf18bf807c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