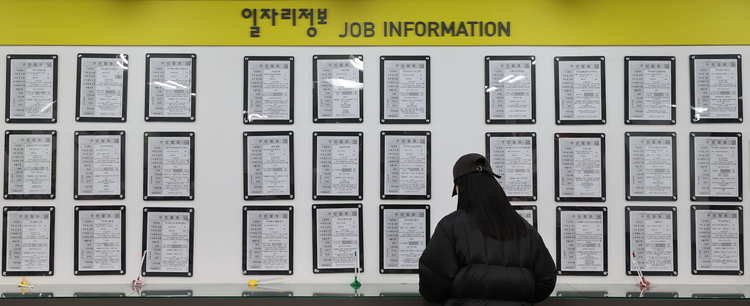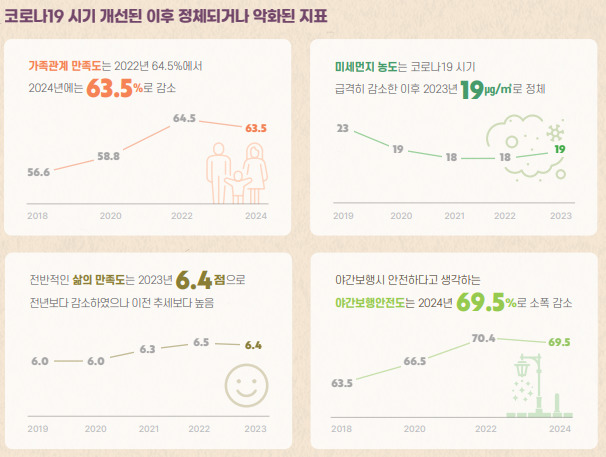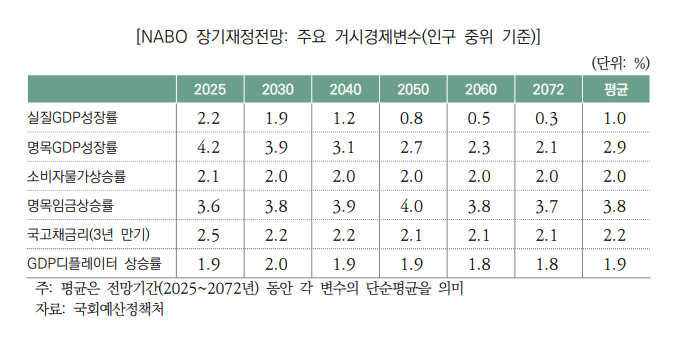노동통계 집계서 지난해 1100만명 근로
5세대 함께 근무하는 새로운 시대 열려

2015년에서 2024년 사이에 65세 이상 노동 인구가 33%나 증가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연방 노동통계국 집계에 따르면 이 기간 16세 이상 노동 인구 증가율은 8.4%에 그쳤다. 같은 기간 20세~24세는 1.1% 증가에 그쳤고 45세~54세는 오히려 1.9% 줄었다. 연령별 노동 인구 증가율의 극적인 대비는 미국의 노령화를 잘 보여준다.
65세 이상 노동인구는 지난해 1100만 명에 이른다. 전체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로 10년 전의 5.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퓨리서치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동인구는 1980년대 이후 4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약 20%가 여전히 일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35년 전보다 2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들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7년 2%에서 지난해 7%까지 늘어났다.
보스턴 칼리지의 은퇴연구센터 로라 퀸비 부소장은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노령화와 함께 은퇴 이후 재정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들었다. 은퇴 시스템은 민간 부문에서는 회사 연금에서 401k로 바뀌었고 정책 면에서는 소셜연금 100% 수령 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미뤄졌다. 퀸비 부소장은 이런 변화가 65세 이후 노동 인구 증가 원인의 하나로 분석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 이후 연금제도가 축소되고 개인 저축 의존도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은퇴를 미루고 일하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은퇴 이후 재정 측면에서 개인의 몫이 커지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 이후인 X세대와 밀레니엄 세대, Z세대로 갈수록 심화할 수 있다. 지금의 65세 이후에서 나타나는 은퇴 지연을 젊은 세대는 열정의 문제보다 경제적 이유로 평생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우려할지도 모른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베이비붐 세대처럼 직장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성향이 약하다.
일하는 시니어가 많은 데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대학 학위 비율이 높은 이유도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보다 지식 기반인 경우가 많다. '은퇴란 없다(Unretired: How Highly Effective People Live Happily Ever After)'의 저자 마크 월튼은 60세~80세가 은퇴 대신 계속 일하는 사례를 다루면서 경제에 있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책에는 60세 이후에도 고강도 업무를 계속하는 60세 이후의 의사 등이 사례로 등장한다. 이들 중에는 은퇴했다가 삶의 목적을 상실한 듯한 기분을 느꼈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윌튼은 이를 바탕으로 직업과 경력의 개념이 새롭게 바뀔 것이며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고독과 무료함도 은퇴를 늦추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월튼은 저서에서 은퇴자 1500명과 같은 연령대의 근로자 400명을 비교한 조사결과를 인용했다. 은퇴자 가운데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이들은 44%에 그쳤다. 절반 이상은 외로움과 공허함, 절망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은퇴 뒤 이런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높았다.
지난 10일 레주메템플리츠닷컴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65세 이상의 25%가 은퇴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3%는 적극적으로 일을 찾고 있다고 답했으며 6%는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는 일이 좋아서(61%)가 가장 많았고 무료할까 두려워서(42%), 생활비가 부족해서(39%)가 뒤를 이었다. 무료함과 생활비 부족은 평균수명 증가와 맞물려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 회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이 65세 은퇴는 오토만 제국 시대에 시작된 것이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다.
상황 변화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월튼은 기업도 현실적으로 노동력 부족에 직면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급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력 부족이 대두되고 있다. 베이비붐 이후 출생률이 계속 하락한 상황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기업들은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추세에 맞춰 시니어를 고용하거나 시니어 직원을 배려하는 회사도 늘고 있다. 부킹닷컴은 기존의 휴가 외에 조부모 휴가 10일을 추가했다. 그로서리 마켓 체인인 웨그먼스는 시니어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별도의 구인란을 마련했다.
경력이 50년 가까운 고령층이 일하는 시대가 되면서 직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베이비붐 세대 등 5세대가 함께 일하는 곳으로 변하고 있고 이에 맞춰 사내 분위기와 가치도 바뀌고 있다.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직원이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 사람을 관리하고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와 대면 근무가 병행되면서 동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근무 형태가 다른 동료들의 근무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업무 효율과 높이는 조건이 됐다. 세대와 특성이 다양한 직원들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는 소프트 스킬을 갖춘 기업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효과적인 팀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은퇴를 늦추고 일을 계속하려는 시니어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성과 함께 인공지능(AI) 같은 새로운 테크놀러지를 익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AI는 업무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익혀야 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한때 직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상이었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기술적 우위를 갖는다는 시각이 있었지만 이제 막 시작된 AI 시대에서는 누구도 AI에 익숙하지 않다.
현재 중장년층 근로자들은 1980년대의 개인용 컴퓨터(PC) 보급과 1990년대 인터넷 확산, 지난 20년간 소셜미디어의 부상 등 기술적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해 온 경험이 있는 세대다. 이제 적응할 새로운 기술이 AI일 뿐이다.
안유회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