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가 반도체, 인공지능(AI)에 이은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바이오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바이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민관 협력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병원 중심의 임상시험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18일 삼일PwC가 발간한 ‘K바이오 골든타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올해 5375억 달러(약 787조 원)에서 2034년 1조 7962억 달러(약 263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팬데믹 당시 백신·치료제 공급망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자 주요국들이 바이오를 단순 기술 영역이 아니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全) 주기 지원 체계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 상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구조적 생태계를 구축했다. 누적 1조 엔(약 9조 원)에 이르는 투자가 이뤄진 결과 다이이찌산쿄는 ‘엔허투’로 항체약물접합체(ADC) 시장 선두로 부상했고 에자이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완전 승인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보고서는 한국 바이오 산업도 기술력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태계 전환을 위해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처럼 전 주기 자금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자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 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블록버스터(연 매출 1조 원 이상 의약품) 신약 개발 상당수가 공공과 민간의 전략적 결합으로 탄생했다.
서용범 삼일PwC 제약바이오 산업 리더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한국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일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부·기업·학계가 협력하는 통합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 중심으로 임상시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기초연구와 임상 간 기술이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AI 기반으로 공동 연구 플랫폼을 운영해야 데이터 기반의 임상 설계와 예측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이다. AI가 신약 개발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의료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확보도 국가 차원의 전략 과제다.




![적자에도 투자 2배 늘려…글로벌 빅파마도 놀란 프런티어 기술[K바이오가 달라졌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NK5P01_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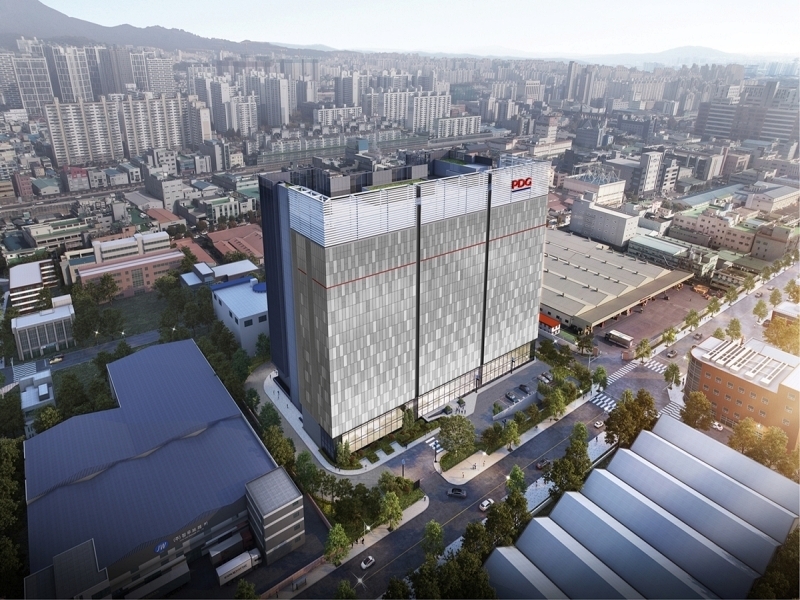
![[ET톡] 제조업 AI 전환, 이제 시작이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7/25/news-p.v1.20240725.d8c58344d169433f95bf5df4f5153443_P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