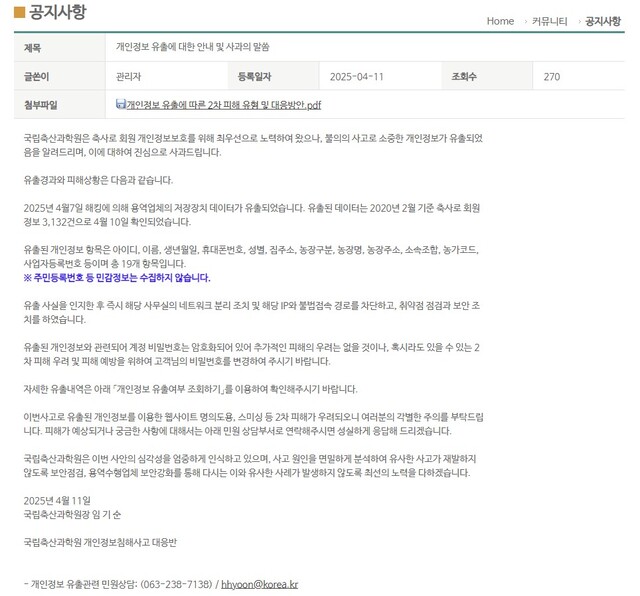(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이어 두 번째 AEO 공통요건에 대해 살펴보자. 두 번째 공통요건은 ‘경제운영자의 경제활동이 EU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EU 집행위원회의 AEO 가이드라인(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Guidelines by EU Commission)은 EU 관세법이 적용되는 관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제운영자에 대해 제조업자(Manufacturer), 수출자(Exporter), 수입자(Importer), 운송주선업자(Freight forwarder), 보세창고업자(Warehouse keeper),
기타 보관업자(Other storage facility operator), 세관대리인이나 통관법인(Customs agent/representative), 운송인(Carrier), 공항만 조업사(Terminal operator) 등을 나열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9개 업종외에 다른 업종의 AEO 신청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세번째 공통조건으로 ①기업 활동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관세법 및 과세 규칙에 대한 심각한 침해 또는 반복적인 위반이 없어야 하며
②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 운영 및 물품 흐름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가 가능함을 입증해야 하고
③양호한 재정 상태를 입증해야 한다. (제39조)
기업 활동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관세법 및 과세 규칙에 대한 심각한 침해 또는 반복적인 위반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관세관련 법령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를 저지르거나 반복하지 않았으며,
신청인 스스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심각한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만일 신청인이 자연인이라면 신청인과 신청인에게 고용되어(Employee) 관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모두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의 경우는 신청인, 신청인을 관리 ․ 통제하는 자, 그리고 신청인에게 고용되어 관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모두 상기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이행규칙 제24조 제1항)
예를 들어, 이미 다국적 기업 A가 프랑스에 자회사 B를 설립하였는데, 자회사 B가 프랑스 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으로 인정되고 EU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활동을 하고 있어, 자회사 B가 AEO를 신청한다고 하자.
이 경우, 신청인인 기업 B,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C, 그리고 신청인인 자회사 B를 관리 ․ 통제하는 모기업 A 모두 지난 3년간 관세관련 법규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를 저지르거나 반복하지 않았으며,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심각한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만일 신청인을 관리 ․ 통제하는 모기업 A가 제3국에 설립된 경우, 또는 신청인 B가 설립된지 3년 미만인 경우, 모기업 A와 신청인인 자회사 B에 대한 평가는 관할 세관이 수집가능한 기록과 정보(Records and Information Available)에 따라 결정된다.(이행규칙 제24조 제3항, 제4항)
유의할 것은 EU 관세법은 ‘심각한 위반 행위의 정의’를 두지 않고 있고, 각 회원국 관세법이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각 회원국 관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 회원국마다 AEO 심사 기준이 달라져,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EU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은 ‘심각한 위반 행위’를 판단하는 일반 원칙과 구체적인 사례를 자세히 나열해 놓았다.
먼저, 심각한 위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반복(Cumulation), 보안(Security), 물품의 국제적 이동(International Movement of Goods), 고의성(Deliberate Intent), 사기(Fraud), 명백한 과실(Obvious Negligence)를 언급하고 있다.
반복이란 기준은 위반 행위 발생 이후, 즉각적인 조치를 통한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차단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관할 세관은 위반행위가 기업내 특정인의 우연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결함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만일 구조적인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심각한 위반행위로 보아야 한다.
구조적 결함에 의해 발생했다면 추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보안은 국가나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따라서 관세액을 잘못 계산했다던지, 세관 절차에서 부과되는 각종 의무기간 미준수 행위 등 보안과 관련이 없는 위반행위는 사소한(Minor) 행위로 본다.
물품의 국제적 이동 역시 마찬가지다.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물품이나 위반행위 자체가 타 회원국이나 기타 제3국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심각한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고의성과 사기가 발견된 경우, 가이드라인은 이를 심각한 위반행위로 간주하도록 각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과실(Negligence)의 경우도, 명백한 과실(Obvious Negligence)의 경우, 심각한 위반 행위가 될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명백한 과실의 기준으로 관련 법률의 복잡성, 기업의 주의정도, 관할 세관이 기업에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법률이 복잡하지도 않은데 과실을 저질렀거나, 기업이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경우, 이는 명백한 과실이며 심각한 위반 행위로 간주될수 있다.
위반행위는 사후에 발견된 행위도 포함된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사후 통제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바로 위반행위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EU 관세법과 달리 EU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은 포워더, 대리인의 위반행위도 평가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상 모든 세관절차는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EU는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세관절차를 진행하는 ‘간접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그 위반행위로 인해 부과된 형사 범죄기록도 참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밀수(Smuggling), 지적재산권 침해(IPR), 허위 원산지 신고(False Origin Declaration), 의도적인 잘못된 품목분류(Delibrate Imsclassification)등을 나열하면서 이러한 형사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심각한 위반행위라고 인정하도록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프로필] 임현철 관세관
•제47회 행정고시
•외교통상부 2등 서기관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국경감시과장
•김포공항세관장
•(현) EU 대표부 관세관
• 저서 : '관세를 알면 EU 시장이 보인다'(박영사)
• 논문 : EU PNR 제도 연구(박사학위 논문)
• 논문 : EU 국경제도(쉥겐 협정)의 두기둥: 통합국경관리와 프론텍스
• 논문 : EU 국경관리 제도 운용을 위한 EU의 입법적 역할 연구
• 논문 : EU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패널티 규정 부조화(Non-Harmonisation)와 EU의 대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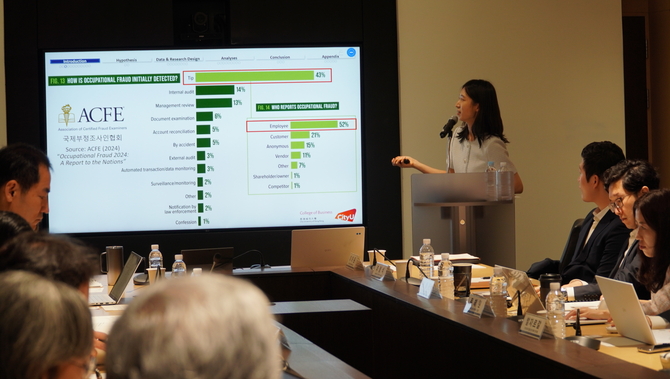
![[기고] 효율적 사업자를 징계하는 이상한 규제](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18/news-p.v1.20250418.2164cafb0ae2469495b31a9632a8ff5f_P3.jpg)
![[ICT광장] AI 시대 도래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발주방식의 전환](https://www.koit.co.kr/news/photo/202504/129766_82290_27.png)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8>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방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1961532233_e423df.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