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0억원 규모의 횡령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우리은행 전직 직원이 횡령 후 자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로 징역 4년을 더 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 우리은행 직원 A씨의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사문서 위조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돈을 빼돌리는 데 공모한 A씨의 친동생도 징역 3년, A씨의 아버지와 처제 및 증권사에 다니던 지인도 유죄가 확정됐다.
2012년부터 700억원 야금야금… 2022년에야 들통
A씨는 2004년부터 우리은행에서 일하면서 2011∼2022년 본점 기업개선부 근무를 하던 중 약 707억원 규모의 횡령을 저질렀다. 기업 워크아웃과 매각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계좌를 관리했고, 그러던 중 2010년경 진행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계약금에 2012년부터 손을 대기 시작해 동생과 아버지를 비롯해 지인들을 끌어들여 2020년까지 수차례에 나눠 빼돌린 뒤 숨겼다. A씨의 범행은 2019년 12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뒤 채권단이 계약금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2022년 뒤늦게 발각됐다.
검찰은 A씨와 동생을 횡령으로 기소한 뒤, A씨가 돈을 옮기는 과정에서 한 일을 사문서 위조‧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보고 추가기소했다. 증권사에 근무하던 지인이 돈을 굴리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유안타증권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발각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동생과 처제 등 가족 명의 계좌에 돈을 나눠 보관했다. 증권사 직원이던 지인을 통해 차명계좌를 만들고 관리를 맡겨 운용했으며, 사실상 경제공동체였던 동생과 함께 여러 경로로 돈을 빼돌렸다.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나눠 횡령하면서 A씨는 정당하게 신탁예치금을 옮기는 척하기 위해 허위 약정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고, 자신과 동생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돈을 보내기 위한 허위 공문을 작성했다. 금융위원회와 채권단이 ‘계약금 반환 시점은 2022년 4월 27일’로 확정짓자, 그때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만들기 위해 금융위에 위조문서를 첨부한 e메일을 보내기까지 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4년, A씨의 동생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아버지와 처제는 징역 1년 6개월형에 처해졌다. A씨의 자금을 굴리도록 도와준 증권사 지인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유안타증권도 벌금 6000만원을 물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제때 상고했으나 기각됐고, A씨와 A씨의 동생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다가 상고 제기 기간이 지난 올해 1월 7일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상고권이 소멸한 뒤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앞서 기소된 횡령 사건 재판을 먼저 받았고, 지난해 4월 지난해 징역 15년, 추징금 332억원이 확정되며 끝났다. A씨의 동생도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A씨는 발각된 뒤에도 횡령한 금액을 ‘다 썼다’고 주장하며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아, 우리은행이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서울중앙지법은 “A씨와 동생이 합쳐 우리은행에 656억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단독]김건희 빠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고발 사건, 서울남부지검이 맡는다](https://img.khan.co.kr/news/2025/04/28/news-p.v1.20250428.1badf6bbebba4fca979cacba4772c21c_P1.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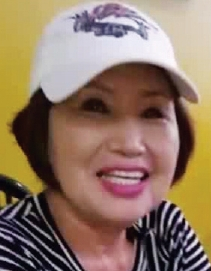

![[단독] 檢, 홈플러스 압수수색…MBK 인수 후 자금흐름 캔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8/a749d65d-0f61-4026-91cf-08e65632d51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