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가계약금 반환은 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인중개사의 권유 등 당사자의 선택으로 ‘가계약’이라는 명칭의 약정이 빈번하게 체결되고, 이때 ‘가계약금’이란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게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상태에서 대략적인 금액과 대략적인 입주일, 동호수만 정하고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는 식이다.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추적해보면,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일단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계좌에 ‘걸어놓고’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과,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먼저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것이다.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정하고 가계약금의 반환 요건, 방식에 대해서까지 정하는 경우도 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장문의 문자메시지에 양측이 ‘동의한다’는 답신을 하고 입금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당사자 사이에 오간 의사 교환 내역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관계가 정해지면 될 테고, 이는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늘 그렇듯 애매한 경우다. 「민법」 제565조(계약금) 이 계약금에 관하여 정하는 것과 다르게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계약금의 반환관계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가계약금은 왜 생겨났을까
법에 없고, 예전에는 실무에도 없었으므로 왜 이런 이단아가 생겨났는지 그 의미부터 파악하는 게 좋다. 가계약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본계약에 비하여 보다 사전적이고 임시적이다.
즉 가계약 체결 시에 본계약의 체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염두에 두면서도, 계약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정의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계약금 이전의 단계를 시장에서 자연히 형성하게 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계약금이 관행적으로 대금의 10%로 책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약금이 통상 대금의 0.5%라는 점은 가계약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구속력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완화될 수도 있겠다.
반대로 비록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금원이 수수됨으로써 단순한 정보수집용, 아이쇼핑용 대상자를 배제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전속 중개계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몰취되지 않는 성질의 금원은 권유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체결의사나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반환받을 수 있다면 가계약금 계약을 선호하게 될 수 있다.
우리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가계약금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그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게 된다고 판시한 예가 있어 참고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5.20. 선고 2021나67741 판결).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야 하나?
만약 가계약금을 계약금처럼 본다면, 이른바 해약금에 관한 민법의 법리가 적용되어서, 가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한 자는 배액을 상환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위에서 본 가계약금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왜냐하면, 가계약금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고, 가만히 앉아서 가계약금을 지급받은 매도인(임대인)의 지위를 그 정도까지 보호해줘야 하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다248312 판결)은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다.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교부자(매수인·임차인)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수령자(매도인·임대인)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가계약 체결이라는 일종의 교섭단계에서까지 계약금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게 되면, 앞서 본 가계약금이 갖는 특징과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결국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해석이 중요하겠다. 명시적인 약정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약금 지급의 경위, 지급의 동기와 의사,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가계약금 지급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김만배 누나 소유 연희동 자택도 압류…과거 윤석열 부친에게 매입](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1/thumb/30742-74846-sampleM.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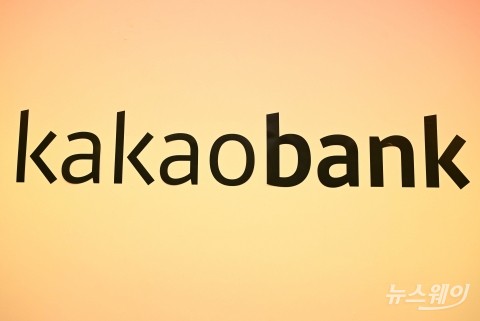
![[예규·판례] 대법 "'마유크림 투자' SK증권, 주의의무 위반…배상액은 재산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3383835069_f07f77.jpg)

![[류성현의 판례평석] 신탁계약상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 약정 위반, 횡령죄 성립 안 돼](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3488165345_c413b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