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세계적인 현상이 된 K컬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다. 30년 전 1995년에 나타난 다양한 문화적 현상을 짚어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사례는 문화 정책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일단 K컬처의 발돋움 뒤에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인터넷을 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콘텐츠 시스템이 등장한 것. 1995년 8월 24일 선보인 ‘윈도95’가 콘텐츠 혁명의 시작이었다. MS에서 ‘윈도95’는 텍스트 기반의 도스 명령어 체계를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 명령어를 몰라도 누구나 아이콘과 마우스를 통해 컴퓨터에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 장점은 소통과 연결의 용이성이었다. TCP/IP 프로토콜을 활용해 전화선으로 네트워크를 쓸 수 있게 됐다. 당시 윈도 운영체제를 내장한 IBM 호환 퍼스널컴퓨터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던 애플의 매킨토시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했기에 디지털 세계를 급속하게 장악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되면서 지식과 정보는 CD가 아니라 인터넷에 있다는 인식이 강화됐고, 검색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 즈음에 ‘디지털 노마디즘’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1997년 초고속 통신망이 구축되자 인터넷 통신은 급격하게 발전한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음악은 물론 영화와 드라마, 만화, 소설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보면서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었다. 1995년 PC통신 하이텔이 본격화된 후 소모임이 수없이 만들어졌다. 스포츠 분야가 가장 활발했는데, 1995년 12월 23일 PC통신 하이텔의 축구동호회에서 신생 수원을 응원하려 결성된 소모임 ‘윙즈’가 한국 최초의 서포터스 그랑블루의 시초다. 2002년 등장한 붉은 악마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는 젊은 세대의 광장문화와 팬덤 문화의 공고화로 이어졌다.
음악 분야에선 1995년 ‘SM엔터테인먼트’가 창립돼 본격적으로 아이돌 그룹을 준비한다. 그 결과물이 1996년에 선보인 남성 5인조 그룹 H.O.T.였다. 뒤이어 S.E.S., 신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등이 연달아 성공한다. 독특한 시스템의 탄생이 중요했다. SM은 음반제작사 중심의 시스템을 벗어나 기획 제작은 물론 연습생 발굴, 훈련, 결성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토털 매니지먼트(total management)’ 시스템을 탄생시켰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K팝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정체성이 되었다. 무엇보다 국내를 넘어 대만을 시작으로 한 클론의 한류 열풍 뒤에 2000년 H.O.T.가 아이돌 최초로 베이징에서 공연하면서 이돌 그룹의 한류 현상을 본격적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1995년에 아이돌 음악만 부각된 것은 아니다. 인디밴드의 등장도 이제 30주년이 됐다. 홍대 앞이 인디음악의 성지로 자리매김한 해가 1995년이다. 그해 홍대 클럽 ‘드럭’에서 커트 코베인(밴드 너바나의 보컬) 추모 1주기 행사가 그 시작점이다. 이때 크라잉넛, 노브레인, 언니네 이발관, 삐삐밴드 등 이제는 전설이 된 인디음악 뮤지션들이 세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인디 밴드는 K팝의 수원지 역할을 하며 끊임없이 영감을 주었다.
이제 미디어 콘텐츠 매체의 기여를 살펴보자. 방송영상 콘텐츠 영역에선 케이블 TV가 개국했다. 24개 채널을 통해 음악, 예능, 영화, 드라마 등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특히 극장이나 비디오 혹은 지상파 TV로만 제한적으로 보던 영화를 상시 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음악 전문 방송 M.net은 뮤직비디오를 전문으로 했다는 점에서 K팝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본격적인 유튜브 시대에 앞서 K팝 뮤직비디오의 수준을 격상하는 데 이바지했다. tvN 등은 처음에는 재방송 중심이었다가 점차 오리지널 콘텐츠를 늘려갔다. 지상파보다 느슨했기에 도발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많이 내놓게 되면서 한층 K 드라마의 수준을 규제가 끌어올리게 된다.
영화 산업을 보면 CJ ENM이 1995년 출범했다. CJ ENM은 ‘공동경비구역 JSA’(2000)를 필두로 히트작을 연이어 제작했고 훗날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하는 물적 토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방송가에선 드라마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육성하면서 지금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스튜디오 시스템의 초석을 놓게 된다.

영상 콘텐츠에만 그치지 않는다. 뮤지컬 ‘명성왕후’가 1995년 초연을 했다. 해외 원작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 대부분이던 공연계에서 ‘명성황후’는 우리 역사의 실제 인물에 바탕을 둔 창작 뮤지컬로 미국과 영국에 진출한 첫 사례가 되었다. 얼마 전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6개 부문을 수상한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창작의 자유 관점에서 보면 1995년 11월 18일 음반의 검열성 사전심의가 폐지됐다. 그해 서태지와 아이들의 4집 수록곡 ‘시대유감’이 공연윤리심의위원회의 방송 불가 판정을 받자 팬들이 사전심의제도 철폐 운동을 벌였다. 이미 1990년부터 가수 정태춘이 사전심의제도 철폐를 위해 투쟁을 벌여오던 차였다. 이듬해 영화 사전심의제도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93헌가13, 91헌바10)을 받기에 이른다. 사전심의제도가 사라지면서 영화 드라마를 자유롭게 창작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문화민주주의 토대가 구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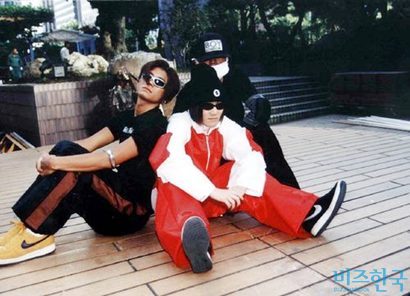
국가 정책에 의해 한류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한류 현상은 국가보다는 민주주의의 진척에 따라 창작자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인 팬들이 만들어낸 자연발생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고도성장에 이은 한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결실이기도 하다. 문화(文化)를 뜻하는 Culture(컬처)는 라틴어 Cultura(쿨트라)에서 기원했는데, ‘경작하다, 양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무엇인가를 길러내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곡식의 싹을 잡아당겨 빨리 자라도록 돕는(알묘조장, 揠苗助長) 것은 오히려 곡식을 망칠 수 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앞선 사례들이 이 같은 문화적 결과물의 본질을 말해준다. 30년은 한 세대다. 미래를 생각하고 또 다른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이제 K컬처가 다시 나서야 할 때다. 정부 정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필자 김헌식은 20대부터 문화 속에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길이 있다는 기대감으로 특히 대중 문화 현상의 숲을 거닐거나 헤쳐왔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활약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같은 믿음으로 한길을 가고 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writer@bizhankook.com
[핫클릭]
· [K컬처 리포트] 블랙핑크, 이제 '그래미'의 문을 열어라
· K팝 ESG 경영은 빛 좋은 개살구? 하이브 SM JYP YG 4대 기획사 모두 '악화'
· [K컬처 리포트]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한국서 만들어야 했는데!
· [K컬처 리포트] 돌아온 방탄소년단, 그들이 보여줄 새로운 스토리텔링
· [K컬처 리포트] 법원 결정 안 따른 뉴진스, '불리한 행보' 선택한 이유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JK 2025년 7월호 [퍼스널케어] 하이알루로닉애씨드를 증진한 맞춤형 스킨케어](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50729/art_17527285351353_42a0e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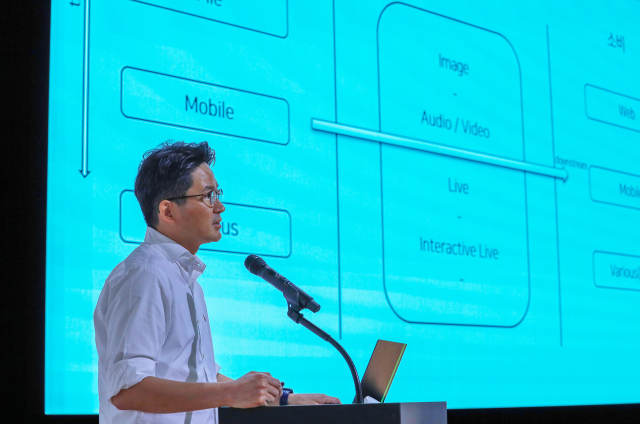

![[인더필드] 네이버가 제시한 미디어의 미래…“올해 하반기 XR 플랫폼에 선보일 것”](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7333816084_5d66c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