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가 2050년 탄소중립(Net Zero)을 목표로 삼은 가운데 제조업 중심의 한국과 중국은 산업 구조 전환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대응 전략은 크게 다르다.
한국은 GDP의 26.5%를 차지하는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반도체·이차전지·미래 차 등 고부가 산업 중심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한다.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과 정부 지원을 결합한 시장지향형 접근이 특징이다. 탄소중립기본법·K-ETS·세액공제·CBAM 대응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 자율 이행을 유도해 기술개발–표준화–상용화를 연계한 로드맵도 마련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대응력이 부족한 점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중국은 석탄·철강 등 고 탄소 산업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부 주도의 강제적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ETS 확대·제품탄소발자국(PCF) 표준화·녹색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로 탄소 감축을 관리한다. 중소기업의 인식과 참여율이 한국보다 높고 금융·인증·플랫폼을 통합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공급망 운영에서도 차이가 크다. 한국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펀드를 조성해 감축 목표를 함께 설계하는 상생형 모델을 지향한다. 반면 중국은 상위 기업이 하위 협력사에 감축 목표를 직접 하달하고 납품 조건에 탄소 인증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포함해 KPI와 제재를 연계한다.
미래 전략에서도 한국은 수소·바이오 소재·배터리 고도화 등 기술 기반 ‘질적 우위’와 국제표준화를 통한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노린다. 중국은 대량생산·저비용·재활용 기술·녹색금융을 활용해 단가 경쟁력 극대화를 추구하며 내수 플랫폼을 글로벌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결국 한국은 기술·자율·혁신 중심의 시장형 모델, 중국은 통제·계획경제형 모델로 탄소 중립 경쟁에 임하고 있다.
연구기관: 한국무역협회(KITA)
제목: 한중탄소중립 대응 전략 비교와 시사점
리포트 원문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ET톡]車 기술 리더만 살아남는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8/news-p.v1.20250908.1c7aa1700b6b4c5b835f0b7a87a621df_P1.jpg)
![[人사이트] 김세종 피브코리아 대표 “한국·유럽 AX협력 가교 역할 할 것”](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7/news-p.v1.20250907.b491700934a74658a1378da536c3901b_P3.jpg)
![[人사이트] 윤종일 KAIST 원자력공학과 교수 “AI·제조업 혁신의 근간은 전력...원전 믹스 없이는 불가능”](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9/news-p.v1.20250909.4d0c16fd87344a41b1f4145bf88f89de_P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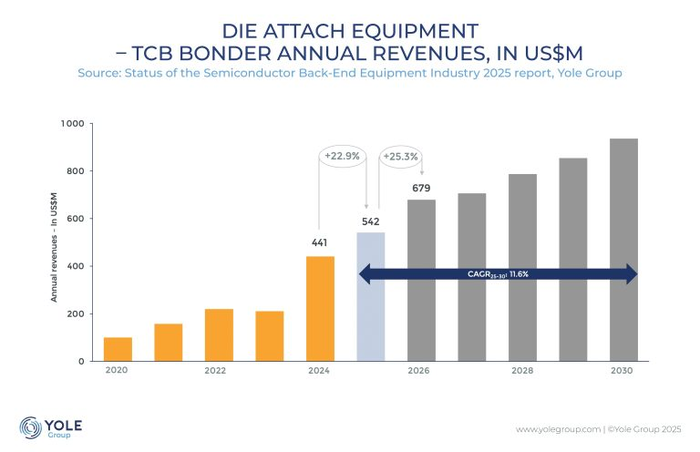
![[IAA 2025] 中 샤오펑 “유럽 다음 공략지 韓·日 낙점”](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8/news-p.v1.20250908.7bc9e62f42d045a3817ee7b1d17d5077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