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 연구팀, 가바 과잉 축적이 PTSD 증상과 관련 있음 밝혀

기초과학연구원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이창준 단장은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 류인균 석좌교수 연구팀과 함께 공포 기억이 지속되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병리기전을 규명하고, 뇌 속 비신경세포인 별세포가 만드는 억제성 신경전달물질 가바를 새로운 치료 표적으로 제시했다.
현재 PTSD 치료제는 대부분 세로토닌 수용체를 조절하는 항우울제가 사용되지만, 효과를 보이는 환자는 20~30%에 불과하고 치료 반응 속도도 매우 느리다. 이에 따라 새로운 치료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연구팀은 PTSD 환자, 외상 경험자, 일반인 380여 명을 대상으로 뇌영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PTSD 환자의 전두엽에 억제성 신경전달물질 가바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뇌혈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러한 변화는 PTSD 증상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증상이 회복된 환자는 가바 농도와 뇌혈류량이 정상화되었다.
이창준 단장은 앞선 연구에서 별세포가 마오비라는 효소를 통해 가바를 생성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번 연구는 전두엽의 기능 저하가 별세포에 의해 과도하게 축적된 가바에서 비롯됨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PTSD 환자의 전두엽 뇌조직을 분석한 결과, 별세포에서 마오비의 활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뇌조직 내 반응성 별세포가 확장된 것을 발견했다. 또한 가바 분해 효소 발현이 감소하면서 가바가 과잉 생성 및 축적되는 병리적 변화가 나타났다.
동물실험에서는 별세포의 마오비 활성을 증가시킨 PTSD 동물모델에서 공포 반응이 장기간 지속되고, 공포 기억을 감소시키는 뇌의 회복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다. 반대로, 마오비 활성을 억제해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자 이러한 반응이 완화되었으며, 이 결과는 별세포의 마오비 과활성에 따른 가바 축적이 PTSD에서 공포 기억이 지속되는 원인임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마오비 효소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신약 후보 물질 KDS2010을 PTSD 동물모델에 투여한 결과, 별세포의 가바 농도와 뇌혈류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공포 반응을 조절하는 뇌 기능이 회복되어 불안 행동 증상이 완화됐다. 이 신약 후보물질은 이창준 단장의 기초연구로부터 개발된 약물로, 현재 임상 2상 시험 중이다.
이창준 단장은 "PTSD의 분자·세포 수준의 병리기전을 규명하고, 별세포라는 새로운 치료 표적을 제시해 PTSD의 근본적 치료 가능성을 열었다"며, "별세포 조절을 통한 새로운 정신질환 치료 전략 개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인균 석좌교수는 "이번 연구는 임상에서 포착한 단서에서 출발해 동물모델에서 기전을 확인하고, 신약의 효과 검증까지 확장한 역중개연구의 대표 사례"라며, "임상과 기초연구를 통합하는 접근으로 정신질환 치료 연구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포트폴리오의 생화학·분자생물학 분야 최고 권위지인 신호 전달 및 표적 치료에 7월 28일 온라인 게재되었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장기간 스테로이드 투여 후 발생한 고관절 무혈성괴사의 상해 인정 여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9/shp_175255818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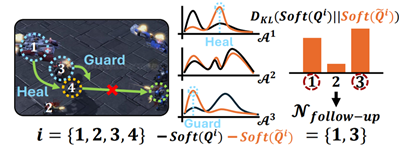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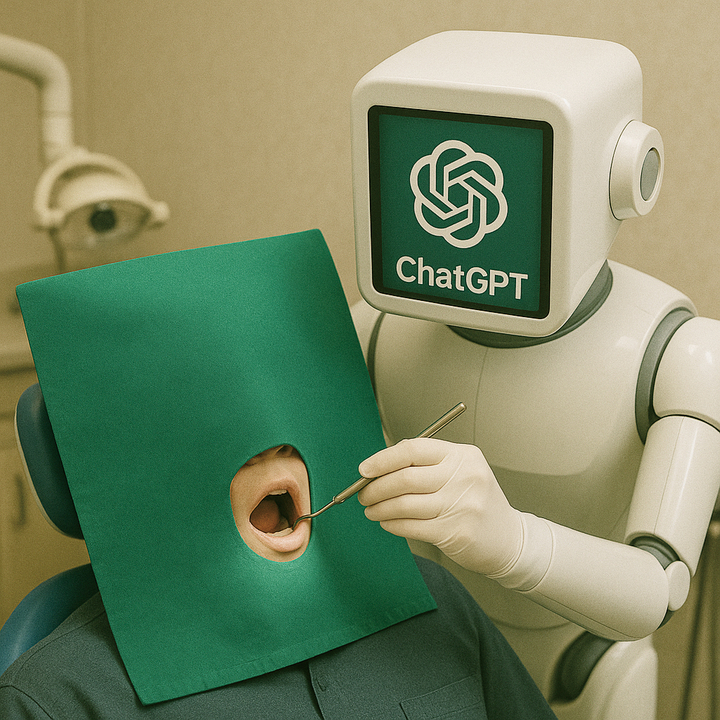
![뇌와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7/30/2GVJUQ1PBN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