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쓰며, 3명 중 1명 이상은 일상에 지장을 느낄 정도라고 답했다. 20대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34%로 조사됐다. 디지털 스크린 중독은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특히, 숏폼이나 배속 시청 등 최근 확산하는 빠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시청습관은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배속 초과, 전 연령 인지 능력 저하
영상 콘텐츠를 2배속 이상으로 빠르게 시청하는 습관이 뇌의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캐나다 워털루대 티판 타루말링감 교수, 미국 시카고대 브래디 로버츠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영상 재생 속도와 인지 기능 상관관계’를 다룬 전 세계 실험 논문 24편을 종합 분석해 발표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의 영상 시청 속도를 일반 속도, 1.25배속, 1.5배속, 2배속, 2.5배속 등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2배속을 초과할 경우 인지 능력이 전 연령에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배속까지는 정보 이해나 기억력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고령층(61~94세)은 1.5배속만으로도 기억력 손실과 이해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18~36세 연령대는 2배속 시청에서도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었지만, 연구진은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지적했다. 빠른 속도로 보면서 내용의 이해도가 떨어지며 뇌의 피로도 정보 과부하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영상 콘텐츠의 배속 시청은 이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보편화됐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Gen Z 콘텐츠 이용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 응답자 중 ‘1.5배속 이상 시청’ 비율은 27%, ‘2배속 시청’ 응답도 24%에 달해 전 세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쇼츠’ 같은 1분 남짓 짧은 영상으로 이루어진 숏폼 컨텐츠의 경우에도 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대웅제약의 소통 채널 ‘대웅제약 뉴스룸’에 따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마트폰 보는 것을 반복하면 우리 눈도 피로하지만 뇌도 과도한 자극을 받아 점점 지칠 수 있다. 숏폼은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의 이목을 끌어야하기에 자극적인 내용이 담긴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시청하게 되면, 보다 더 강렬한 자극을 찾게 되는 ‘팝콘브레인(Popcorn brain)’ 현상에 빠져들 수 있다.
‘팝콘브레인’은 미국 워싱턴대학교 정보대학원 데이빗 레비(David Levy) 교수가 만든 용어다. 시각 또는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되면 뇌의 전두엽이 반응하는데, 반복에 노출될 수록 내성이 생겨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팝콘 터지듯 큰 자극만을 추구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2011년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실린 연구결과에 따르면, 매일 인터넷을 10시간 사용하는 사람과 2시간 사용하는 사람은 뇌의 구조에 차이를 보였다. 하루 10시간 사용한 사람의 사고 인지를 담당하는 전전두엽 크기가 두 시간 사용한 사람에 비해 줄었다고 한다. 디지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의 휴식을 방해해 만성 피로도 유발한다. 수면 장애, 시력 저하, 목 어깨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과도한 사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사용으로 지친 우리의 뇌를 잠시라도 쉬게 하기 위해선 잠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 뇌가 쉬기 위해서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의 몸은 수면을 통해 회복하는 만큼 수면의 질이 중요해서다.
특히, 첫 잠에서 가장 깊고 파장이 느린 서파(Slow wave)가 나타나면서 뇌가 휴식하기 때문에, 잠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운동을 하면 근육과 연결된 뇌신경이 자극받아 혈류량이 증가하고 평소보다 약 30% 많은 혈액이 산소와 함께 뇌 속으로 유입돼 뇌세포가 활성화된다.
숏폼 콘텐츠, 강한 중독성
숏폼 콘텐츠는 또한 스마트폰 중독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도 우려된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의 최근 논문에 따르면 숏폼 콘텐츠는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함으로써 스마트폰이 생활 패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를 조절할 능력이 감소해 우울, 수면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바른ICT연구소 이건우 교수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된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 숏폼의 도입은 20대의 주당 OTT 이용 빈도를 약 1.7회만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특징은 특히,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하는 집단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34%로 성인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바 있다.
논문은 20대에서 특히 문제가 두드러지는 이유를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조되는 시기적 특성상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건우 교수는 일정 시간 시청 시 휴식을 권장하는 알림 기능을 도입하는 등 플랫폼 운영자의 사회적 책임과 20대 스스로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자기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휴대폰 등 디지털 스크린에 중독된 아동이 스크린 이용 시간이 많지 않아도 자살 충동 또는 자해 가능성이 2~3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미 의학협회 저널(JAMA)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절반 가까이가 높은 중독 수준의 휴대폰 중독 증상을 보인다. 중독적 행동은 충동을 제어하는 전전두엽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 시절에 더 쉽게 발현한다.
4,28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10살 즈음부터 휴대폰 등 스크린 중독 증상을 추적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4살이 됐을 때 자살 충동 등 정신 건강 상 평가에서, 참가자의 5.1%가 자살 시도 또는 시도 준비와 같은 자살 행동을 보였고, 17.9%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이번 연구의 제1저자인 샤오 윤위 미 웨일 코넬 의대 정신의학 및 인구보건학과 조교수는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중독이 치유되지 않으며 인지행동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독됐다는 경고 신호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단순히 휴대폰을 빼앗는 방법으로는 갈등을 유발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흑인 및 히스패닉 청소년들, 연 소득이 7만5천 달러(약 1억 원) 미만인 가정, 부모가 혼인하지 않았거나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이 소셜 미디어, 비디오게임, 휴대폰에 대한 중독적 사용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 아동 중 절반 가까이가 11세부터 높은 중독적 휴대폰 사용을 보였고, 25%는 초기에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샤오 박사는 급격히 중독 수준이 높아진 아동들의 경우 “자살 행동 위험이 2배 수준에 달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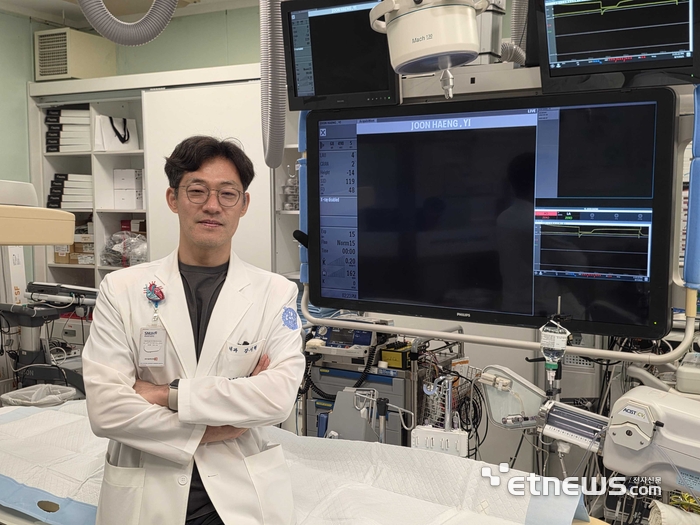


![[건강상식] ‘살 빠지는 주사’의 진실, 위고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이유](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3/art_17548897685851_9acff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