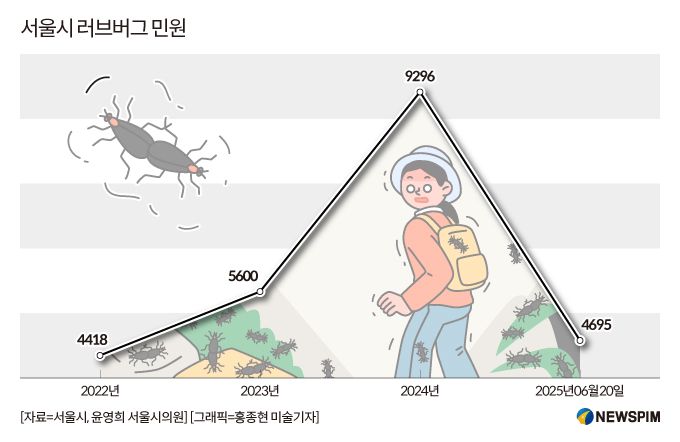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상가 인근에서 화재가 난 지 한 달이 넘었다. 하지만 이 곳이 삶의 터전인 상인들은 여전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5월28일 점포 74곳 중 48곳이 불에 전부 타버렸지만 보상은 물론 복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1일 찾은 화재 현장은 그야말로 ‘도심 속 폐허’였다. 화마가 휩쓸고 간 곳에는 건물 잔해와 집기, 자재들이 불에 탄 이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화재가 난 지 34일이 흘렀지만 청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였다. 당시 재산 피해는 약 9억7500만원 수준이었다. 피해 상인들을 더 괴롭히는 것은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상인들은 중구청이 제공한 냉방시설이 없는 컨테이너 한 칸에 모여 있다.
현장은 현재 고립된 상태다. 높은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외부 접근이 불가능하다. 피해대책위원장 권영길씨(63)는 “(펜스로) 길이 막혀 간간이 있던 소매 고객들도 아예 끊겼다”고 말했다. 일부 점포는 집주인으로부터 원상복구 요구나 월세 독촉을 받고 있다. 상인 김모씨(58)는 “두 달째 10원도 못 벌고 있는데도 집주인은 월세를 달라고 한다”며 “직원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화재 감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피해 면적이 넓어 화재 감식에 시간이 걸린다”며 “언제 끝날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감식이 끝나야만 전기 복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상인들은 영업 재개는커녕 내부 출입도 못 하고 있는 처지다.
장기 지연된 재개발 사업도 피해 복구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지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판 롯폰기힐스’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세운상가재개발 지구다. 2010년부터 진행된 사업은 지지부진한 채 결론이 나지 않아 상인들이 이주조차 할 수 없었다. 피해 상인들은 “시행사와 행정기관이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사는 “내년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금을 조달해야 상인들에게 보상이 가능하다”며 당장 재개발 보상비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중구청은 보상비와 이주 비용 등은 시행사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중구청에는 사회재난조례나 사회재난보험 적용을, 시행사에는 임시 사무공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청은 “인명피해가 없어 재난대책위를 꾸리지 않았고, 따라서 재난 관련 예산도 없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오히려 매달 관리비와 ‘제소 전 화해 신청 비용’ 명목으로 점포당 60만원가량을 상인들에게 청구했다. 김씨는 “우리의 부주의로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쫓겨나는 사람한테 그 비용도 내라는 꼴”이라고 말했다. 중개무역업을 하는 한강산씨(44)는 “시행사는 기업이니 돈 얘기만 한다 치지만, 중구청은 세금 꼬박꼬박 낸 주민들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건데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화재 트라우마’도 호소한다. 25년 간 운영한 사업장이 전소된 최씨는 “잠이 안 오는 건 기본이고, 멍하니 있을 때 불 난 게 생각나 괴롭다”고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약 봉지를 꺼내 보이며 “이틀에 한 번 우황청심환, 매일 금왕심단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화재 3주 뒤 차량을 주차장 벽에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지만 당시 기억이 없다. 화재 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겪은 상인은 최씨를 포함해 3명이다. 30년째 전기조명 부품 가게를 운영해 온 김경희씨(61)도 “연기를 마신 뒤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 떨린다”고 말했다. 김씨의 남편은 화재 이후 뇌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