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일은 일본 헌법기념일이다.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평화헌법이 시행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는 남다른 헌법기념일을 맞이하고 있다. ‘전후 80년’, 정확히 말하면 ‘패전 80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0년 주기로 담화를 발표해왔다. 패전 50년을 맞은 1995년에는 현직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무라야마 총리가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는 내용을 담은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패전 60년에는 고이즈미 담화가 발표됐고, 패전 70년이 되는 해에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패전 80년을 맞이한 올해, 이시바 총리는 담화를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더 이상 사과하지 않겠다는 아베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사과받아야 할 역사가 남아 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가 그중 하나이다.
지난달 11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석 할아버지의 유족인 이창환씨를 도쿄에서 만났다. 그는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제철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끝까지 사죄를 받아낼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렇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이춘식 할아버지는 끝내 사죄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이창환씨는 사죄를 받기 위해 일본제철 본사를 방문해 면담을 요청했는데, 결과는 문전박대. 일본제철 측은 강제동원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일본 정부의 견해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전범기업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 정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에도 원인이 있다. 제3자 변제 해법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의 한·일관계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무너진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정책이 한·일 간 역사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으로 일본 사회가 이러한 착각에서 깨어나고 있다. 여기저기서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를 겨우 정상으로 돌려놓았는데 파면되어 아쉽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제3자 변제를 중지하는 등 반일 정책을 펴는 정권이 탄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까지 한다. 물론 무조건적인 반일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는 것을 반일로 치부해버린다면 더 이상 한·일 간 진정한 대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8%가 “일본이 식민지배에 따른 사과와 배상을 충분히 해왔다”고 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에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사과받아야 할 역사가 남아 있다. 조세이 탄광에는 아직도 조선인 노동자 136명의 유골이 수몰돼 있다. 이미 해결됐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이 진정으로 해결됐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패전 80년’이 되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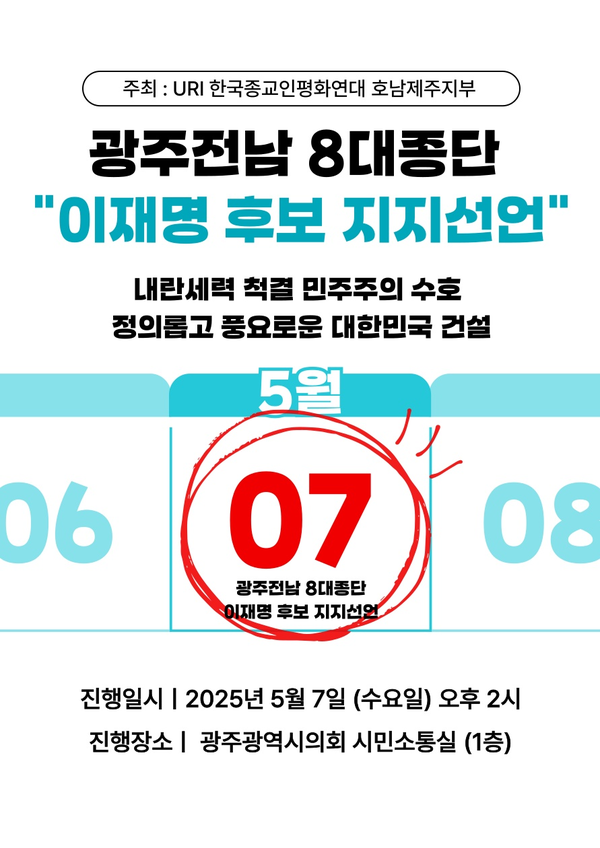
![‘뿌리의집’ 김도현·피터 뮐러 대표 “해외입양 인권침해 속죄의 첫 걸음은 투명한 정보 공개” [세상을 보는 창]](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6/2025050651101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