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집트는 동지중해의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다. 그런 이집트가 지난해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지난달 수입량은 약 100만t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다. 2년 전만 해도 연간 340만t의 LNG를 수출하던 나라에서다.
이집트가 LNG 수입국으로 전락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이집트 정부는 외화를 벌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으로의 수출량을 크게 늘렸다. 또 다른 요인은 중동 최대인 인구. 가자 전쟁으로 난민까지 대량으로 받아들인 탓에 국내 가스 수요도 급증했다. 이로 인한 과도한 채굴로, 결국 가스 생산량은 최근 3년 새 30% 가까이 줄었다. ‘두 개의 전쟁’이 이집트의 에너지안보를 뒤흔든 셈이다.

#2 태국은 신규 LNG 터미널을 연내 착공한다. 동남아시아 최대 LNG 수입국인 태국의 세 번째 LNG 기지다.
태국의 LNG 수입 확대는 주변국 리스크에 기인한다. 그간 태국은 국내 소비량의 10% 정도를 이웃인 미얀마의 파이프라인가스(PNG)에 의존했다. 그런데 군부 독재 장기화로 서방 에너지 업체들이 철수하면서 미얀마의 가스 생산량은 급속히 줄고 있다. 최근 격렬해진 캄보디아와의 분쟁도 골치를 썩인다. 국경에 위치한 대형 가스전 공동개발 협상이 완전히 멈췄기 때문이다.
#3 세계 최대 LNG 수출국에 오른 미국의 기세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중국·일본·한국 등 큰손들이 몰린 동북아시아가 주력 수출지다. 하지만 지정학적 변인이 늘면서 이집트·태국 같은 국가도 미국산 LNG로 눈을 돌리고 있다.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한 유럽의 미국산 LNG 수입 물량도 폭증 일로다. 유럽연합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도 통 큰 구매를 약속했다.
문제는 미국의 수출 능력이다. 이미 수출 물량 대부분은 장기구매 계약에 묶여 있다. 대형 신규 개발 프로젝트도 당장은 없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으로 수입 물량을 확보하려면 개발사업에 대한 직접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한국의 대미 관세 협상 발표에선 ‘LNG 1000억 달러(약 139조원) 구매’만 거론됐다. 트럼프 1기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LNG를 대량 구매했던 문재인 정부의 선택과 닮았다. 당시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에 적극 투자했다.
한국의 석유·천연가스 자원개발률은 11%(2023년)에 머물러 있다. 일본은 37.2%다. 에너지안보는 그저 얻는 게 아니다.

![[속보]트럼프, 인도에 25% 추가 관세 서명…총 50%](https://newsimg.sedaily.com/2025/08/06/2GWISRG64H_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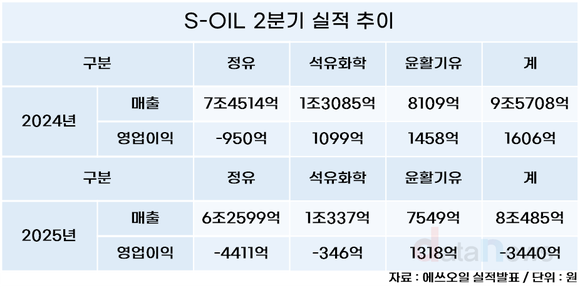
![글로벌 광물 전쟁 최전선 된 개도국…美·EU 등 中희토류 패권에 '격돌'[글로벌 인사이트]](https://newsimg.sedaily.com/2025/08/06/2GWIQ8LDR6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