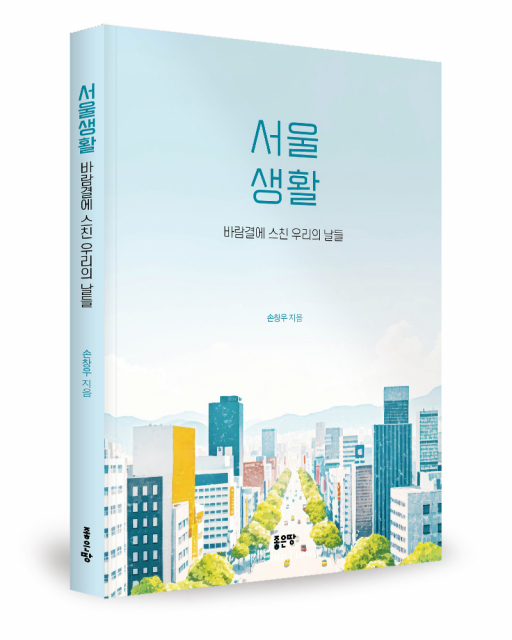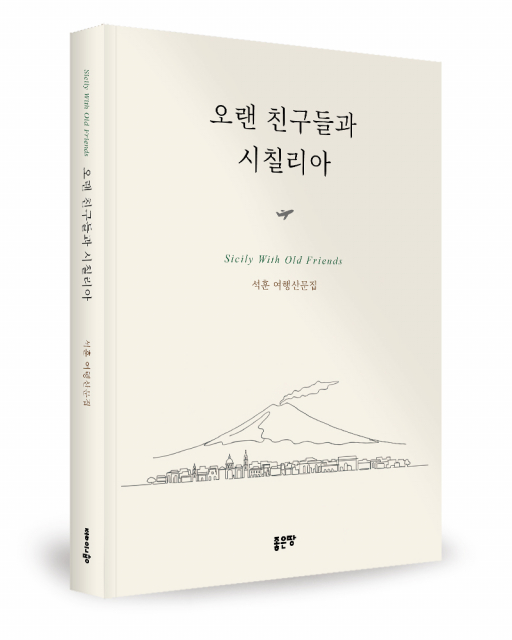“책가도(冊架圖)는 제가 읽어낸 두바이와 한국을 잇는 실크로드예요. 그림 앞에서 나를 다시 찾아가게 하는 길 위에서 세계와 마주하고 싶어요.”
여기, 문화의 교차로에서 ‘오래된 미래’를 외치는 민화 작가가 있다. 전통 구술과 석채(돌가루 안료)의 결을 고스란히 계승하면서도 오늘의 정서와 타문화의 사물을 화면 안에서 교감시키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김은희 작가다. 주로 ‘책가도’를 통해 자신의 예술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그가 머무는 서가는 더 이상 조선 후기 선비의 방에 고정된 책장이 아니다. 그것은 싱가포르·두바이, 그리고 한국의 방까지 이어진 ‘감정의 책장’으로 자리한다.
4일 만난 김 작가는 “민화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다”고 밝혔다.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교민들과 나란히 앉아 붓을 들며 그림을 시작했고, 이후 싱가포르와 한국의 온·오프라인 오가며 본격적으로 전통민화를 수련했다.

민화는 타국살이의 외로움을 견디게 한 동력이었다.
“한국인으로서 낯선 도시의 속도에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이 와요. 교민 사회에서 민화를 접하는 날부터 제 마음의 외로움에도 색(色)이 생기기 시작했죠.”
조용히 웃으며 말을 잇는 김 작가. 여러 민화의 상징물에 각각 ‘지켜야 할 금기’와 ‘익혀야 할 해석’이 있는데, 유독 ‘책가도’였던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책가도는 제 자신과 그림을 마주하는 이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쉼의 언어였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끌어올리지 않아도, 서가 앞에 설 때 멈추는 호흡의 온도가 있죠.”
두바이로 삶의 기반을 옮긴 뒤부터 본격적으로 두 도시를 동시에 품은 책가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신라 금관이나 고려 도자와 닮은 중동의 기물, 전통 매듭 문양과 유사한 페르시아 매듭의 형상, 그리고 Ain Dubai 관람차도 등장한다.

“싱가포르와 두바이는 늘 미래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예요. 전통예술이 때로는 과거의 언어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봐요. 전통은 고정된 유산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읽어내는 시선과 해석의 틀이 될 수 있어요. 민화의 상징과 형식 역시 지금의 속도를 성찰하고, 앞으로의 감각을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해외에서 꾸준히 예술적 발자취를 넓혀온 그가 오랜만에 한국에 입국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조선 후기 책가도의 물성을 다시 확인하고, 경주에서 금관을 직접 보며 신라의 상징 문맥을 다시 수혈하는 등 바쁘게 움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두바이 현지의 응원과 관심에 머물지 않고, 최근에는 고향 전주에서 열린 제30회 전주전통공예전국대전에 작품을 출품해 특별상도 수상했다.
김 작가는 “아직 제 그림을 직접 본 적이 없는 부모님을 위해 전주에서 치러지는 공모전에 작품을 냈는데 상까지 받게돼 큰 기쁨이다”면서 “제 작은 날갯짓이지만 국경을 건너 민화로 문화가 흐르는 통로가 되길 바라고, 그 시작점이 전주라면 더없이 뜻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한국과 두바이를 오가며 전통민화의 상징과 서사를 동시대 감각으로 다시 풀어내고, 문화 간 교감을 확장해 나갈 그의 발걸음이 기대된다.
김미진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