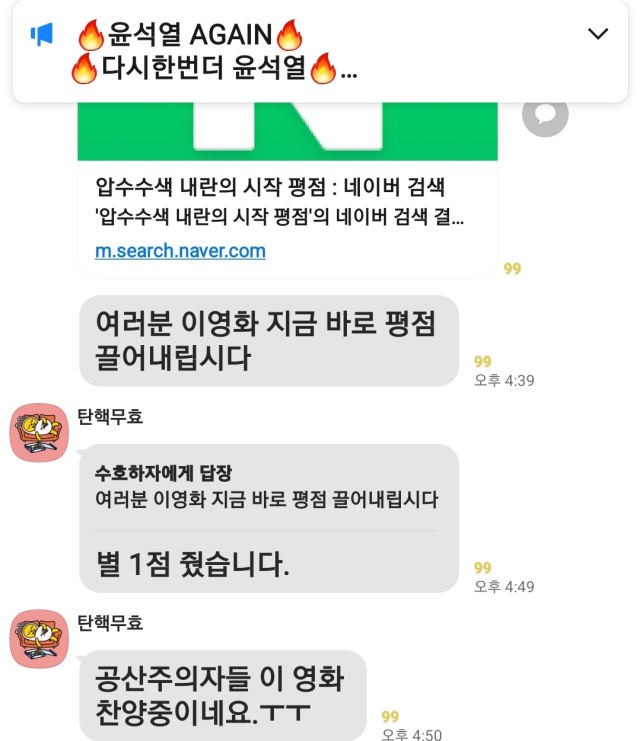3일 전북 전주시 메가박스 전주객사점. 다큐멘터리 영화 <마지막 공화당원>(The Last Republican·2024) 상영이 끝나고 극장에 불이 켜지자, 한 관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진짜 똑같다.”
지난달 30일 개막한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특별 섹션 ‘다시, 민주주의로’를 마련했다.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과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해외 여러 국가의 다큐멘터리 6편을 선정했다. 그 중 한 편인 스티브 핑크 감독의 <마지막 공화당원>은 2021년 1월6일 ‘마가’(MAGA)라고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던 직후로 관객을 데려간다.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데칼코마니처럼 연상된다.
<마지막 공화당원>은 애덤 킨징거 당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일리노이·47)을 주인공으로 한다. 그는 아이 때부터 공화당 출신 주지사를 응원한 골수 공화당원이다. 공군 조종사 출신으로, 2011년부터 일리노이주 하원의원을 역임하며 한때 주지사 선거에 나갈 후보로 꼽힐 만큼 유망한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1·6 국회의사당 난입사태’ 이후 킨징거의 ‘공화당원’으로서의 정치 인생은 위기에 처한다. 그는 습격이 있던 다음날, 공화당 하원 의원 중 최초로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어 하원이 표결에 부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공화당 하원 의원 197명 중 이런 선택을 한 것은 킨징거를 포함한 단 10명뿐이었다.
킨징거는 왜 그 길을 갔을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결과에 불복 중이었다.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저지하는 게 폭도들의 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들을 “승리를 빼앗긴 애국자”라고 두둔했다가 트위터 계정을 12시간 정지당했다. 킨징거는 영화에서 “정치적 견해의 문제를 넘어 (대통령이) 넘어서는 안 될 마지노선을 넘었기에, 등을 돌려야 했다”고 말한다.
킨징거가 하원 ‘1·6 조사 특별위원회(1·6 특위)’에 리즈 체니 의원과 함께 둘 뿐인 공화당 의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배신자’ 낙인은 공고해진다. 공화당에선 징계 요구가 거셌다. <마지막 공화당원>은 킨징거가 결국 2022년 중간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남은 14개월의 하원의원 임기를 보내는 과정을 담는다.
스티브 핑크 감독이 킨징거에게 던지는 ‘좌파적’ 질문들은 감독이 킨징거를 영웅시할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다. 핑크 감독은 “공화당이 당신한테 이럴 줄 몰랐냐. 그 공화당인데?”라고 꼬집는다. 킨징거는 감독과 다른 정치적 성향을 인지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 앞에 생각을 솔직히 드러낸다. 그는 핑크 감독의 전작 <핫 텁 타임머신>(2010)을 명작이라고 생각하기에 촬영 제안에 응했다고 한다.
■ 미국의 2021년, 한국과 미국의 2025년
오래 애착을 가졌던 당에서 내쳐졌다. 1·6 특위 활동으로 자신을 좋아하게 된 사람들은 온전히 믿을 수 없다.“결국 공화당이 똑같지”라며 언제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영화 상영이 끝나고 관객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영특한 대화’ 세션에는 킨징거와 비슷한 딜레마를 겪고 있을 법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게스트로 초대됐다. 하지만 김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으로 불참하게 되며 정치철학자인 김만권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가 대신 자리했다. 김 의원은 서면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개인과 조직, 계파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적 갈등으로 낙후되고 있다”며 “보수 정치인이라면 진영이 아니라 보수 가치 추구에 전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관객들은 2021년 미국의 모습을 2025년 한국에 빗대어 봤다. 12·3 비상계엄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달려갔다는 윤명석씨(31)는 “금방 탄핵이 되리라 생각하다가, 그 이후 벌어졌던 정치적 과정에서 환멸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영화 후반 킨징거가 “냉소주의자가 되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위로가 됐다”고 했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에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경각심을 느끼게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 직후 1·6 국회의사당 난입사태에 가담한 지지자 1500여 명을 사면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등 자신의 정적으로 꼽히는 인사들의 정부 기밀 접근권을 박탈했는데, 1·6 특위에서 활동한 킨징거와 체니 전 의원 모두 그 대상이 됐다.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인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 시민들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지” 묻는 질문에 김 교수가 내놓은 답변이 참고할 만하다. 그는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렛이 쓴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인용하며 말했다.
“첫째로는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사람과의 단절, 둘째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폭력을 정치의 수단으로 용인하는 사람과의 단절, 셋째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극단주의자들과 손잡는 사람과의 단절이 이뤄져야 합니다. 무너져 내리는 민주주의에 관해 책에서 내놓는 가장 기본적인 처방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스텝을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