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우리가 음식을 말할 때 흔히 “맛있다”, “고소하다”, “부드럽다”와 같은 표현을 쓴다. 그러나 그것이 농산물을 재료로 한 음식일 때는 단순한 미각 묘사를 넘어, 땅의 기억과 계절의 숨결까지 담아내는 표현이 된다. 맛의 언어란 혀의 감각만이 아니라, 농업의 풍경과 인간의 삶이 만나는 지점에서 태어나는 문화적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맛 표현에는 “달다”, “맵다”, “시다”, “쓰다”, “짜다”라는 기본적인 오미(五味)가 있다. 하지만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음식에서는 여기에 “싱그럽다”, “포슬포슬하다”, “따뜻한 맛이 있다”, “흙 냄새가 난다”와 같은 자연의 질감을 전하는 말이 더해진다.
이런 표현은 과학적 분류가 아니라 감성과 생활의 기억으로 짜인 언어다. 예를 들어, 갓 수확한 햅쌀의 “은은한 단맛”에는 가을 들녘의 냄새와 수확의 기쁨이 함께 녹아 있고, 갓 캐낸 감자를 “포슬포슬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손의 온기와 흙의 따스함이 함께 전해진다.
농산물의 맛을 표현하는 말에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자주 등장한다. “아삭아삭”, “포슬포슬”, “쫀득쫀득”, “바삭바삭”, “사르르” 같은 말은 단지 맛뿐 아니라 식감과 조리 과정의 기억까지 불러낸다. 이 표현들은 음식이 입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준다. 예를 들어, 한겨울에 자란 무를 베어 물 때의 “아삭”한 소리 속에는 찬바람을 이겨낸 생명의 힘이 느껴진다. 맛의 언어는 농산물의 생육 환경과 인간의 신체 감각을 연결하는 매개이기도 하다.
이러한 맛의 표현 속에는 ‘시간’이 들어 있다. “봄의 쌉쌀함”, “여름의 단맛”, “가을의 고소함”, “겨울의 감칠맛” 같은 계절어는 단순한 맛의 분류가 아니라 농업의 순환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봄나물의 “쓴맛”은 겨울을 이겨낸 생명의 재생을 상징하고, “가을의 맛”이라 불리는 고구마나 밤의 달콤함은 수확의 풍요와 함께 찾아온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맛을 “제철의 맛”이라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또한, 농산물의 맛 언어는 지역마다 다른 방언과 표현 속에도 살아 있다. 경상도와 전남 동부권에서는 “고소하다”를 “고시다”라 하고, 전라도에서는 “감칠맛이 있다”를 “진하다”라 표현한다. 같은 단맛이라도 북쪽의 “서늘한 공기 속 감자의 단맛”과 남쪽의 “햇살 머금은 감귤의 단맛”은 전혀 다른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맛의 언어는 결국 그 지역의 풍토와 감정의 기록인 셈이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이런 ‘맛의 언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가공식품과 세계화된 식문화가 확산되면서 “어디서나 같은 맛”, “표준화된 맛”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맛이란 본래 토양, 기후, 물, 사람의 손이 만들어내는 ‘차이의 문화’다. 균질화된 맛은 편리하지만, 그 안에는 지역의 이야기와 자연의 시간이 담기지 않는다. 맛을 말로 표현하는 힘을 잃는다는 것은 곧 문화의 다양성을 잃는 일과 같다.
농산물을 재료로 한 음식의 표현에는 생산자의 얼굴과 재배의 시간이 비친다. “태양의 맛”, “밭의 향기”, “어머니 손맛” 같은 비유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먹는 사람과 기르는 사람을 이어주는 언어다. 최근에는 식당 메뉴나 농산물 포장지에도 “들바람의 맛”, “산의 향”, “논의 선물” 같은 말이 자주 쓰인다. 이는 소비자들이 단순한 맛보다 ‘재료의 이야기’를 함께 맛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맛의 언어를 풍요롭게 하는 일은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일과도 맞닿아 있다. 프랑스의 ‘테루아르(Terroir)’ 개념은 토양과 기후, 사람의 기술이 빚어내는 맛을 언어로 보호하는 문화이다. 우리에게도 “고향의 맛”, “시골의 맛” 같은 유사한 표현이 있다.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직접 키우고, 맛보고, 그 경험을 말로 표현하는 식교육이 중요하다.
세계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맛의 언어’는 단순한 감각 표현을 넘어, 문화의 자의식을 드러내는 방식이 된다. 농산물을 재료로 한 음식을 맛본다는 행위는 자연과 공존하고, 지역의 기억을 되살리는 행위다. 미각은 다섯 감각 중에서도 기억과 가장 밀접한 감각이며,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때 우리는 ‘대지를 먹는’ 체험을 문화로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전남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잊혀진 ‘맛의 언어’를 되찾고, 전남의 농산물을 만들어낸 전남의 자연과 농부의 손길을 살려 농산물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맛의 표현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 언어를 잃으면 맛의 깊이도 사라진다. 농산물의 맛을 말한다는 것은 곧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이야기하는 일이다. 우리가 “맛있다”라고 말할 때, 그 한마디 속에는 바람과 흙, 햇빛,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함께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문헌
권우진. 2020. 맛에 대한 언어 표현 연구. 한국언어문화 72:5-38.
백두현. 2017. 전통 음식조리서에 나타난 한국어 음식맛 표현의 연구. 국어사 연구 24:183-230.
허북구. 2024. 전남 전통 음식 맛의 표현 언어. 전남인터넷신문 허북구 농업칼럼(2024.04.05.).
허북구. 2025. 전라도 음식, 사라져 가는 차별성과 정체성. 전남인터넷신문 허북구 농업칼럼(2025.10.02.).


![[식품오늘] 하림 ‘수능 대박’ 기원하는 닭고기 제품 추천](https://www.foodnews.news/data/photos/20251146/art_1762747791185_229aab.jpg?iqs=0.0599229638879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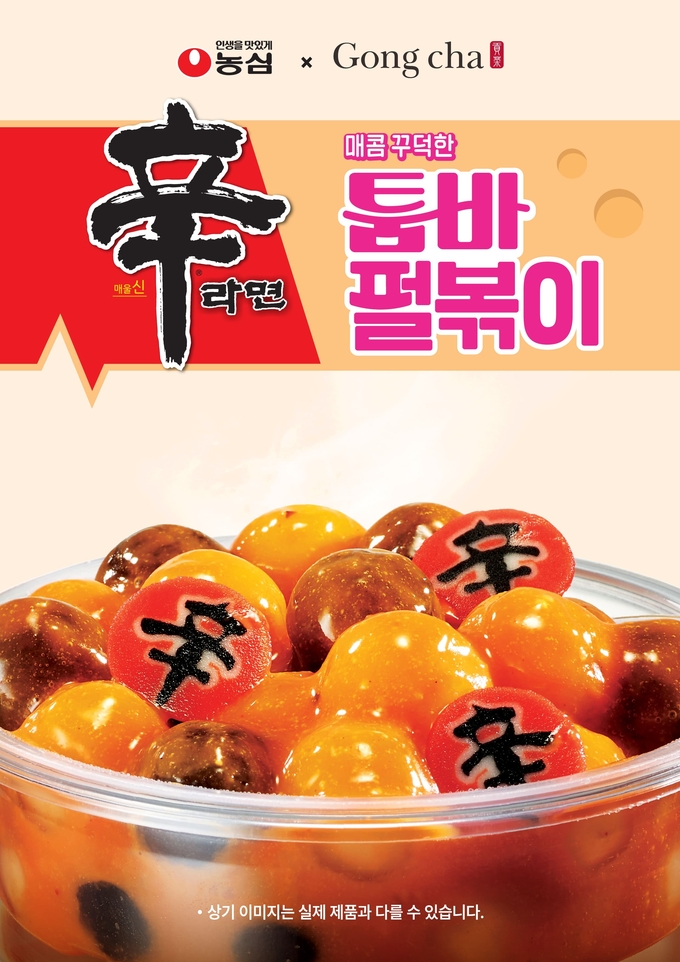

![[단독] 배추재배단지 무름병 확산 ... 수확기 앞둔 농가들 울상](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11/776999632eb4daaa72bce3af1538ce9d865838e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