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물은 멈추지 않는다
첫 쇳물, 첫 사고… 공장 ‘혈관’ 다 태웠다

부실한 파일공사 때문에 한바탕 소동을 빚었던 제강공장은 볼트 문제로 또 한번 야단이 났다. 1972년 여름,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높이 90m의 제강공장 지붕으로 올라갔다. 육중한 철 구조물 연결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먹만 한 대형 볼트를 확실하게 조여주는 것이다. 대형 볼트의 조임 상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대로 조여진 것은 볼트 머리가 말끔히 떨어져 나가 있고, 허술하게 처리된 것은 머리 부분이 지저분하게 남아 있다. 그런데 지저분한 흔적들이 눈에 띄었다.
곧바로 비상소집령을 내렸다. “즉시 모든 볼트를 하나하나 확인하라! 잘못 조인 볼트는 흰 분필로 표시하라!”
24만 개에 이르는 모든 볼트에 대한 점검이 시작됐다. 흰 분필이 칠해진 400여 개는 모두 교체됐다.
73년 6월 8일 포철은 화입식(火入式)을 했다. 처음으로 고로에 불을 넣은 것이다. 꼬박 21시간이 흐른 다음 날 오전 7시30분 드디어 첫 쇳물이 쏟아져 나왔다. 주상(철기둥)에 올라선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젖은 눈으로 “만세!”를 불렀다.
그 감격의 도가니에서 가장 속을 끓인 사람은 조용선 고로공장장과 그의 팀원들이었다. 확실한 초출선(初出銑)을 위해 예행연습을 하다 출선구(出銑口) 주변에 묻힌 80㎜짜리 파이프를 망가뜨렸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그들은 두께가 2m나 되는 출선구를 직접 산소불로 녹여 뚫어야 했다. 피 말리는 작업이 계속됐다. 다행히 예정된 시간에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쇳물이 흘러나오자 그들은 일제히 목이 메어 “나왔다!”를 외쳤다. 세월은 얼마나 무정한가. 당시 현장을 지휘한 후배 조영선은 얼마 전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종합제철소에는 제선공장(고로)에서 나온 쇳물을 제강공장이 받아서 강철로 만드는 공정이 있다. 여기에는 ‘전로(轉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포철에서 처음 발생한 가장 끔찍스러운 사고가 바로 이 전로에서 일어났다.
77년 4월 24일 새벽 전로 운전공이 깜박 조는 순간에 44t의 쇳물이 전로 바로 앞에 쏟아졌다. 천만다행으로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그러나 단순하고 사소해 보이는 이 실수가 초래한 결과는 엄청났다. 바닥 틈으로 스며든 쇳물이 공장 혈관인 전기케이블을 태워버려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는 재앙으로 이어진 것이다.
필리핀 출장 중에 사고 소식을 들은 나는 즉시 도쿄(東京)로 날아갔다.
![[인터뷰] ‘이슈 활활’ 산업현장 화재...슈나이더, 예방 카드로 ‘DX’ 솔루션 중무장](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41147/art_17320808161868_02a03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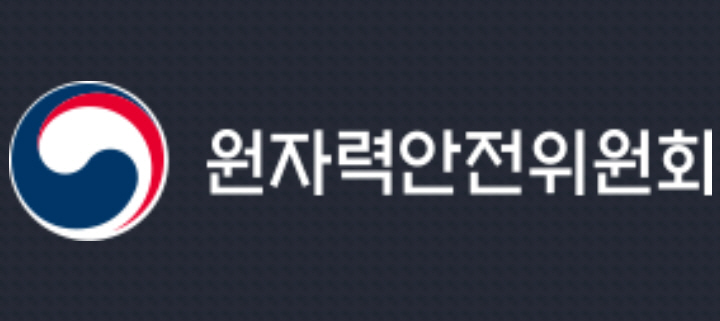
![[기고]세계로 나가는 K디지털정부, 운영감리로 뒷받침되어야](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1/news-p.v1.20241111.0521e3c2fce340acbcb852b72a6a52d2_P1.jpg)

![[사이언스] 태양 같은 별이 우리 곁을 스쳐지나갔다](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1/thumb/28605-70125-sample.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