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포렌식 : 국과수의 세계

그림 한 점이 한 인간의 삶을 꺾었다. 웃음기 없는 표정과 정면을 응시하는 눈동자. 그것은 여인의 초상이었다. 여인은 말하지 않았고 화가는 울부짖었다. “내가 그리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삼십 년을 흔들었다.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논란은 34년째 계속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199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고 천경자 화백은 2015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의 작품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논란이 다시 떠오른 건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 판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2년여 재판 끝에 ‘미인도’가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이 그린 그림이 맞다고 판단했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미완의 질문이다. 하지만 과학은 반대를 증명했다. 기술은 기억을 거슬렀고, 감정은 과학으로 반박됐다. 그림이 진작(眞作)의 이름을 되찾고 있다.
지난 5월 28일 강원도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본원에서 만난 강태이 지능형 위변조연구실장은 “‘미인도’ 조사 결과가 예상 밖이었다”고 했다. 그는 2016년 검찰 수사 당시 위작 감정 담당자였다.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최대 논란이 된 ‘미인도’ 위작 감정의 당시 상황을 물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위작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을까. 설명을 듣고 보니 그림이 달라 보였다.
① ‘밑그림’ : 예술가의 습관까지 잡아냈다

작가가 그린 진짜 그림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비밀은 ‘밑그림’이다. 국과수도 처음에는 몰랐다. 검사하는 과정에서 밑그림이 나왔다. 다른 진작과 비교해 봐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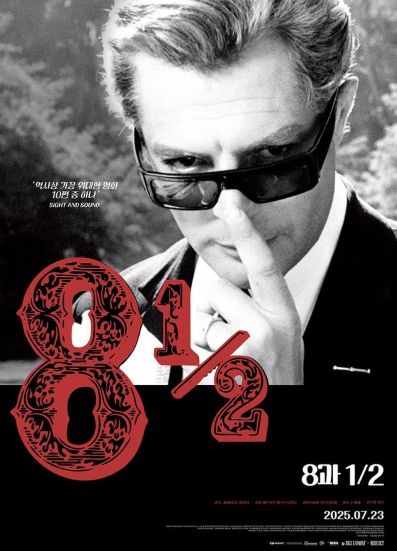


![[기고]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인간관·역사관](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16/.cache/512/2025041658009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