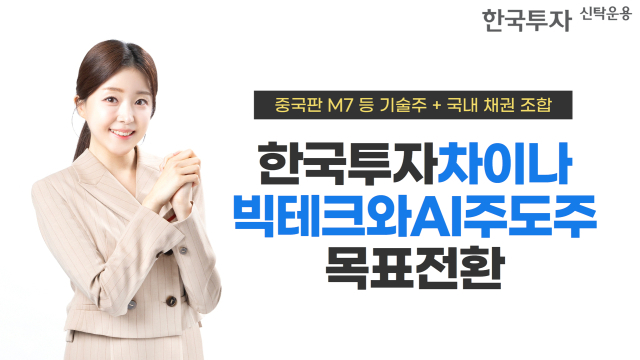국내 방송시장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글로벌 1위 OTT 사업자이자 국내 시장 부동의 1위인 넷플릭스가 광고 비즈니스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콘텐츠와 광고 시장을 모두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를 중심으로 OTT 전반에 대한 규제와 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향후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광고 시장의 무게중심이 OTT로 옮겨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광고 효율성과 타깃팅 측면에서 OTT가 방송보다 우수하다는 응답은 각각 40.2%, 52.4%에 달했다. 방송광고 점유율은 17.6%까지 하락했다. 반면 디지털 광고 비중은 60.7%로 확대되며 광고 수요가 급속히 OTT로 이동하고 있는 양상이다.
넷플릭스는 2022년 11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서 광고형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광고를 시청하는 대신 기존 요금보다 약 60% 저렴한 월 5500원에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신규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 해당 상품을 선택할 만큼 반응이 높다.
3억 명 이상 가입자를 보유한 넷플릭스는 축적된 시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타깃 광고를 제공하며, 광고주에게도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KT나스미디어, CJ메조미디어, 인크로스 등이 넷플릭스 광고 대행을 맡고 있다.
안정상 한국OTT포럼 회장은 “실질적으로 광고요금제 확대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쪽 광고가 상당 부분 OTT 광고로 이동하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 추세로 가면 넷플릭스가 광고 시장을 과점하는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OTT포럼은 광고형 요금제 확산에 따른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국회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OTT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콘텐츠 심의·편성 기준 적용 △망 사용료 분담 의무화 △공정경쟁을 위한 독과점 방지책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콘텐츠 유통과 광고 수익을 특정 플랫폼이 동시에 장악하면 국내 미디어 생태계 전반이 구조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일정 매출 이상 플랫폼에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상생기금 부과 등 책임 강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넷플릭스의 광고 사업 진출은 단순한 시장 확대가 아니라, 국내 방송·통신·광고 생태계를 잠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이 강화되어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시장의 흐름에 따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일정 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OTT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기보다는, 다양한 주체가 공존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광고 단가 상승, 콘텐츠 다양성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GAM] ①글로벌 IB 긍정 평가, 국내외 기관 관심도 집중된 'A주 리스트'](https://img.newspim.com/news/2025/04/22/250422090111723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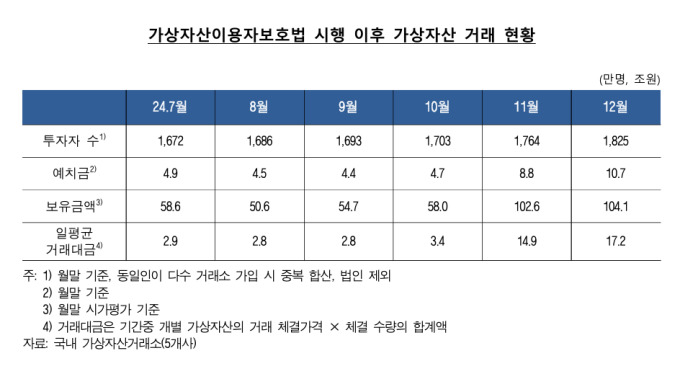
![[기고] 효율적 사업자를 징계하는 이상한 규제](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18/news-p.v1.20250418.2164cafb0ae2469495b31a9632a8ff5f_P3.jpg)

![홍콩 귀향하는 中기업들…"美·中디커플링 새로운 기회" [글로벌 왓]](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X7WH0V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