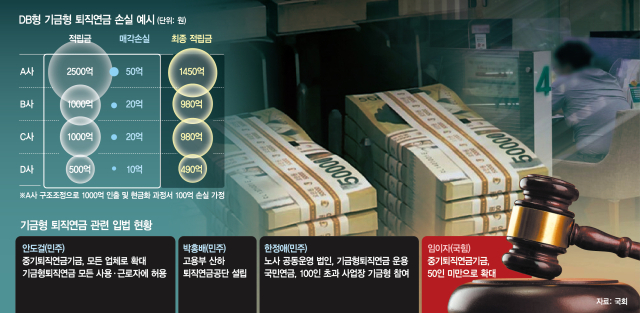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력 강화와 서비스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이 중요한 전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서비스 고도화, 트래픽 확보, 생태계 확장 등 다양한 목적의 결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각국 정부는 이 같은 결합이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며 플랫폼 M&A에 대한 심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기업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시각에서 기업 결합 규제 ‘리스크’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시장 점유율 등 지표를 중심으로 검토하거나 가격 인상이나 공급 축소의 우려가 있는지에 집중하는 접근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데이터 결합’ ‘이용자 락인’ ‘잠재적 경쟁자 제거’ 등 비가격적인 요소가 경쟁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해외 각국은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서 기존 기준을 넘어서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유럽집행위원회는 프로수스(Prosus)의 음식 배달 전문 업체 저스트잇테이크어웨이(Just Eat Takeaway) 인수에서 프로수스가 보유한 경쟁사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 지분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일루미나(Illumina)의 그레일(GRAIL) 인수를 두고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근거로 거래를 차단하려고 한 바 있다. 단순히 시장점유율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소수 지분 보유조차도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도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M&A가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법률적·정책적 검토를 포함한 종합적 리스크 관리 대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플랫폼 분야에서는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준에 발맞춘 심사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사전 컨설팅과 내부 검토 없이 결합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앞으로는 거래의 실질적 효과와 시장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을 사전에 정교하게 진단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초기 기획 단계부터 경쟁제한성 이슈를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공정위와의 사전협의 등 절차적 대응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뉴스줌인]인텔 '경영난 해소·정부 통제'…美, 시장 개입 확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4/news-p.v1.20250824.e9ec6b0fa985414a91b4e6ff7640a44a_P1.png)
![[빛이 나는 비즈] 위성에서 신약까지…민간 우주 산업 시대 열린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8/23/2GWQJSOY02_1.jpg)
![[기고]국가 산업인 게임, 이제 한 목소리를 내자](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4/news-p.v1.20250824.7b1e210de0d9451dbfc412ea0de0aa95_P1.png)
![[동십자각] 깜깜이 AI 기본법, 속 타는 기업들](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1XW740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62〉 [AC협회장 주간록72] 컴퍼니빌딩, 실패 경험 인재풀에서 시작하라](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6/news-p.v1.20250816.c07304830a0f4023933ef68e6318ea4f_P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