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반도체 뉴스는 하나같이 같은 결론을 가리킨다. 엔비디아 제품의 대중 수출 허용과 중국 내 특정 용도 제한, 삼성의 테슬라 대규모 수주, HBM(고대역폭메모리)을 둘러싼 각축전. ‘사필귀정’이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한다. 더 뛰어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재확인됐다. 약육강식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필귀정 리더십’은 유행이나 인기를 무시하고 바른길을 간다.
한때 반도체 업계를 주도했던 루슨트·NEC·IBM·인텔 같은 거대 기업들은 왜 1등 자리를 내줬을까? 문제를 못 봤거나, 알아도 대응하지 못했다. 성공이 만든 관성이 변화를 막았다. 비대해진 조직은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했고, 리더가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경우도 많았다.

격변기일수록 리더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리더는 10년 뒤를 내다보며 인재를 키우고 기술을 준비해야 한다. AI 시대에 주기가 짧아졌다 해도 진정한 인재 양성과 핵심 기술 개발에는 최소 10년의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 사필귀정을 되새기며 기본으로 돌아가면 길이 보인다. 예컨대 반도체는 지금까지 ‘더 많은 에너지 소비로 더 높은 성능’을 추구했지만, 앞으로는 ‘더 적은 에너지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10년 뒤 시간표에 맞춰 가능한 기술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국가 정책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실패가 반복되는 조짐이 보인다. 과거 AI 시대에 대비하여 ‘전 국민 코딩 교육’을 외쳤지만, 이제 초급 프로그래밍은 AI가 대신한다. 구글은 초급 프로그래머를 대량 해고했다. ‘코딩 학원 붐’을 일으킨 정책을 주창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오늘날 다시 ‘HBM 인재 육성’, ‘AI 반도체 인재 육성’이라는 단기 구호가 쏟아지는 현실은 착잡하다. 이런 대책들은 긴급 처방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국가 전략이 될 수 없다.
우리의 경쟁자들은 이미 다음 10년을 설계하고 있다. 그들과 달리 우리는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다. 기술 개발 시간표와 전혀 맞지 않는 ‘논문을 위한 논문’에 매달리고,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인력 양성, 전국으로 흩뿌려지는 나눠먹기식 인프라 투자,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묻지마식’ ‘퍼주기식’ 해외 협력에 조 단위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사필귀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투자는 경쟁력 확보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모래밭에 물 붓기다.
국민이 ‘노(no)’라고 말할 때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에서 시간 낭비, 예산 낭비는 안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 10년 뒤를 준비하는 것,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옳은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문제는 우리가 옳은 길을 걷고 있느냐다.
이병훈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주임교수


!['챗GPT 의존은 리스크'…소버린 AI도 써야하는 이유는? [김성태의 딥테크 트렌드]](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TBW6YB_1.png)
![[기고]GPT-5 이후, LLM을 넘어야하는 우리의 숙제〈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3/news-p.v1.20250813.76ad82dfcf544a84adeafbbe6fa67329_P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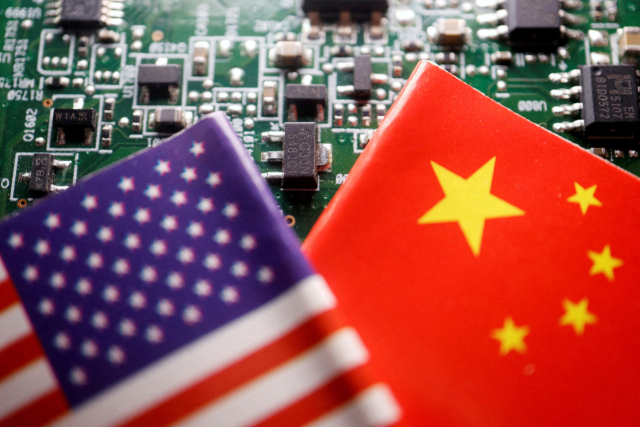

![[비즈 칼럼] AI는 에너지 전환의 친구일까 적일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f47c8843-8bec-4c68-9bbd-7548fbe57bc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