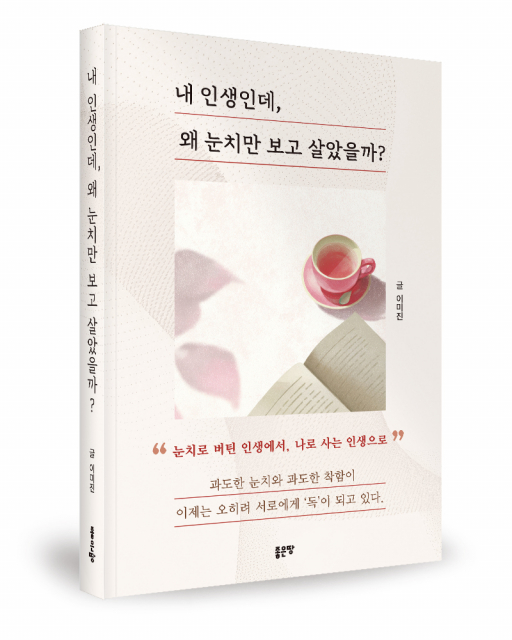모든 시작은 끝의 실패와 맞물린다. 지난해 나는 책을 한 권 내기로 했지만 쓰지 못했다. 이건 불성실함이고, 불성실이 쌓이면 언젠가 무능력이 된다. 글쓰기는 끊임없는 패배의 과정이다. 어떤 주제에 대해 안다고 생각해도 쓰기 시작하면 벽에 부딪히고, 써냈다 해도 비판받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기작가 캐럴 앤지어는 제발트가 유명해지기 전에 출간한 초기작 두 권이 습작에 불과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긍정적인 이유는 벽을 부수고자 몸부림치는 시간이 인간을 더 성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며, 제발트 역시 과거의 사고들을 뒤로 하고 자신만의 유일무이한 글쓰기로 나아갈 수 있었다.
글쓰기는 끝없는 패배의 과정
어려움 회피 말아야 명료해져
인간은 꾸준히 읽고 쓰는 존재

글쓰기의 벽을 허물려 할 때 시도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내 경우는 공부가 부족하다고 여겨 공부부터 한다. 최근 그 공부의 틀을 철학에서 마련했고, 하이데거와 니체를 3년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드넓은 무지였다. 그동안 애는 썼지만 성실하다 할 수 없는 이유는 공부한 것을 내 글로 다시 쓰지 못한 탓이다. 읽기만 할 때는 자기 충족감이 들지 몰라도 그걸 자기 언어로 쓰는 순간 ‘겸손한’ 마음이 생긴다. 벽은 쓰는 자에게만 크게 솟아올라 끊임없는 담금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아 옌베리의 『기억의 순간들』 속 등장인물인 요한나는 한번 집은 책은 반드시 끝낸다. 가망 없어 보여도 주어진 일에 경의를 표하는 그의 자세는 내면 깊이 자리 잡아 삶의 형태를 빚는다. 이런 태도는 읽기에 한정되지 않고 삶에 널리 드리워 한 사람의 성격을 빚고 운명까지 결정하곤 한다. 성실성을 밀어붙여 성격으로 뿌리내린다면, 오디세우스와 나우시카가 만나는 『오디세이아』 속 장면처럼 성격(본성)이 운명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화가 류샤오둥 역시 일상의 모든 것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되도록 창작 상태에 두려 했다. 그는 창작이 성실성과 직결된다고 보며 뜻밖에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실하다는 건 그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다.” 어려움은 기존 기법이나 이론을 익힐 때도 생기고, 그에 맞서려 할 때도 생긴다. 하지만 어려움에 직면해 오래, 강하게 머무르는 사람만이 감각을 획득할 수 있다. 가령 글에 오래 머물면 더 깊은 감각이 일깨워져 명료하고 안정적인 질문을 던지며 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경험을 안겨준다. 대체로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고 웹상에서 이뤄지되, 이럴 때는 그 경험에 오래 붙잡히도록 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며, 아마 그 역할을 책이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경험을 손아귀에 꽉 쥐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고이며 글쓰기이기 때문인데, 귀감이 될 만한 사례를 요즘의 인류학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인류학자들은 자신이 연구하는 곳에 다년간 머물며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서 길어 올린 삶의 경험을 글로 쓴다. 그들은 글쓰기에서 문학적 기법을 발휘하라고 요구받진 않지만, 현장에서 수집한 사실과 지식의 흡수력 및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종종 문학가처럼 글쓰기에 공을 들인다. 서사 노선을 짜고 날것의 관찰 속에서 길어낸 고농축의 문장들을 배치함으로써 현장에서 겪은 수많은 감정이입과 발굴한 삶이 낡은 형식 속에서 빛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즉 기성의 사회과학 아카데미 용어들이 새로 발견한 내용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언어를 발굴해나가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인류학자들의 글쓰기가 대중에게 널리 스며들며 매력적으로 읽히는 이유도 바로 이 점에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인류학은 기본적으로 약자의 학문이다. 인류학을 달리 정의하자면, 타자를 대면하는 방법에 관한 끊임없는 조정 과정이다. 인류학자들은 현장조사를 할 때 연구 대상과 일정 기간 함께 살면서 자신을 그들의 삶에 녹인다. 과거 식민지 시대에 탄생했던 학문의 연원에서 벗어나 이론이 끊임없이 주변의 삶으로 침투하고, 의식과 무의식을 함께 다루며, 때로 오늘날의 학문이 침묵하고 있는 종교 영역까지 아우르다 보면 그 안에 현대의 담론들이 무한하게 포괄될 수 있다. 이때 기존의 경계들이 지워지고 마음의 경계까지 사라지면 이름 없는 낯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운다.
인간은 언제나 다시 읽고, 다시 인식하고, 다시 실천한다. 여기서 인간의 성실성이 발휘되며, 재독과 재인식은 정신적인 존재로서 매일 하는 보편적 행위다. 그중에서도 쓰기는 가장 멀리 돌아가는 우회로다. 우리는 종종 ‘사실’보다 경이로움을 느낄 방법 혹은 무언가를 믿게 만드는 관점을 원하는데, 살아 있는 재료들은 해석과 끊임없는 재서술 속에서 비로소 윤곽을 얻기도 한다. 따라서 상투어를 삼가고, 자기 자신을 사고의 조정 속에 끊임없이 위치시키는 언어적 실천이야말로 미래로 한발 내딛는 가장 단단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은혜 글항아리 대표


![[신간] 인간이 글 쓸 필요가 없다? 천만에…'AI시대 공감 글쓰기'](https://img.newspim.com/news/2026/01/08/260108081857667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