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참 흔하다. 선거철인 지금은 정치권에서도, 특히 대선 후보 동선마다 한 번씩 들려온다. 그러나 한국에서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서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는 경우는 거의 못 봤다. 윗사람이 친히 ‘들어주는’ 행위 자체가 미덕인 줄 알거나, 직원들과 화기애애하게 몇마디 나누다 “탕비실 간식 바꿔달라”는 민원 정도 들어주고는 소통 잘했다 여기는 사람이 많다.
경영학과 조직행동 연구에서는 현장 직원들이 업무를 재창조한다는 사실을 오래전 밝혔고, ‘잡 디자인’ ‘잡 크래프팅’ 등 이론으로 만들어 활용한 지도 한참이다. 아무리 업무 분담을 철저히 해서 내려주는 조직이어도 실무자는 그 일을 경험하며 해석하고, 자기 자원을 투입하거나 조직 자원을 끌어오는 등 과정을 거치며 업무를 이전과 다른 것으로 만든다. 이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란 실제로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인상 깊었던 내용이 대전 둔산여고 급식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다. 쟁의행위를 앞두고 주 2회 초과하는 튀김류 조리, 냉면 그릇 사용, 미역 등 소분·손질되지 않은 식재료 취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여기에 눈길이 간 것은 얼마 전 급식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기사를 봤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급식노동자 채용 미달률이 전국 29%, 서울 84.5%에 달하고 채용자 10명 중 2명이 6개월 이내에 퇴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인력난으로 현장 노동 강도는 더 세지는 중이어서 언제 급식이 중단될지 모를 위태로운 상태라고 한다. 어쩌면 이는 의료 시스템 붕괴보다 더 실현 가능성 높은 위험이다. 이러나저러나 의료진은 늘 지원자가 줄을 잇지만, 급식노동자는 진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 강도를 높이는 구체적 원인을 밝혀 개선을 요구한 현장 목소리는 그래서 소중하다. 냉면 그릇을 쓰면 설거지가 훨씬 힘들고 바닥에 물이 넘쳐 낙상 위험이 생긴다는 것, 자른 미역과 통 미역은 단가 차이가 거의 없는데 통 미역을 납품받으면 노동량뿐 아니라 산재 위험까지 커진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급식 시스템 붕괴를 막을 단서를 알려준 것이다. 시스템에 책임 있는 리더라면 이 정보에 반색해야 맞다. 심지어 그리 어려운 일들도 아니니 “당장 전국 현장에 적용하라”고 지침을 내려야 맞다.
실제 반응은 어땠을까? 학교와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리사 숫자가 평균 대비 적지 않다”는 말이나 하고, 언론에는 “미역 없는 미역국에 분통” “냉면 그릇 때문에 애들 굶기나?” 하는 기사가 넘쳐났다. ‘밥이나 하는 아줌마’의 한심한 푸념 취급인데, 그렇게 해버리기는 쉽지만 다른 대안이 있나? 오랜 노동자는 아파서 떠나고 신규 노동자는 지레 놀라서 떠나고 있다는데, 이들을 잡아다 계속 노동을 시킬 방법이라도 있나?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는 이런 반응들이야말로 끝내 학생들을 굶기게 될, 급식 없는 학교를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다. 전통시장에 대체 몇번째 가는지 모를 대선 후보들에게도 묻고 싶다. 이번처럼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노동자를 잘 안다”고 자부하는 대선도 처음이건만, 현장의 목소리로 뭘 듣고 다니고 있느냐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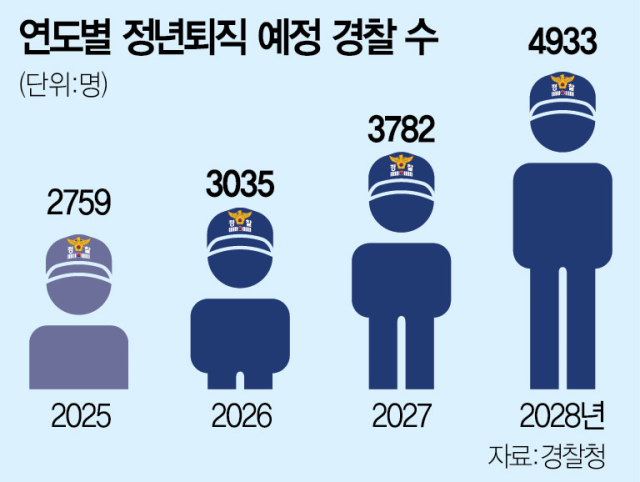
![日 젊은층 “전화받는 게 무서워요”[송주희의 일본톡]](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PCAQ5V_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