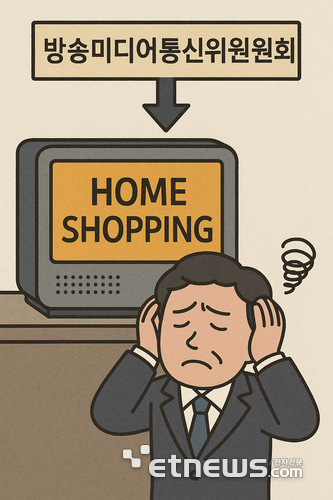편법 있었지만 사전교감 없이 단속은 문제
향후 韓기업 대미투자에 장애로 작용 우려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인 2007년 봄,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거의 종결짓고 한·유럽연합(EU) FTA 협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2006년 기준으로 29조달러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6%를 점하고 있던 미국 및 EU와 경제규모 1조달러를 갓 넘기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한국의 FTA 협상은 총성 없는 전쟁같이 거칠게 진행되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FTA가 우리 상품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개방을 통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전문직 인력이동 활성화를 요구사항 중 하나로 내걸었다. 서비스 무역 활성화 차원에서 모드 4의 인력이동 분야 내 전문직 비자 쿼터를 FTA 조문에 삽입하자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칠레의 경우 2003년 FTA 조항 삽입에 성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내 법률을 통해 시행되었다. 호주의 경우에는 비록 2004년 FTA 체결 때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별도의 협정으로 2005년에 제정한 바 있다.

FTA 협상 당시 미국은 인력이동 분야가 FTA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결과적으로 전문직 비자 쿼터는 FTA에 삽입되지 못했고, 이후에도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지 못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고 이민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면서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용 비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PWKA)이 제정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다.
지난 9월4일 조지아에서 현지 공장을 짓기 위한 작업을 하던 우리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를 보는 시각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구금된 대부분의 한국 기술자들이 ESTA(전자여행허가)나 B-1(단기 상용 비자)으로 입국하여 비자 목적 이외의 행위를 한 것은 맞다. 그것은 이민국 입장에서 보면 추방 사유다.
하지만 왜 편법으로 일을 진행시켜 이런 상황에 오도록 했느냐고 우리 정부와 기업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결정된 미국 현지공장 설립은 빠르게 진행될수록 좋다. 왜냐하면 시간이 돈이기 때문이다. 빨리 완공된 공장은 현지인의 고용 창출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비록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은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공장이지만 공장 건설은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조지아주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다. 한·미 간 투자 협상과도 맥을 같이하는 일이다.
크게 양보하여 이민국이나 국토안보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담당 부처가 할 일을 했다고 방기하는 듯한 모습은 충분하지 않다. 적어도 동맹이라면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가 선행되었어야 한다.
이 모든 사전교감이 생략된 채 단행된 9월4일 사태는 향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E-4 등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가 조속히 신설되지 않는다면 과학기술협력으로 확대된 한·미 동맹의 미래는 지극히 불확실할 것이다.
김흥종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축된 기업들 “정부, 美 비자 문제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美, 한국인 구금 사태]](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8/202509085161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