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을 붓으로 쓰는 예술을 한글서예라 하죠. 한글서예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반포된 15세기부터 왕실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사용됐어요. 문학작품의 필사본이나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편지글뿐만 아니라, 종이부터 금석(金石)·섬유 등 다양한 재질의 매체에 한글서예를 활용해 자신의 삶을 기록했죠. 마치 지금 우리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것처럼요. 현대에 들어 한글서예는 기록이나 의사 전달 등 실용적 용도보다는 문자를 이용한 독창적인 조형예술로 사랑받고 있죠.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인 캘리그래피 역시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한글서예는 우리 고유의 문자 체계인 한글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여러 서체와 필법 등에서 기인한 전통성과 고유성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는 독특한 필법과 정제된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여러 예술 분야로 범위를 확장해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라며 지난 1월 23일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정성껏 써 내려 가며 문자 예술로 이어온 한글서예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어요.
우리 주변으로 조금만 눈을 돌리면 한글서예를 직접 배우고, 그 아름다움을 체험해 볼 수 있답니다. 설 연휴가 지난 2월은 새해를 맞이하며 세운 결심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인데요. 김보경·이윤슬 학생기자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감성꼴서예를 찾아 한글서예를 배우고, 새해 결심을 다시 되새겨보기로 했어요. 장화정 선생님이 다양한 형태의 한글이 빽빽하게 적힌 화선지들과 함께 소중 학생기자단을 맞이했습니다.

보경 학생기자가 각각 다른 필체로 여러 장의 화선지에 적힌 글자들을 살피며 "한글서예에도 여러 서체가 있다고 들었어요"라고 말했죠. "맞아요. 판본체와 궁체 등을 대표적인 한글 서체로 꼽을 수 있죠."
판본체는 한글 창제 직후에 나온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등의 판본에 쓰인 글자를 기본으로 쓴 붓글씨의 글자꼴을 말해요. 목판 등 판에 새겨 인쇄한 한글을 본보기로 삼아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낸 터라 판본체라 부르죠. 글자획의 굵기가 일정하고, 문자가 중심을 가운데 두고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게 특징이에요. 컴퓨터로 문서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고딕체와 닮은 모양이죠. 판본체의 특징과 형상을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조선 세종 때 선조인 목조에서 태종에 이르는 여섯 대의 행적을 노래한 서사시인 『용비어천가』입니다.

궁체는 주로 궁중 나인들에 의하여 궁중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궁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굵기가 일정해서 강한 느낌이 드는 판본체에 비해 글자 획 굵기가 일정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궁체는 자음과 모음이 정확히 구분되지만 쓰는 속도가 느린 정자체, 자음과 모음이 이어지며 흐르는 모양새로 빠르게 쓸 수 있는 흘림체로 나뉘어요. 조선 후기 제24대 헌종의 후궁 경빈 김씨가 쓴 필첩인 『국기복색소선 및 사절복색자장요람(國忌服色素膳 및 四節服色資粧要覽)』은 궁체의 아름다움을 잘 느낄 수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장 선생님이 "학생기자 여러분은 오늘 판본체를 연습해볼 거라서 제가 궁체를 써볼게요"라며 화선지에 궁체 정자체로 '근하신년'을 궁체로 써 내려 갔어요. 단정하고 아름다운 궁체의 매력을 십분 느낀 소중 학생기자단이 장 선생님처럼 종이·붓·먹·벼루와 서진·연적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종이·붓·먹·벼루는 흔히 문방사우라고도 불리죠. 서진은 책장이나 종이쪽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눌러두는 물건으로 흔히 쇠·돌 등으로 만들어요. 연적은 벼루에 먹을 갈 때 쓰는 물을 담아 두는 그릇으로, 보통 도자기로 만들지만 쇠붙이·옥·돌 등으로도 만들죠.

"먼저 벼루를 볼게요. 벼루에서 먹을 가는 부분을 연당(硯堂), 먹물이 모이는 오목한 부분을 연지(硯池)라 해요. 먼저 벼루에 물을 적당히 붓고, 먹을 연당에 대고 넓게 돌리면서 갈아줍니다. 처음에 먹을 갈 때는 벼루 안의 물이 찰랑찰랑한 느낌인데, 10분 정도 지나면 먹과 섞여서 점성이 생겨요. 그때 붓을 연지에 충분히 담궈서 털 전체를 적신 뒤 연당과 벼루 테두리를 이용해 붓에 묻은 먹의 양을 조절합니다."
초보자가 판본체를 잘 쓰려면 가로 긋기와 세로 긋기 연습을 많이 해야 해요. 소중 학생기자단은 붓을 들고 화선지 위에 가로와 세로로 선 긋기를 반복했죠. "화선지는 만졌을 때 조금 더 미끌미끌하고 부드러운 부분이 글씨를 쓰는 앞면이에요. 붓에 먹물이 너무 많으면 글씨가 번지고, 먹물이 너무 없으면 붓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니 붓에 먹물이 적당한 양이 묻도록 잘 조절해 주세요."

열심히 선 긋기를 하던 윤슬 학생기자가 "서예에서는 붓을 잡는 집필법이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라고 말했죠. 장 선생님이 "맞아요. 검지와 엄지로 붓을 잡고 중지로 이를 가볍게 받치는 단구법(單鉤法), 엄지손가락은 바깥쪽에서 붓대를 누르고 검지와 중지는 그 반대쪽에서 붓대를 함께 잡는 쌍구법(雙鉤法), 다섯 손가락을 모두 이용해 붓을 잡는 오지집필법(五指執筆法)이 대표적이죠"라며 각 집필법 시범을 보였습니다. 단구법은 작은 붓으로 작은 글씨를 쓰는 데 적합하고, 쌍구법은 큰 글씨와 중간 글씨를 쓰는 데 적합한 집필법이죠. 오지집필법은 커다란 붓으로 현판처럼 크기가 매우 큰 글씨를 쓸 때 사용해요.
붓을 잡는 집필법 외에 서예를 할 때 팔의 움직임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오른손 손목을 왼쪽 손등에 받치고 쓰는 침완법은 붓의 움직임, 즉 운필이 제한되기 때문에 작은 붓을 이용해 잔글씨를 쓸 때 주로 사용하죠. 오른쪽 팔꿈치를 책상에 붙인 채 팔뚝을 들고 글을 쓰는 제완법은 중간 크기의 글자를 쓰기 적당한 방법이지만, 붓의 움직임이 제한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팔을 들어 올려 쓰는 현완법은 큰 글씨를 쓰기에 적합한 자세로, 붓의 움직임이 제한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소중 학생기자단은 붓은 쌍구법으로 쥐고, 팔의 움직임은 현완법으로 판본체 연습에 나섰어요. 먼저 자신의 이름을 여러 번 써보며 판본체의 느낌을 익혔죠. 장 선생님이 "획의 앞과 뒤를 둥글게 하기 위해 붓끝을 가려는 방향의 반대에 놓았다가, 살짝 누르면서 원래 쓰려던 방향으로 그으세요. 그러면 뾰족한 붓끝 모양이 남지 않고 둥글게 쓰이죠. 획의 굵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라며 획의 앞뒤가 둥글고 굵기가 일정한 판본체를 쓰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이름을 판본체로 연습하는 보경·윤슬 학생기자. 하지만 난생 처음 잡아보는 붓의 움직임을 마음처럼 자유자재로 제어하는 건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했어요. 긴장한 표정으로 붓을 놀리던 소중 학생기자단을 본 장 선생님이 "서예는 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연습해야만 잘할 수 있어요. 연습만이 살 길이죠"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름 쓰기로 판본체의 기초를 배운 소중 학생기자단은 드디어 족자에 표구된 화선지에 자신의 새해 소망을 써보기로 했어요. "원래는 화선지에 글을 쓰고 표구사에 맡기면 족자를 만들어주지만, 오늘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족자 위에 바로 써보기로 할게요. 10자 내외로 쓰고 싶은 새해 소망을 적어보세요."
족자에 표구된 화선지에 붓으로 글씨를 쓸 때는 화선지에 바로 쓸 때보다 먹을 약간 더 많이 묻혀야 해요. 쓰고 싶은 새해 소망을 곰곰이 생각하던 보경 학생기자는 '공부를 열심히 / 을사년 김보경'이란 문구를, 윤슬 학생기자는 '돈을 절약하자 / 을사년 이윤슬'이란 문구를 족자 위에 적었죠.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갈 때마다 긴장감에 심호흡을 하던 소중 학생기자단. 메인인 '공부를 열심히'와 '돈을 절약하자' 부분은 보통 크기의 붓을 쌍구법으로 쥐고, 팔의 움직임은 현완법으로 해서 글씨를 썼는데요. 글씨나 그림을 완성하고 마무리 짓기 위해 자신의 이름·날짜 등을 적는 낙관에 해당하는 '을사년 김보경'과 '을사년 이윤슬'은 새해 소망 문구에 비해 글자 크기가 훨씬 작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붓을 쥐고 팔의 움직임을 침완법으로 바꿔서 썼죠. 이렇게 살짝 희미해지고 있던 새해 소망을 되새기는 문구가 적힌 족자가 완성됐습니다.
"요즘은 글씨를 쓸 때 연필이나 볼펜 같은 필기구보다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많이 쓰죠. 서예는 먹을 갈고 글씨를 쓰는 데 집중하기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매력이 있어요. 게다가 한글서예는 우리나라 고유문화죠. 그래서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글서예를 체험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기도 해요. 본인의 이름부터 쓰고 싶은 문구를 붓으로 천천히 써가면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동행취재=김보경(서울 북성초 5)·이윤슬(서울 언주초 5) 학생기자
학생기자단 취재 후기
쉬는 시간에 엄마와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서예 취재를 통해 엄마와 이야기할 거리가 생겨서 좋았어요. 장화정 선생님이 한글서예의 여러 가지 매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 시범을 보다 보니 붓을 잡는 것과 화선지에 먹이 퍼지는 것을 보는 것도 매력 같아요. 작은 글씨를 쓸 때는 붓이 머금은 먹의 양을 조절하기 쉽지 않아 화선지에 먹이 퍼져서 어려웠는데요. 저는 글씨를 엄청 못 쓰는데 서예를 하면서 글씨 쓰는 연습을 하니까 좋았어요. 요즘 이모티콘처럼 나중에 붓으로 그림과 글을 함께 표현하고 싶어요. 자세를 잡느라 목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재미있었고, 팔 운동이 될 것 같아요. 화선지 말고 천에 글씨를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서예를 하면 수학처럼 힘든 공부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친구와 함께하면 두 배로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 서예 초보자는 옷에 먹이 묻을 수 있으니 연습할 땐 검은색 옷을 입는 걸 추천해요.
김보경(서울 북성초 5) 학생기자
이번에는 감성꼴서예에 가서 한글서예에 대해 취재하고 새해 다짐을 써넣은 족자도 만들었습니다. 한글서예에는 판본체·궁체 등 여러 서체가 있는데 저는 판본체를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쉬워 보였는데 막상 붓을 잡으니까 손에 땀도 나고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완성된 족자를 보니 뿌듯했어요. 소중 친구 여러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한글서예를 연습해서 새해 다짐을 쓴 족자를 만들어 보세요.
이윤슬(서울 언주초 5) 학생기자
글=성선해 기자 sung.sunhae@joongang.co.kr, 사진=박종범(오픈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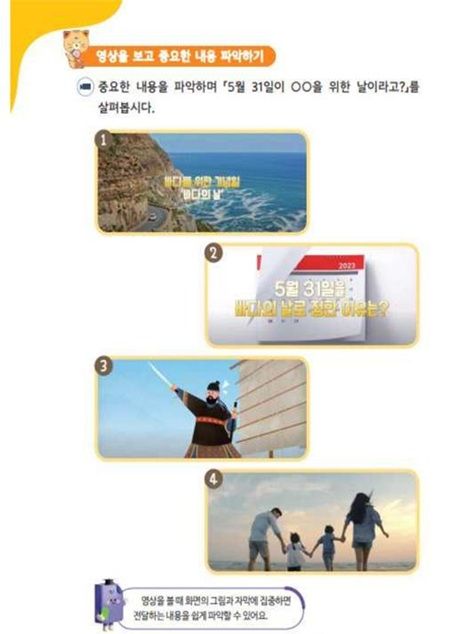
![[신간] 유기풍 전 서강대 총장 '경계를 넘어: 열린계를 통한 혁신' 영문판 출간](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2327982471_a34d9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