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기업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활동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제는 대주주·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학연·지연으로 얽힌 정관계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탓에 고액의 보수만 챙겨가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1개 그룹 소속 122개 상장사는 지난해 총 1222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해 3575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이 반대표를 던진 횟수는 6개 안건, 18차례였다. 그마저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안건을 부결시키는 데 동조해 함께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 대부분(15건)이었다.
경영진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목소리를 낸 경우는 모두 3건이었고 이 중 2건은 동일인이었다. 전체 사외이사 449명 가운데 1년간 이사회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독립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표명한 사외이사의 수가 0.67%에 그친 것이다.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상 며칠 전부터 안건을 사전 조율하기에 통과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는 독립성 결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이사회 내 의무선임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같은 맹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
독립성 외에 전문성을 담보할 수단의 부족함도 문제로 지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전문가는 “독립성 때문에 안건 반대율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 안건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있는지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한다”면서 “정말로 경영진 의견에 찬성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해당 분야 전문성이 없어서 의견을 내기 어려웠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연 독립이사로 이름만 바꿨다고 진짜 독립된 이사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독립성이 중요한지 전문성이 중요한지 생각해 볼 시점”이라면서 “관계 출신과 교수가 많은 우리와 확연히 차이가 있는 해외 주요국 이사회 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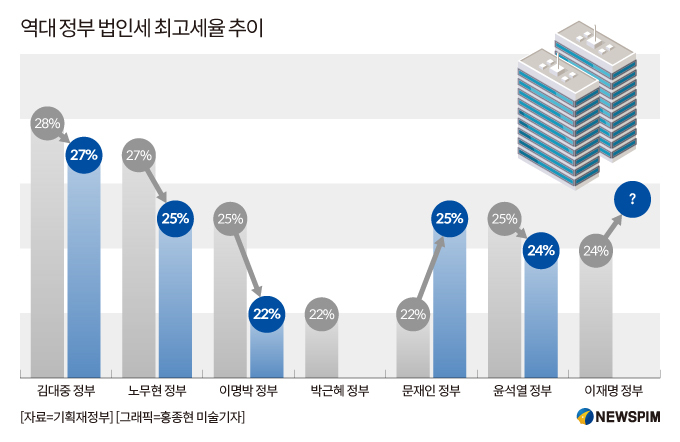
!["링 위로 올라오라" 도발에도…롯데는 복지부동 전략 택했다[이충희의 쓰리포인트]](https://newsimg.sedaily.com/2025/07/19/2GVEUJKXJZ_1.jpg)

![[속보]이 대통령, 정성호·구윤철·조현·김정관 장관 임명안 재가](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8/news-p.v1.20250718.f31040e66d744e34880de5095e28f4e1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