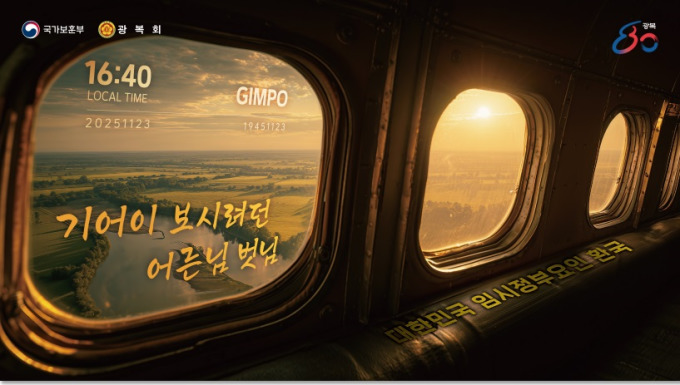정부가 21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진행했다. 일본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약속했던 추도행사를 형식적으로만 치르고 강제성을 끝내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일은 2년 연속으로 따로 ‘반쪽짜리 추도식’을 열게 됐다.

이날 추도식에는 정부 대표인 이혁 주일 대사와 정부 관계자, 그리고 유가족 11명이 참석했다. 유가족을 대표해 추도사를 낭독한 이철규 씨는 "고인이 되신 부친께서 강제동원되어 힘들게 고생하셨다던 이곳 사도광산에 와 보니 부친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부친을 더욱 가깝게 기억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씨 외에도 참석한 유가족들은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에도시대(1603~1867) 최대 금광이었던 사도광산은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 약 1500여명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곳이다.
이 대사는 추도사를 통해 "80여 년 전 이곳 사도 섬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해야 했던 많은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있었다"며 사도광산 조선인 노역의 강제성을 부각했다. 이어 이 대사는 "당시 노동자들이 느꼈을 부상에 대한 두려움, 외부와 단절된 삶에서 비롯된 고립감, 기약 없는 미래가 주는 막막함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유가족의 마음에도 깊은 아픔과 슬픔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또 "사도광산에서 일한 모든 분들이 혹독한 노동과 열악한 생활을 견뎌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양국 국민들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때로는 손을 내밀어 돕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도식은 일본 측이 참여하지 않은 채 한국이 별도 개최했다. 앞서 지난 9월 13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일본 측만 참여하는 추도식을 열었고 여기선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외교부는 당시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한·일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미리 불참을 통보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때 한국을 포함한 21개 위원국의 컨센서스(전원 합의)를 얻기 위해 매년 추도식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들을 명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는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한국인들이 ‘강제로 노역(forced to work)’했다는 사실을 일본이 인정했던 사실도 포함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첫 추도식이 열린 지난해에도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은 행사 전날 전격적으로 불참을 결정하게 됐다. 올해도 사전 협의가 결렬되며 또다시 ‘반쪽 추도식’으로 이어지자 세계유산 등재 때 일본의 약속이 반복적으로 파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